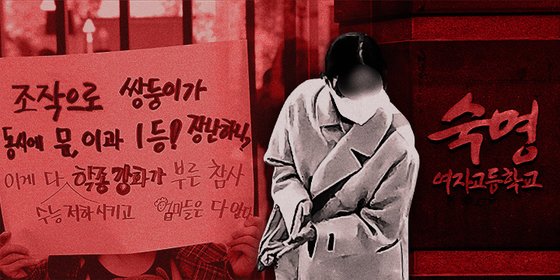● ‘오징어 게임’과 명확히 다른 경우
● 다분히 ‘미국적’인 캐릭터 설정
● 넷플릭스 ‘나르코스’와의 공통점
● 이제와 자이니치를 ‘우리’라고?

|
결론부터 말하자. ‘파친코’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다. ‘겨울연가’로 대표되는 원조 한류 드라마와는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오징어 게임’과도 다른 경우다. 넓은 의미의 ‘K-컬처’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일본 시장을 버리고 대신 한국을 택했다”며 마치 축구 한일전에 이겼다는 듯한 말투로 ‘파친코’를 다루는 기사를 냈다. 너무도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이 아닐 수 없다.
‘파친코’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태어날 때 그 나라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다. ‘한국 드라마’가 아닌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껏 대한민국이 해외교포, 그 중에서도 ‘자이니치’를 다뤄온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 이야기’조차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파친코’를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어떤 나라의 드라마가 외국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은 한국에서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올라 주연 배우가 광고를 찍기도 했으니 말이다. 즉 2000년대 초의 한류는 이례적이고 반가운 현상이었지만,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확률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맥락이 달라진 것은 미디어 환경 자체가 변화하면서부터다. 넷플릭스는 초창기에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연출하고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한 ‘하우스 오브 카드’로 흥행뿐 아니라 비평 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곤 콜롬비아의 전설적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마약 범죄 수사물 ‘나르코스’를 내놨다.
‘나르코스’에는 잠깐이나마 미국 플로리다와 뉴욕 등이 배경으로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 특히 콜롬비아의 도시 메데인과 그 밖의 정글을 무대로 삼는 이야기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고 유입됐을 미국인 시청자에게 다소 낯설고 당혹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충분했다. 미국과 무관하지 않지만 결국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만드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바로 ‘나르코스’다.
넷플릭스는 왜 그런 모험을 감행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글로벌 콘텐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9년 현재,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3억8000만여 명으로 세계 3위다. 반면 스페인어는 4억8000만여 명의 모국어로 세계 2위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도 남부 지방과 캘리포니아 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스페인어 화자가 살고 있다.
넷플릭스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만 할 운명이었다. 이에 가장 가까운 라틴아메리카를 먼저 공략하기로 했다. 미국 회사가 콜롬비아 마약왕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그것도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 제작하는 이례적인 현상은 그래서 벌어졌다.

|
반면 앞서 언급한 ‘나르코스’나 ‘파친코’처럼 OTT 본사에서 만든 글로벌 콘텐츠도 존재한다. 이는 ‘내수용’으로 만든 작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현상과는 다른 경우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풍토 및 현지인의 정서를 십분 반영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는 ‘미국 드라마’다.
우리는 ‘나르코스’를 콜롬비아 드라마라고 하지 않는다. 콜롬비아 마약왕이 주인공이고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인 수사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캐릭터가 스페인어로 대화하지만, ‘나르코스’는 어디까지나 넷플릭스에서 만든 미국 드라마다.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파친코’ 또한 미국 드라마다. ‘파친코’는 애플TV+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일곱 살에 부모와 함께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미국 작가들이 각본을 쓰고, 한국계 미국인 두 사람이 연출한, 엄연한 미국 드라마다.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내적·외적 갈등,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 작품이 준수하는 윤리적 기준 등 모든 면에서 미국 영화·드라마 업계의 표준적 작법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김민하 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큰 외동딸이다. 어려서부터 똑 부러지는 성격에 셈이 밝다. 아버지는 딸을 잘 교육시키고 주체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다분히 ‘미국적’이다. 1900년대 초의 조선인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키운다? 현실에서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 시청자들에게 선자의 캐릭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같은 인물을 직접 연상시킬 수밖에 없다.
선자의 첫사랑이자 첫 아이의 아버지인 고한수(이민호 분)는 어떨까. 일본 야쿠자의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위치를 차지한 조선인이다. 조선인을 경멸하지만 동시에 조선인을 보호한다. 이재에 밝은 현실주의자지만 가슴 속에 뜨거운 한줄기 순정이 있다. 역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빗대어 보자면, 20세기 초 동아시아에 출현한 레트 버틀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한수가 선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지만 선자는 거절한다. 거절의 이유를 나중에 털어놓는 선자의 말. ‘나 자신을 반으로 갈라놓고 살 수는 없데이.’ 부산 사투리로 번역된 대사지만 여기 담긴 정서는 한국보다는 미국 드라마의 그것이다. ‘스스로에게 충실할 것’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같은, 실로 미국인다운 건전한 태도가 담겼다.
‘파친코’를 여타 다른 한국산 콘텐츠와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파친코’는 역사의 격변 속에 태어난 디아스포라, 자이니치(재일 조선인)를 다룬 대하물이다. 6화에서 수십 년 만에 고향 부산에 찾아온 선자는 한국의 공무원에게 스스로를 ‘특별영주권자’라고 한다. 해방이 오기 전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한국인도 북한인도 일본인도 아닌 ‘조선 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간 자이니치의 현실을 반영한 설정이다.
우리, 즉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들은 재일교포, ‘자이니치’를 ‘우리’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엄연한 사실이다. ‘파친코’와 마찬가지로 오사카의 자이니치를 다룬 영화 ‘피와 뼈’는 국내 관객들에게 싸늘하게 무시당했다. 그런데 그 자이니치의 이야기를 미국 OTT 업체가 큰 예산을 동원해 드라마로 만들자, 이제 와서 ‘우리 이야기’라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 아닐까.
이는 마치 주한미군의 자녀인 혼혈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튀기’라고 조롱하다가, 하인즈 워드가 NFL 스타가 되자 ‘우리의 핏줄’로 인정하며 호들갑스럽게 환영하던 모습마저 연상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점이지대에서 힘겹게 살아간 재일교포의 이야기, 그 귀중하면서도 쓰라린 역사적 경험에 대해 모른 척으로 일관하더니, 재미교포의 소설을 미국 기업이 드라마로 만든 걸 보면서 ‘K-콘텐츠’ 운운한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일교포 단체들을 ‘간첩의 온상’ 쯤으로 취급하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착취했다. 한국의 진보 정치는 자이니치를 감성과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며 보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소설 ‘파친코’의 그 유명한 첫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는 말을, 마치 일본에 대한 규탄으로 받아들이며 ‘국뽕’의 소재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자이니치들에게 한국과 한국인은 일본만큼이나 그들을 ‘망쳐놓은’ 역사의 일부다.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며 건설적 방향으로 손을 내밀어야지, ‘그래,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며 K-콘텐츠’라고 으스댈 일이 아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 또한 그 ‘역사’의 일부다. 그런 자기객관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파친코’ 같은 작품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민족주의적 세계관과 원한 감정으로만 얼룩진 역사의식을 넘어, 세계에 통할 수 있는 보편적 감성과 스토리텔링을 고민할 때다.

|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