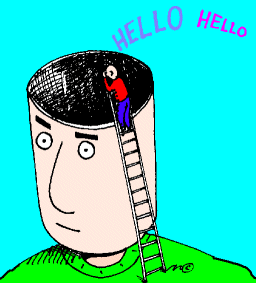The first week-day after Christmas-day, observed as a holiday on which post-men, errand-boys, and servants of various kinds expect to receive a Christmas-box. So also Boxing-night, Boxing-time.
1833 in A. MATHEWS Mem. C. Mathews (1839) IV. viii. 173 To the completion of his dismay, he arrives in London on boxing-day. 1837 DICKENS Pickw. xxxii. 343 No man ever talked in poetry 'cept a beadle on boxin' day. 1837 {emem} in Bentley's Misc. Mar. 296 The most turbulent sixpenny gallery that ever yelled through a boxing-night. 1849 G. SOANE New Curios. Lit. 317 The feast of Saint Stephen is more generally known amongst us as Boxing-Day. 1871 Hood's ‘Comic Ann.’ 59 It was the Saturday before the Monday Boxing Night. 1877 PEACOCK N. Linc. Gloss. (E.D.S.) Boxing-time, any time between Christmas-day, and the end of the first week in January. 1884 Harper's Mag. Dec. 9/1 In consequence of the multiplicity of business on Christmas-day, the giving of Christmas-boxes was postponed to the 26th, St. Stephen's Day, which became the established Boxing-day.
2007-12-26
2007-12-11
투표권 거래에 관하여
투표권 거래에 관하여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
-N. 그레고리 멘큐
오늘 아침 제프 미론과 나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강의에 초청되어, 자유시장의 사회 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그 말미에서, 샌들 교수는 매혹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요악하자면),그것은 “만약 당신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자발적인 교환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그 결론을 사람들이 그의 투표권을 다른 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거래에 찬성했다면 양 정당이 그 교환관계 속에서 서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그의 투표권을 판매할 때, 그 교환은 선거 과정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생각했던 사례를 여기에 제시하겠다.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9달러짜리 공공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세 명의 유권자를 상정해보자. 엔디는 그 공공재가 8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벤과 칼은 그것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자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벤과 칼은 반대하고, 그 공공재는 제공되지 않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엔디가 벤의 투표를 4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그 계획이 확실히 통과되도록 할 수 있다. 엔디는 (8달러의 이익에서 3달러의 세금과 4달러의 투표 구입 가격을 뺀) 1달러만큼의 이익을 얻고, 칼은 (세금으로 나가는) 3달러를 손해 보게 된다. 엔디와 벤의 투표 거래는 칼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앤디의 가치 평가를 8달러에서 10달러로 높이는 식으로) 사례에 등장하는 투표권 판매의 효용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권 매매가 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오직 외부효과의 존재를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자발적인 거래가 낳는 이득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민주주의적 투표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업데이트: 마이클 샌들이 내게 이 포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그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교환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을 사거나 파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맨큐 교수는 주장한다. 우리가 투표권 시장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효과의 발생이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정치적 설득마저도 금지해야 한다고 맨큐 교수가 말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총 9달러의 비용이 드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세 명의 유권자가 결정하고 있다. 엔디는 그 사업이 8달러의 값어치를 한다고 평가하지만, 벤과 칼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 공립학교를 위한 세금 부과라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엔디는, 이 세금 증가를 매우 선호한다. 반면 벤과 칼은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그들이 학급 규모를 줄이고 학교 도서관을 개선시키며 과학 실험실을 혁신하는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제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건 그렇지 않건, 공립학교의 질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며 엔디가 벤을 설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잘 교육된 시민정신은 더욱 건강한 지역 경제 창출에, 혹은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벤이 믿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는 그저 훌륭한 공립학교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켜서 그의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d있다. 이제 그는 그 추가 과세를 통한 정책의 가치를 4달러로 추산한다. 그것은 그가 지불해야 할 3달러의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는 추가 과세에 찬성하러 가는 엔디와 합류하게 된다.
추가 과세가 낳는 이득에 설득되지 않고 있는 칼은, 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의 세금은 그가 그만큼 가치 있다고 보지 않는 정책 때문에 3달러 높아진다. 엔디가 벤을 설득하는 것은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멘큐 교수가 제시했던 투표권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 즉 제3자에게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엔디가 벤의 투표권을 구입하건 설득을 통해 얻어내건, 칼에게 미치는 영향(즉 “부정적 외부효과”)은 같다. 두 경우 모두, 칼은 그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을 한 표를 잃고, 3달러의 세금도 낸다. 그러므로 멘큐 교수가 정치적 설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 한,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왜 투표권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무단 번역. 원문은 여기에.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
-N. 그레고리 멘큐
오늘 아침 제프 미론과 나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 강의에 초청되어, 자유시장의 사회 내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그 말미에서, 샌들 교수는 매혹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요악하자면),그것은 “만약 당신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자발적인 교환을 선호한다면, 당신은 그 결론을 사람들이 그의 투표권을 다른 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들이 거래에 찬성했다면 양 정당이 그 교환관계 속에서 서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논증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그의 투표권을 판매할 때, 그 교환은 선거 과정에 의해 관련되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생각했던 사례를 여기에 제시하겠다.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9달러짜리 공공재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세 명의 유권자를 상정해보자. 엔디는 그 공공재가 8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벤과 칼은 그것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다수자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벤과 칼은 반대하고, 그 공공재는 제공되지 않는데, 그것은 [경제학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엔디가 벤의 투표를 4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그 계획이 확실히 통과되도록 할 수 있다. 엔디는 (8달러의 이익에서 3달러의 세금과 4달러의 투표 구입 가격을 뺀) 1달러만큼의 이익을 얻고, 칼은 (세금으로 나가는) 3달러를 손해 보게 된다. 엔디와 벤의 투표 거래는 칼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앤디의 가치 평가를 8달러에서 10달러로 높이는 식으로) 사례에 등장하는 투표권 판매의 효용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투표권 매매가 늘 효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를 드는 이유는 오직 외부효과의 존재를 충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자발적인 거래가 낳는 이득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민주주의적 투표의 광범위하고 복잡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업데이트: 마이클 샌들이 내게 이 포스트에 대한 코멘트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그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교환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권을 사거나 파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맨큐 교수는 주장한다. 우리가 투표권 시장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는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외부효과의 발생이 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정치적 설득마저도 금지해야 한다고 맨큐 교수가 말할지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그들 각각에게 3달러의 세금을 물리게 될, 총 9달러의 비용이 드는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를 세 명의 유권자가 결정하고 있다. 엔디는 그 사업이 8달러의 값어치를 한다고 평가하지만, 벤과 칼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 공립학교를 위한 세금 부과라고 가정해보자. 두 명의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엔디는, 이 세금 증가를 매우 선호한다. 반면 벤과 칼은 모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그들이 학급 규모를 줄이고 학교 도서관을 개선시키며 과학 실험실을 혁신하는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이제 공동체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녀들을 데리고 있건 그렇지 않건, 공립학교의 질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며 엔디가 벤을 설득한다고 가정해보자. 잘 교육된 시민정신은 더욱 건강한 지역 경제 창출에, 혹은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벤이 믿게 되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는 그저 훌륭한 공립학교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켜서 그의 재산을 늘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d있다. 이제 그는 그 추가 과세를 통한 정책의 가치를 4달러로 추산한다. 그것은 그가 지불해야 할 3달러의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그는 추가 과세에 찬성하러 가는 엔디와 합류하게 된다.
추가 과세가 낳는 이득에 설득되지 않고 있는 칼은, 그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 선거에서 패배한다. 그의 세금은 그가 그만큼 가치 있다고 보지 않는 정책 때문에 3달러 높아진다. 엔디가 벤을 설득하는 것은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예시는 멘큐 교수가 제시했던 투표권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 즉 제3자에게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엔디가 벤의 투표권을 구입하건 설득을 통해 얻어내건, 칼에게 미치는 영향(즉 “부정적 외부효과”)은 같다. 두 경우 모두, 칼은 그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었을 한 표를 잃고, 3달러의 세금도 낸다. 그러므로 멘큐 교수가 정치적 설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 한, 칼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왜 투표권 거래가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무단 번역. 원문은 여기에.
2007-12-08
www.freerice.com
판타스틱에서 청탁받은 특집 원고를 마무리짓기에 앞서, 최근 발견한 재미있고 유익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영어 단어 문제를 맞추면 저개발국가에서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쌀 20톨이 기부되는 프로그램인 FreeRice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를 풀 때마다 바뀌어서 나오는 베너 광고 수익이 100%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엔식량개발을 통해 분배된다고 하니 신뢰도에 대한 걱정은 붙들어매도 좋을 듯 싶다.
문제를 맞추면 레벨이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어휘가 나오고, 반대로 틀리면 레벨이 낮아지면서 쉬운 단어가 출제되는데, 틀린다고 해서 이미 기부한 쌀 뺏는 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풀도록 하자. 참고로 나는 계속 10~12레벨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반면, 내 여자친구는 어려운 것들을 연달아 풀더니 35레벨까지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된 쌀알의 갯수는 6,890,866,390톨이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문제를 맞추면 레벨이 올라가면서 더 어려운 어휘가 나오고, 반대로 틀리면 레벨이 낮아지면서 쉬운 단어가 출제되는데, 틀린다고 해서 이미 기부한 쌀 뺏는 거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풀도록 하자. 참고로 나는 계속 10~12레벨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반면, 내 여자친구는 어려운 것들을 연달아 풀더니 35레벨까지 올라갔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된 쌀알의 갯수는 6,890,866,390톨이다.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2007-12-04
펀드 시대의 경제 기사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기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우려의 표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발생할라치면 즉각 중앙일간지나 경제신문들이 마치 한국 경제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들어대던 기존의 보도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예전같았다면 '미국발 경제 위기, 한국호 침몰하는가!' 따위 타이틀이 적어도 두 주일 정도는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이 대선의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을 테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움직임을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이는 최용식이 경제 역적들아 들어라에서 내놓았던 진단이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중동의 저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과는 달리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들은 경기의 회복 여부에 대해 함부로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거나, 그것을 거창한 레토릭으로 포장하여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이다.
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는 대신 증권사를 통해 국내 증시에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 주가로 표현되는 경기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계층별 소득 격차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제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숫자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히 그렇다.
요컨대 펀드 시대는 경제 기사에 최소한의 냉철함과 이성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일보는 반민족적인 친일 신문이다'라는 말보다, '조선일보 보고 투자하면 돈 잃는다'라는 속설이 그 신문의 경제면을 교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안티조선의 초창기에 그 운동의 지지자들은 조선일보를 '봉건적인 신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마르크스가 옳다. 그들이 지적하던 조선일보의 어떤 속성은, 최근 급격하게 금융화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와해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론운동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지지 운동으로 전락한 다음, 그것이 추구하던 최소한의 가치마저도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민적 영역과 역량이 극도로 미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안티조선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언론에 대한 개입이 이 지점에서 멈춰서지 말아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자본주의에 휩쓸려 성취되는 민주주의의 과실은 결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더욱 그렇다.
이는 최용식이 경제 역적들아 들어라에서 내놓았던 진단이 유효성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중동의 저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과는 달리 조중동과 양대 경제신문들은 경기의 회복 여부에 대해 함부로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거나, 그것을 거창한 레토릭으로 포장하여 '아젠다'를 설정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변화이다.
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는 대신 증권사를 통해 국내 증시에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 주가로 표현되는 경기의 실제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계층별 소득 격차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실제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숫자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에 대해 말하자면 분명히 그렇다.
요컨대 펀드 시대는 경제 기사에 최소한의 냉철함과 이성을 가져다주었다. '조선일보는 반민족적인 친일 신문이다'라는 말보다, '조선일보 보고 투자하면 돈 잃는다'라는 속설이 그 신문의 경제면을 교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안티조선의 초창기에 그 운동의 지지자들은 조선일보를 '봉건적인 신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마르크스가 옳다. 그들이 지적하던 조선일보의 어떤 속성은, 최근 급격하게 금융화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와해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론운동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지지 운동으로 전락한 다음, 그것이 추구하던 최소한의 가치마저도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로 인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시민적 영역과 역량이 극도로 미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안티조선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언론에 대한 개입이 이 지점에서 멈춰서지 말아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자본주의에 휩쓸려 성취되는 민주주의의 과실은 결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더욱 그렇다.
2007-11-23
찍을 사람이 없다고?
BBK 의혹의 사실 규명이 눈앞에 다가오고, 그에 따라 '대세'였던 이명박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과 맞물려, 민주노동당에 호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권영길과 그의 주위를 둘러싼 특정 정파를 혐오하는 이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문국현을 포함한 '범여권' 후보들이 하나같이 선택지로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내기는커녕 비웃음의 대상 정도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권영길이라는 것은, 다소 오버스럽게 말하자면 역사의 비극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민한다. 그냥 꾹 참고 권영길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공표한 상태에서 기권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내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 지니고 있는 고답성에 대한 것이다. 나의 주변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민주노동당 경선 이후, 즉 심상정이 주사파의 조직표 2000장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고배를 마시고 난 후 문국현 지지로 돌아서며 한 말이 바로 그와 같았다. 자신의 표를 권영길 그 버럭영감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과 그 주변 정치 세력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상할 수 있는 바였지만 바로 그렇기에 보는 이를 속 터지게 했다. 그렇다. 솔직히 찍을 사람이 없긴 하다.
김대중이 4수 했다는 말로 자신의 노욕을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영길과 이회창은 심지어 공통점을 지니기까지 한다. 이번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되었을 후보가 둘 있다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은 전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에는 너무도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마저도 흡사하다. 경제 일변도로만 흐르는 현 대선 정국에 일갈을 가했다는 점에서는 이회창의 정치적 감각을 칭찬해줄만 하지만, 햇볕정책의 번복을 당연히 포함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극우파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명박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갑제가 몸소 나서서 특종을 낚아왔다는 것만 봐도 정통 극우파들이 이회창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이내 알 수 있는 것이다.
대선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탄핵당할 것만 같은 이명박은 애초에 '찍을 사람'으로서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이회창에게 지지율 파먹히는 정동영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한계도 너무도 명백하니 그에게 표를 준다고 해서 그게 사표가 아니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말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정권재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너무도 뻔뻔한 표 구걸일 뿐이니 그에 대해서는 이 이상 특별한 고찰을 하지 말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전 유한킴벌리 회장 문국현이다.
처음 언급한 대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민주노동당 친화적인 유권자들이 선택지로 삼곤 하는 인물이 바로 문국현이니, 결국 이 글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문국현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 된다. 우선, 훌륭한 기업가를 뽑아놓으면 한국에 훌륭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고, 성공적인 중소기업 사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중소기업이 알아서 육성되리라는 발상이 얼토당토 않다는 논박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문국현이라는 CEO가 '잠재성장률'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명박의 747 플랜에 맞서 8% 성장률 달성 같은 구호를 내걸었다가 숱한 블로거들로부터 빈축을 샀다는 점도 여기서는 논하지 말기로 하자. 요컨대 자신이 표방하는 바를 다 구현하지 못해도 상관없고,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처럼) 무지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문국현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문국현이 단일화를 통해 범여권의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이명박이 낙마하고 박근혜가 이회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햇볕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아 보인다고 쳐보자. 그 시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창조한국당과 또 한 번의 대통합을 성사시키고, 어찌어찌 역사의 주사위가 야바위처럼 굴러가서 문국현이 단일후보로 추대되었다고 쳐보자. 이런 식이라면 나도 문국현 지지자들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정세를 놓고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국현 본인은 절대 단일화에 뜻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허지웅의 경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문국현 지지자들은 문국현이 '기존 정치판'의 난잡한 질서에 '단일화' 따위를 통해 포섭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논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길게 보고 문국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국현 지지는 큰 난점에 부딪친다. 설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오늘의 문국현이 킹왕짱 후보라고 하더라도, 5년 후의 문국현이 지금의 그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다 아는 그 부산 사나이의 경우를 짚어보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삼성 비자금 문제에 있어서 특검법 통과를 가장 단호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바로 청와대이며, 대통령 노무현은 부산에서 낙방하던 시절부터 삼성의 관리 대상 중 일부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 지망생이 자신의 사무실을 유지하며 정치 조직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금전이 요구된다. 상근자들에게 월급을 10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다섯 명이면 500만원이고 1년이면 6000만원이 들어간다. 군 의원의 경우가 이런 수준이고, 전국 단위의 대선을 노리고 있다면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현대의 왕회장 정주영도 개인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짓 하다보니까 현대그룹이 통째로 삐걱거렸다.
문국현 지지자들의 현실 감각과 이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한다. 그들 또한 문국현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대선 이상 연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TV광고 한 번 할 만큼의 돈도 없다고 괴로워하는 문국현 홈페이지의 호소문이 괜히 올라와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문국현이 이번 대선을 깨끗하게 통과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의 허황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국현 순수주의자'들의 나이브함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바꾸자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을 도외시하는 지지자 무리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본 적이 없다.
문국현은 '빤짝 스타'로서 대선판을 잡아먹을 정도의 야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이에 대해서는 김수민이 쓴 이 글을 참조하라). 하지만 그에게는 그를 지탱해줄 수 있을만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의 그 오랜 세월동안 깨끗한 신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곱게 지키고 있을 수도 없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이라는 거대한 기근 앞에서, 문국현은 그저 한 점의 생선회와도 같은 정치인일 뿐이다. 그거 한 점 집어먹는다고 배가 부를 리 만무하지만,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곧 상해버릴 수밖에 없다. 얼려놓고 어쩌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자신을 중도세력이라고 믿는 많은 이들이 좌파들에게 늘 하던 말을 이제 돌려줄 때가 왔다. 문국현을 찍는 것은 그만큼의 사표를 만드는 일일 뿐이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인제 사표와 같은, 역사적 역효과를 낼 수도 없는 그저 사표로서 사표일 뿐인 그런 사표가 바로 문국현 지지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국현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문국현에게 '투자'한다는 등의 메타포를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문국현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문국현 자신조차도 종종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 FTA에 대한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달러화 약세로 대변되는 세계 질서의 개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문국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 잘난 '사람중심 진짜경제' 말고 문국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틀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후보의 '사상'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문국현 지지자들의 논리이지만, 본래의 개념상 장기투자는 자신이 잘 아는 우량기업에 대해 하는 것이지 어디서 듣보잡 컴퍼니의 투자설명회 듣고 와서 집문서 밀어 넣는 그런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문국현 또한 '찍어줄 사람'은 아니다.
찍어줄 만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이 대선 정국을 확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찍을 사람이 없다'는 담론의 성격에 대한 본래의 고찰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굵은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이었다. 정당정치의 실패가,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자 독자 출마하여 한나라당을 말아먹은 이인제를 낳았고, 그러한 이인제짓을 막기 위한 공선법, 흔히 말하는 '이인제법'을 낳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에 당한 이회창에게 다시 이인제짓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최장집의 분석은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도 타당하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원동력이 바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궁시렁거림에 있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지지하고 싶다면, 비록 후보자의 개인적 성격이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는 대선 정국이라 하더라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비록 그 정당이 자신이 바라는 이념적 지향을 100%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키신저의 말마따나, 그 100%의 이상으로 향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회창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6~70대의 반공주의자들. 이명박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4~50대 경제주의자들. 그리고 범여권을 두루 포괄하는 3~40대 '386 세대'들. 이들이 한국 정치의 모든 지분을 셋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최소한의 좌파 정치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우나 고우나 일단 민주노동당을 찍어야 한다. 심상정이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명박을 찍어주겠다던 한나라당 지지자들만도 못한 당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탈당을 참고 있는 심상정에게 당을 깨라고 종용하는 이들의 정치적 IQ는 과연 얼마나 될지 너무도 궁금하다. 그들은 심상정을 박근혜만도 못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경선에서 졌다면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 승복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정치를 오직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적 요구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일단 민주노동당의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최소한의 연습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권영길이 싫다. 나도 주사파를 혐오한다. 주사파와 손을 잡은 권영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대부분의 상식인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우파가 급격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며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좌파 정치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 지켜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선택은 명백하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나는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민주노동당을 찍겠다. 그것이야말로 심상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며, 아주 큰 그림을 놓고 볼 때에도 유익하고 건전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 내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 지니고 있는 고답성에 대한 것이다. 나의 주변 가까운 사람 중 하나가 민주노동당 경선 이후, 즉 심상정이 주사파의 조직표 2000장에 의해 결선투표에서 고배를 마시고 난 후 문국현 지지로 돌아서며 한 말이 바로 그와 같았다. 자신의 표를 권영길 그 버럭영감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과 그 주변 정치 세력들이 보여준 모습은, 예상할 수 있는 바였지만 바로 그렇기에 보는 이를 속 터지게 했다. 그렇다. 솔직히 찍을 사람이 없긴 하다.
김대중이 4수 했다는 말로 자신의 노욕을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영길과 이회창은 심지어 공통점을 지니기까지 한다. 이번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되었을 후보가 둘 있다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은 전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에는 너무도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마저도 흡사하다. 경제 일변도로만 흐르는 현 대선 정국에 일갈을 가했다는 점에서는 이회창의 정치적 감각을 칭찬해줄만 하지만, 햇볕정책의 번복을 당연히 포함하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극우파이며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명박을 떨어뜨리기 위해 조갑제가 몸소 나서서 특종을 낚아왔다는 것만 봐도 정통 극우파들이 이회창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이내 알 수 있는 것이다.
대선 시작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탄핵당할 것만 같은 이명박은 애초에 '찍을 사람'으로서 고려 대상이 아닐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이회창에게 지지율 파먹히는 정동영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한계도 너무도 명백하니 그에게 표를 준다고 해서 그게 사표가 아니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말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정권재창출을 하지 않겠다는 솔직한 자기고백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너무도 뻔뻔한 표 구걸일 뿐이니 그에 대해서는 이 이상 특별한 고찰을 하지 말기로 하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전 유한킴벌리 회장 문국현이다.
처음 언급한 대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민주노동당 친화적인 유권자들이 선택지로 삼곤 하는 인물이 바로 문국현이니, 결국 이 글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문국현을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논증하기 위한 것이 된다. 우선, 훌륭한 기업가를 뽑아놓으면 한국에 훌륭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고, 성공적인 중소기업 사장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중소기업이 알아서 육성되리라는 발상이 얼토당토 않다는 논박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문국현이라는 CEO가 '잠재성장률'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명박의 747 플랜에 맞서 8% 성장률 달성 같은 구호를 내걸었다가 숱한 블로거들로부터 빈축을 샀다는 점도 여기서는 논하지 말기로 하자. 요컨대 자신이 표방하는 바를 다 구현하지 못해도 상관없고,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처럼) 무지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문국현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문국현이 단일화를 통해 범여권의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이명박이 낙마하고 박근혜가 이회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햇볕정책을 철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도 높아 보인다고 쳐보자. 그 시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창조한국당과 또 한 번의 대통합을 성사시키고, 어찌어찌 역사의 주사위가 야바위처럼 굴러가서 문국현이 단일후보로 추대되었다고 쳐보자. 이런 식이라면 나도 문국현 지지자들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대북정책의 기조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정세를 놓고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국현 본인은 절대 단일화에 뜻이 없다고 공언하고 있고, 허지웅의 경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문국현 지지자들은 문국현이 '기존 정치판'의 난잡한 질서에 '단일화' 따위를 통해 포섭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논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길게 보고 문국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국현 지지는 큰 난점에 부딪친다. 설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오늘의 문국현이 킹왕짱 후보라고 하더라도, 5년 후의 문국현이 지금의 그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다 아는 그 부산 사나이의 경우를 짚어보자.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삼성 비자금 문제에 있어서 특검법 통과를 가장 단호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바로 청와대이며, 대통령 노무현은 부산에서 낙방하던 시절부터 삼성의 관리 대상 중 일부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 지망생이 자신의 사무실을 유지하며 정치 조직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금전이 요구된다. 상근자들에게 월급을 10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다섯 명이면 500만원이고 1년이면 6000만원이 들어간다. 군 의원의 경우가 이런 수준이고, 전국 단위의 대선을 노리고 있다면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단적인 예로 현대의 왕회장 정주영도 개인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짓 하다보니까 현대그룹이 통째로 삐걱거렸다.
문국현 지지자들의 현실 감각과 이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충돌한다. 그들 또한 문국현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대선 이상 연장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TV광고 한 번 할 만큼의 돈도 없다고 괴로워하는 문국현 홈페이지의 호소문이 괜히 올라와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문국현이 이번 대선을 깨끗하게 통과하고 다음 대선을 노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희망'의 허황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문국현 순수주의자'들의 나이브함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바꾸자고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을 도외시하는 지지자 무리를 우리는 일찍이 경험해본 적이 없다.
문국현은 '빤짝 스타'로서 대선판을 잡아먹을 정도의 야수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이에 대해서는 김수민이 쓴 이 글을 참조하라). 하지만 그에게는 그를 지탱해줄 수 있을만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의 그 오랜 세월동안 깨끗한 신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곱게 지키고 있을 수도 없다.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이라는 거대한 기근 앞에서, 문국현은 그저 한 점의 생선회와도 같은 정치인일 뿐이다. 그거 한 점 집어먹는다고 배가 부를 리 만무하지만,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곧 상해버릴 수밖에 없다. 얼려놓고 어쩌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자신을 중도세력이라고 믿는 많은 이들이 좌파들에게 늘 하던 말을 이제 돌려줄 때가 왔다. 문국현을 찍는 것은 그만큼의 사표를 만드는 일일 뿐이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인제 사표와 같은, 역사적 역효과를 낼 수도 없는 그저 사표로서 사표일 뿐인 그런 사표가 바로 문국현 지지표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국현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문국현에게 '투자'한다는 등의 메타포를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문국현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문국현 자신조차도 종종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 FTA에 대한 그의 입장은 무엇인가? 달러화 약세로 대변되는 세계 질서의 개편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문국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그 잘난 '사람중심 진짜경제' 말고 문국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틀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후보의 '사상'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문국현 지지자들의 논리이지만, 본래의 개념상 장기투자는 자신이 잘 아는 우량기업에 대해 하는 것이지 어디서 듣보잡 컴퍼니의 투자설명회 듣고 와서 집문서 밀어 넣는 그런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문국현 또한 '찍어줄 사람'은 아니다.
찍어줄 만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이 대선 정국을 확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찍을 사람이 없다'는 담론의 성격에 대한 본래의 고찰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굵은 이데올로기적 장애물이었다. 정당정치의 실패가,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떨어지자 독자 출마하여 한나라당을 말아먹은 이인제를 낳았고, 그러한 이인제짓을 막기 위한 공선법, 흔히 말하는 '이인제법'을 낳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에 당한 이회창에게 다시 이인제짓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최장집의 분석은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도 타당하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원동력이 바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궁시렁거림에 있다는 것이다.
정당정치를 지지하고 싶다면, 비록 후보자의 개인적 성격이 매우 강력하게 드러나는 대선 정국이라 하더라도,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비록 그 정당이 자신이 바라는 이념적 지향을 100%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키신저의 말마따나, 그 100%의 이상으로 향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회창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6~70대의 반공주의자들. 이명박을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4~50대 경제주의자들. 그리고 범여권을 두루 포괄하는 3~40대 '386 세대'들. 이들이 한국 정치의 모든 지분을 셋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최소한의 좌파 정치의 몫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우나 고우나 일단 민주노동당을 찍어야 한다. 심상정이 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명박을 찍어주겠다던 한나라당 지지자들만도 못한 당 충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탈당을 참고 있는 심상정에게 당을 깨라고 종용하는 이들의 정치적 IQ는 과연 얼마나 될지 너무도 궁금하다. 그들은 심상정을 박근혜만도 못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경선에서 졌다면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경선에 승복했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또한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정치를 오직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적 요구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일단 민주노동당의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최소한의 연습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권영길이 싫다. 나도 주사파를 혐오한다. 주사파와 손을 잡은 권영길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대부분의 상식인들에게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국에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하며, 우파가 급격한 세포 분열을 거듭하며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좌파 정치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 지켜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의 선택은 명백하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나는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민주노동당을 찍겠다. 그것이야말로 심상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이며, 아주 큰 그림을 놓고 볼 때에도 유익하고 건전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택할 수 있는 정치적 행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2007-11-22
2007-11-20
스파이웨어를 품고 있는 스파이 영화
스파이웨어를 품고 있는 스파이 영화
오스카 수상 감독 리안의 최신작 "색, 계"가 여러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며 전 세계의 은막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그의 스파이 스릴러는, 일제 부역자를 유혹하고 암살하기 위해 훈련받은 한 젊은 여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그것은 미국에서 NC-17 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골적인 섹스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리안 감독이 화려한 섹스신의 일부를 덜어내지 않으면 그 영화를 극장에서 빼버리겠다는 정부 검열 당국의 위협이 있었다. 그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금 "색, 계"는 고작 두 주만에 9천만 위안을 벌어들이며 중국 박스 오피스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그 영화는 가볍게 그 해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판에서 사라져버린 7분은 몇몇 영화 관람자들이 무삭제판을 보기 위해 국경을 넘어 홍콩으로 가게 만들었다.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무삭제판은 또한 많은 영화광들을, 무삭제판을 다운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적질을 하려는 이들은 대신 스파이웨어를 다운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안티 바이러스 업체인 Rising International Software는 "색, 계"의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수백 개의 사이트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훔치는 바이러스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경고했다.
관리들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만을 경고하고 있지 않다. 광동성의 의사들은 영화에 등장한 더욱 도전적인 섹스신을 따라하고자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영화 관람객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 매체인 신화통신에서 운영하는 포털 신화넷은, 한 의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색, 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성적인 움직임은 비정상적인 체위이다... 체조나 요가 훈련 등을 통해 완전히 유연한 몸을 지니고 있는 여성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다가는 불필요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영화를 재편집하면서 이안 감독은 영화의 제목을 "섹, 계, 특별히 경계"라고 이름 붙였어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틴 Y. 첸 - FP Passport
오스카 수상 감독 리안의 최신작 "색, 계"가 여러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며 전 세계의 은막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그의 스파이 스릴러는, 일제 부역자를 유혹하고 암살하기 위해 훈련받은 한 젊은 여성을 다루고 있다. 또한 그것은 미국에서 NC-17 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골적인 섹스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리안 감독이 화려한 섹스신의 일부를 덜어내지 않으면 그 영화를 극장에서 빼버리겠다는 정부 검열 당국의 위협이 있었다. 그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금 "색, 계"는 고작 두 주만에 9천만 위안을 벌어들이며 중국 박스 오피스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그 영화는 가볍게 그 해 최고의 히트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판에서 사라져버린 7분은 몇몇 영화 관람자들이 무삭제판을 보기 위해 국경을 넘어 홍콩으로 가게 만들었다.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무삭제판은 또한 많은 영화광들을, 무삭제판을 다운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적질을 하려는 이들은 대신 스파이웨어를 다운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의 안티 바이러스 업체인 Rising International Software는 "색, 계"의 무료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수백 개의 사이트에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훔치는 바이러스가 숨어있을 수 있다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경고했다.
관리들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만을 경고하고 있지 않다. 광동성의 의사들은 영화에 등장한 더욱 도전적인 섹스신을 따라하고자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영화 관람객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 매체인 신화통신에서 운영하는 포털 신화넷은, 한 의사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색, 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성적인 움직임은 비정상적인 체위이다... 체조나 요가 훈련 등을 통해 완전히 유연한 몸을 지니고 있는 여성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다가는 불필요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영화를 재편집하면서 이안 감독은 영화의 제목을 "섹, 계, 특별히 경계"라고 이름 붙였어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틴 Y. 첸 - FP Passport
2007-11-19
희망돼지의 실패
참여정부가 초기의, 지금 생각해보면 사소한 삽질을 하고 있을 당시, 정상적인 기억력을 지니고 있던 소수의 노무현 지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했다. "뭐야? 노무현 우리가 준 희망돼지로 대통령 되었잖아, 그럼 우리가 고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고분고분 우리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냐?" 이제 임기를 3개월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그 모든 의문들은 나노 단위로 쪼개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아닌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돈을 돼지저금통에 담아서 주는 게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돼지를 그저 잡아먹었을 뿐, '국민'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시장이라고 쓰고 삼성이라고 읽는 그 무언가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겁내지 않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란색 돼지모양 플라스틱 저금통에 백원 십원 오백원 천원짜리 꼬깃꼬깃 모아서 줘봐야 별무소용이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에게 '이 돈 받고 대통령 된 다음 엉뚱한 정책 시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돼지 모양 저금통이 아니라, 하늘색 이건희 대통령, 아니 회장 모양의 저금통을 보냈어야 하지 않을까. 지지율 10%대의 신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희망' 타령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들은 그 결과가 바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는 커녕, 그것을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답습하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섯불리 희망이 어쩌고 민생이 어쩌고 논하기 전에, 5년 전의 희망돼지가 어떻게 도축되었는지에 대해 잠시나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쪽을 권하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돈을 돼지저금통에 담아서 주는 게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돼지를 그저 잡아먹었을 뿐, '국민'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는 시장이라고 쓰고 삼성이라고 읽는 그 무언가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겁내지 않는 사나이이기 때문에, 애초에 노란색 돼지모양 플라스틱 저금통에 백원 십원 오백원 천원짜리 꼬깃꼬깃 모아서 줘봐야 별무소용이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에게 '이 돈 받고 대통령 된 다음 엉뚱한 정책 시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돼지 모양 저금통이 아니라, 하늘색 이건희 대통령, 아니 회장 모양의 저금통을 보냈어야 하지 않을까. 지지율 10%대의 신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희망' 타령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들은 그 결과가 바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는 커녕, 그것을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답습하면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섯불리 희망이 어쩌고 민생이 어쩌고 논하기 전에, 5년 전의 희망돼지가 어떻게 도축되었는지에 대해 잠시나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쪽을 권하고 싶다.
입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이 블로그를 통해 아기고양이를 주워왔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가을이와 함께 살아야 하므로 계속 사이가 좋지 않은 채로 지속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과 가을이의 관계가,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썩 나쁘지는 않은 정도로 진전되었고, 이래저래 정도 들고 해서, 그냥 내가 기르기로 했습니다. 잠시나마 설레였던 방문자분들께서는 서운하시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의 회의 끝에 녀석의 이름은 '입동'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을이를 데려올 당시 아름다운 가을 오후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 탓에 그 녀석이 가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듯이, 이 업둥이를 업어오던 때는 입동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가르는 빗방울이 떨어지던 시점이어서, 이렇듯 천시를 고려한 끝에 붙인 이름이니 다들 순순히 납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겨울이라고 부를까 했지만 고양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이라는 단어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동으로 갔습니다.
사진이나 육아일기 등 방문자들을 즐겁게 할만한 자료는 추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의 회의 끝에 녀석의 이름은 '입동'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을이를 데려올 당시 아름다운 가을 오후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진 탓에 그 녀석이 가을이라고 불리게 되었듯이, 이 업둥이를 업어오던 때는 입동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가르는 빗방울이 떨어지던 시점이어서, 이렇듯 천시를 고려한 끝에 붙인 이름이니 다들 순순히 납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는 겨울이라고 부를까 했지만 고양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을'이라는 단어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동으로 갔습니다.
사진이나 육아일기 등 방문자들을 즐겁게 할만한 자료는 추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11-18
Visiting the Library in a Strange City
Visiting the Library in a Strange City
by Franz Wright
The words reappear, slowly
developing
on a vast unknown
but precise number of pages
as I enter: the great building
empty of visitors
except for me, reading
the minds of the dead—
moving with exaggerated
and slow-motion care,
as when assigned to lead
the blind kid to his classroom
forty years ago,
down rows
between dusty volumes, a light
snow beginning.
by Franz Wright
The words reappear, slowly
developing
on a vast unknown
but precise number of pages
as I enter: the great building
empty of visitors
except for me, reading
the minds of the dead—
moving with exaggerated
and slow-motion care,
as when assigned to lead
the blind kid to his classroom
forty years ago,
down rows
between dusty volumes, a light
snow beginning.
2007-11-15
새끼고양이를 주웠습니다
새끼고양이를 주웠습니다. 나이는 2~3개월 가량 되어보이고, 암컷이며, 검은색 흰색 혼합입니다. 사진을 핸드폰에서 꺼내기에는 다소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가을이같은 미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위기 있게 생겼습니다. 성격이 아주 대범해서, 가을이가 잔뜩 경계하고 하악거리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주는 밥 잘 먹고 이불 위에서 잡니다. 제가 데리고 오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겁내거나 앙탈부리지 않았고요. 마치 만화 [아기와 나]의 검은 머리 아기,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애 같군요.
당장 식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을이가 계속 불안해하고 하악질을 한다면 저는 이 새끼고양이를 다른 분께 분양할 생각입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일에 관심이 있는 방문자께서는 이후 올라올 경과 보고를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식구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을이가 계속 불안해하고 하악질을 한다면 저는 이 새끼고양이를 다른 분께 분양할 생각입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일에 관심이 있는 방문자께서는 이후 올라올 경과 보고를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11-14
2007-11-09
조선일보의 [88만원 세대] 언급, 과연 부정적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책이 조선일보에 언급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쏙 빠진채 386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조선일보 편집진에게 왜곡된 형태로 인용되고 있다는 지적들은 다 옳다. 하지만 바로 그 왜곡된 인용이야말로 [88만원 세대]가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책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가 [88만원 세대]를 자기들 입맛대로 인용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잠시만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울 뿐더러 일관성 있는 정치적 행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86의 정치적 봉기를 막기 위해 부모들이 '용돈권력'을 통해 20대 표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들이다. 그 책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자는 내용으로 읽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요컨대 이 칼럼의 논조는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조선일보에 대해 새삼스럽게 '왜 책 인용을 그따위로 하는가'라고 분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큰 실익은 없다. 조선일보는 텍스트를 멋대로 해석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경지를 획득하고 있는 독특한 글쟁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조선일보가 어떤 책의 논지를 있는 그대로, 정치적 차원에서 왜곡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조선일보가 아닐 터이다.자신들만의 독특한 영문법과 영어사전을 이미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도 디워에 대한 찬사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그들이다. 뭘 더 바래?
여기서 문제는 조선일보라는 한 신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저서가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 인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일종의 철학적 차원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왜곡된 형태로나마 인용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책은, 경제학자가 쓴 사회 경제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또 한국 사회의 지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88만원 세대]의 내용을, 그것이 한국 사회의 '밝은 음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정작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목격한 바 없다. 청년실업이 턱도 없이 심각하다는 것, 그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석훈은 20대 왕자님 공주님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경제학적 용어를 통해 서술했다. 그 진실은, 막상 폭로되고 나니 너무도 명확한 것이어서, 그 누구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렇다면 폭로된 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혹은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88만원 세대들에게 다른 이들이 어떤 자세를 요구할 것인지 등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의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는 88만원 세대를 '한 표 가지고 있는 얼간이들'로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떡하니 저따위 칼럼을 써놓고,이영하의 이름을 들먹이면 젊은 층이 좋아라 하겠거니 착각의 댄스를 추고 있는 것일 뿐이다. 웹 서핑을 이상하게 해놓고서, 혹은 이상하게 하는 후배 기자의 덜떨어진 요약을 전해듣고서, 이렇게 하면 떡밥을 뿌릴 수 있겠거니 야무진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88만원 세대] 인용은 지적 무능과 부정직을 드러내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이간질이 그다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붙잡힌 이따위 포스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88만원 세대 중 제대로 머리가 썩은 것들은 심지어는 조선일보의 칼럼조차 존중하지 않는다. 386과 정면대결을 펼친다고? 천만에. "귀는 솔깃하나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 읽으면 괴리가 큼. 우석훈씨 다른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책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툭하면 프랑스, 프랑스 타령 하는 홍세화씨와 동급이라고 봄. 그 사람 말대로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치느니(저자 역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공부해서 요 아수라장을 헤치며 박차고 올라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쨍알거리는 것이 바로 88만원 세대의 진면목임을 조선일보는 아직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정 반대 방향에서 보자면, 조선일보의 왜곡된 정치적 인용은 [88만원 세대]를 읽고도 무기력하게 주저앉기만 하는 88만원 세대들에게 일종의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그 책의 특정 어구가 등장하는 조선일보의 칼럼에는 어김없이 '이 책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는 논지의 리플이 올라온다. 조선일보의 말이라면 일단 믿지 않고 보는 것, 그리하여 그 어떤 언론도 믿지 않게 되어버린 것은 분명 안티조선 운동의 부작용이지만, 이 경우 그러한 사고방식은 오답의 오답을 통해 20대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답에 다소 근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낳는다.
[88만원 세대]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책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올바르지 않은 정치적 지향을 위해 텍스트마저도 곡해하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가지고 있는데, 대중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그 책을 다소 왜곡된 시각으로 읽는다고 해서 특별히 한국 사회의 담론적 수준이 더 저하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결국 [88만원 세대] 같은 책을 써도 조선일보에 인용되고 곡해될 뿐이다'라는 식의 회의주의에 빠짐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지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 자체를 허망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신을 신고 걷다보면 꽃밭도 통과하고 똥도 밟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발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선 조선일보가 [88만원 세대]를 자기들 입맛대로 인용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잠시만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러울 뿐더러 일관성 있는 정치적 행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86의 정치적 봉기를 막기 위해 부모들이 '용돈권력'을 통해 20대 표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들이다. 그 책을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자는 내용으로 읽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요컨대 이 칼럼의 논조는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조선일보에 대해 새삼스럽게 '왜 책 인용을 그따위로 하는가'라고 분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큰 실익은 없다. 조선일보는 텍스트를 멋대로 해석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경지를 획득하고 있는 독특한 글쟁이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조선일보가 어떤 책의 논지를 있는 그대로, 정치적 차원에서 왜곡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조선일보가 아닐 터이다.자신들만의 독특한 영문법과 영어사전을 이미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도 디워에 대한 찬사를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그들이다. 뭘 더 바래?
여기서 문제는 조선일보라는 한 신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저서가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 인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일종의 철학적 차원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왜곡된 형태로나마 인용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책은, 경제학자가 쓴 사회 경제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또 한국 사회의 지적인 미성숙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88만원 세대]의 내용을, 그것이 한국 사회의 '밝은 음지'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정작 그 책의 내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목격한 바 없다. 청년실업이 턱도 없이 심각하다는 것, 그것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청년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석훈은 20대 왕자님 공주님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경제학적 용어를 통해 서술했다. 그 진실은, 막상 폭로되고 나니 너무도 명확한 것이어서, 그 누구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렇다면 폭로된 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혹은 당사자이며 피해자인 88만원 세대들에게 다른 이들이 어떤 자세를 요구할 것인지 등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의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는 88만원 세대를 '한 표 가지고 있는 얼간이들'로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떡하니 저따위 칼럼을 써놓고,이영하의 이름을 들먹이면 젊은 층이 좋아라 하겠거니 착각의 댄스를 추고 있는 것일 뿐이다. 웹 서핑을 이상하게 해놓고서, 혹은 이상하게 하는 후배 기자의 덜떨어진 요약을 전해듣고서, 이렇게 하면 떡밥을 뿌릴 수 있겠거니 야무진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88만원 세대] 인용은 지적 무능과 부정직을 드러내는 현상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이간질이 그다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 붙잡힌 이따위 포스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88만원 세대 중 제대로 머리가 썩은 것들은 심지어는 조선일보의 칼럼조차 존중하지 않는다. 386과 정면대결을 펼친다고? 천만에. "귀는 솔깃하나 자세히 하나하나 따져 읽으면 괴리가 큼. 우석훈씨 다른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책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툭하면 프랑스, 프랑스 타령 하는 홍세화씨와 동급이라고 봄. 그 사람 말대로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치느니(저자 역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했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한자라도 더 공부해서 요 아수라장을 헤치며 박차고 올라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쨍알거리는 것이 바로 88만원 세대의 진면목임을 조선일보는 아직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
하지만 정 반대 방향에서 보자면, 조선일보의 왜곡된 정치적 인용은 [88만원 세대]를 읽고도 무기력하게 주저앉기만 하는 88만원 세대들에게 일종의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그 책의 특정 어구가 등장하는 조선일보의 칼럼에는 어김없이 '이 책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는 논지의 리플이 올라온다. 조선일보의 말이라면 일단 믿지 않고 보는 것, 그리하여 그 어떤 언론도 믿지 않게 되어버린 것은 분명 안티조선 운동의 부작용이지만, 이 경우 그러한 사고방식은 오답의 오답을 통해 20대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정답에 다소 근접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낳는다.
[88만원 세대]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책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올바르지 않은 정치적 지향을 위해 텍스트마저도 곡해하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를 가지고 있는데, 대중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그 책을 다소 왜곡된 시각으로 읽는다고 해서 특별히 한국 사회의 담론적 수준이 더 저하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결국 [88만원 세대] 같은 책을 써도 조선일보에 인용되고 곡해될 뿐이다'라는 식의 회의주의에 빠짐으로써, 지금 이 시대를 지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 자체를 허망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신을 신고 걷다보면 꽃밭도 통과하고 똥도 밟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발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2007-11-08
영국에서는 이래도 되나?
BBC Learning English에서 갓 나온 꼭지를 듣다가 오밤중에 그만 웃어버리고 말았다. 실의에 빠져있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다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위로해주는 방법, 그럴때 요긴한 몇 가지 표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 첫번째와 두번째 예시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 페이지에서 직접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화자가 빈정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을 함부로 가르치는 BBC의 반성을 촉구한다.
| Language for pointing out the positive side of a situation | Examples |
| At least... | My flatmate, Sue, is always borrowing my CDs and she only gives them back when I go and ask her for them! |
| But... | My mum always calls me in the evenings when I'm trying to study. Yeah, but she does call you! My family never call me. I have to call them! |
이 페이지에서 직접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화자가 빈정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을 함부로 가르치는 BBC의 반성을 촉구한다.
2007-11-06
최근 가장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게시물
허지웅 기자는 자신이 쓴 [88만원 세대]에 대한 기사를 블로그에 올려놓았고, 거기에는 득달같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리플과 트랙백을 달아놓았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나의 눈길을 끌었고 분노를 자아냈다. "20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20대의 침묵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포스트에서, 화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필자는 가능하면 오프모임에 많이 참석하려 노력한다. 최근에는 문국현 지지자 모임에 거의 매일 참석하고 있다. 그런데, 39살인 내가 막내인 경우가 많다. 도대체 나보다 젊은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는걸까?"라고 탄식을 한다. 바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한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환원시키는 사고방식이 대한민국의 5년을 '희망고문' 속에서 잘게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저 글의 화자는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기껏 내놓는 결론이라고는 값싼 훈계일 뿐. '88만원 세대는 문국현을 지지하라'는 식의 레토릭이 횡횡하기 전에 그 후보의 빈약한 체급이 드러나버려서 참으로 다행이다.
제왕병 환자들
'희망'을 부르짖는 문국현 지지자들에게서 나는 [눈물을 마시는 새]에 나오는 제왕병 환자들의 육체적 현현을 본다. 혹자는 그들의 행태를 '의장님 문화'의 연속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문국현 지지자들이 오직 386에 국한되어 있을 것이라는 단견에서 비롯한 착각일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00분 토론 출연을 계기로 문국현이라는 후보가 과거의 박찬종만도 못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일찌감치 폭로되었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이회창이 격돌하는 시점에, 엉뚱한 사람을 '희망'으로 모셔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문을 외치던 문국현 지지자들은 닭 쫓던 개 꼴이 되었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본인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만한 파괴력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제3후보와는 전혀 무관한 방향으로만 집중되고 있다. 잔치는 끝났다.
2007-10-25
[리빙포인트] 중간고사 공부를 안 했다면
2007-10-20
김어준의 저공비행 2004/10/13(수) 배수의 진 - 철학
김어준의 저공비행 2004/10/13(수) 배수의 진 "철학" 녹취록
** 이제와 말하는 건데, 이거 녹취한 놈이 접니다. 다시 보니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잘못 알아들은 곳도 있네요. 그걸 수정할 겸 해서, 오늘 어쩌다가 언급하게 되어 추억을 되새길 겸, 방송 녹음 파일과 함께 올립니다. (비고: 현재 녹음 파일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파일이 없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김어준의 오프닝 멘트: 기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러나 많이 알고 싶지는 않고(키득) 딱 기죽지 않을 만큼만 알고 싶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아는 척 할 만큼만 알려주는 문화의 마지노선 배수의 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적임자를 만나서 이 코너를 부활시켰습니다.
헤어스타일로 철학을 하는 철학자 강유원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진행하기로 할 텐데, 광고를 듣고 배수의 진, 오랜만에 부활한 배수의 진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의 진
김 : 안녕하십니까.강 : 예 안녕하십니까.
김 : 헤어스타일이 오늘은 좀 차분한 것이, 흐음...
강 : 예, 오늘 물묻은 상태에서 잠을 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 :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강 : 원하시면 제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 저희 강유원 박사님은 헤어스타일로 철학을 하시고
강 : 차력도 합니다. (웃음)
김 : 헤어스타일로
강 : 몸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 :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과거 배추머리 김병조씨 였던가요? 그 머리를 조금 더 뻥튀기하면 나오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강 : 고맙습니다.
김 : 배수의 진을 저희가 부활을 시켰는데, 저희가 박사님땜에 부활시켰습니다.
강 : 아 그래요? 저도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해보겠습니다.
김 : 배수의 진 코너의, 저희 코너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먹고살기 바쁜데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강 : 그렇죠. 그래서도 안되고.
김 :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두 마디 정도 안하면 기죽고 그래서 한 두 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공자들처럼 원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습니까. 한두마디 착 치고 탁 빠지고(쿡쿡) 그럴 때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 강 : 좋습니다.
김 : 삶의 태도가 얍삽하긴 하나,
강 : 얍삽한 거 아니에요. 얍삽한 거는 이십분 정도 되는 시간 투자해서 들어서 외우지도 않고 아는 체 하는 게 얍삽한거고,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사항을 쫙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김 : 이것은 문화적 삶의 처세를 가르치는...
강 : 처세라기보다는 이것도 배수의 진입니다만 그거 처세술 아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삶의 태도지. (웃음) 또는 이게 옷 브랜드가 있거든요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는 브랜드 기억하시죠? 이게 라틴어인데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게 나의 모두스 비벤디야 이러면 됩니다. (폭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삶의 방식. 모두스가 방식이라는 말이고요 비벤디가 삶의 라는 말인데,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라틴어는 불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뒤에 있습니다. (웃음) 삶의 방식. 모두스 비벤디야. 너무 굴리시면 안 되고요, 굴릴만한 발음이 없습니다.
김 : 나의 모두스 비벤디지 하면서 표정을 싹 굳히는 거죠.
강 : 약간 시선을 한시 방향으로 돌리면서 어금니를 한쪽으로 딱 앙다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발음이 딱 나오거든요. 모두스 비벤디 이렇게. (폭소)
김 : 철학을 전공하셨잖습니까.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어금니 깨물고 한시 방향 모두스 비벤디 이렇게.
강 : 네.
김 : 이십분 내에 대단히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강 : 예 저 그런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김 : 철학 그래서 오늘 첫시간은 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 : 아, 철학...
김 : 최근에 그 외 자크 데리다라고 죽었잖아요.
강 : 아, 자크와 콩나무라는게 있죠. 전 그 사람 생각나요. 자크 데리다 하면 자크와 콩나무 생각나요. 자크 데리다 보면 별로 중요한 철학자 아닙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스펠링 몰라도 되고, 자크와 콩나무 읽었다는게 더 중요하지 자크 데리다를 읽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계에서는요, 죽은지 50년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관습입 니다. 철학의 역사가 2500년이나 되다보니까 아직 옛날 사람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할게 많아요. 엊그저께 배운 사람들 다룰 시간 없어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그리고 1952년 이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선 저작권이 없거든요. 국제 저작권협회 규약에 따르면.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 번역하면 돈만 들어요.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웃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칸트같은 사람 18세기,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아직 연구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 1900년대, 2000년에 죽은 철학자를 우리가 돌볼 틈이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다 해체다 이러면 해체공법 이런 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폭소) 뭘 해체하는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크 데리다라든가 들뢰즈라던가 가타리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이런 등등이 주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는, 철학은 너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아직 20세기 21세기 사람을 다룰만큼 한가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소) 우리나라에 프랑스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 원전이 아직 다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시기상조지, 이렇게 (웃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유명한 사람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 나왔습니다. 제가 전공이 해겔 철학인데 서양철학사에서 현대철학으로 봅니다. 데리다 이런 사람은 애기죠. 신생아들이죠. 신생아의안마를 할 수가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자크 데리다 하면 아 철학의 신생아, 애기들이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번역된 원전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시기상조야. 렉시콘이 안 나왔거든. 렉시콘이라는게, 스펠링 적으세요, 엘 이 엑스 아이 씨 오 엔.(받아적듯 따라함) 렉시콘이라는게 이제 철학자가 사용한 용어들을 정리한 사전입니다.
김 : 이야 이거 중요하네.
강 : 렉시콘입니다. 엘 이 엑스 아이 씨 오 엔. 케이 오 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라틴어에서 기원한 말인데 영어에서도 쓰이고 독일어에선 케이 오 엔. 철학하는 업계에서는 다 통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다 쓰는 겁니다. 렉시콘이 아직 안 나왔잖아. 지금 몇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렉시콘 없는 철학자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김 :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얼마전에 자크 데리다 기사가 나오는데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길래, 그런데 나는 모르겠고 해서 약간 안타까움도 들고 뒤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크 데리다를 누가 말하면 기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강 : 아 그러세요? 일단 렉시콘까지는 얘기하신다음에 그건 그렇고 자크와 콩나무 읽어봤나? 이렇게. (폭소) 동화 안읽으면 기본이 안된거거든요 가정환경 안 좋았다는 증거가 되고 어렸을때 막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서 이상한 데 다녔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철학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동화책이 우리의 기본이지. 자크와 콩나무 읽어봤나 그걸로 가시면 상대는 완전히 제압되는거죠. 그리고 유유히 그럼 나 이만 동화나 읽으러 가겠네 떠나면, 간략하게 해결이 됩니다.
김 : 최근 수십년간 철학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오래된 양반들,
강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철학이 뭐냐 본격적인 철학 담론이 진행되는데 철학이 뭐야 이러면 플라톤이 말한 철학의 정의를 머리 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연구하잖습니까.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 플라톤 먼저 말씀드리면, 플라톤 스펠링이 피 엘 에이 티 오 엔 이에요. (으하하하)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피 엘 에이 티 오라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레이토 라고 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틀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면 안돼요, 피 엘 에이 티 오 엘 하고 피 엘 에이 티 오가 동일인물을 가리키는거에요. 형제를 가리키는게 아니에요.
김: 티 오 엔하고 티 오하고
강: 어 이게 제가 실제로 철학 개론 강의할 때 이 두 사람이 형제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형제가 아니라 번역본 따라서 달리 쓴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의 정의가 뭐냐면, 적으십쇼,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듯 한 단어씩 따라함) 으음 이게 이제 철학의 정의에요. 여기서 핵심은 탁월한 능력에 있어요.(탁월한 능력, 이라고 따라함) 철학은, 철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다 배웠다고 철학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서양철학사를 외웠다 이랬다고 철학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정의에 따르면 대상을 지적으로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기르는데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철학의 정의가 이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헤겔이 어땠네 니체가 어땠네 데리다가 어땠네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소곳이 들어줍니다. 계속 들어주다가, 그때 한 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플라톤이 철학을, 대상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공부해서 당신은 어떤 능력을 길렀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답이 막히게 되어있어요. 그럼 그것을 배워서 가령, 우리 눈 앞에 보이는 핸드폰에 대해 탁월하게 취급해봐. (웃음) 능력 있나? 그럼 자네는 철학의 기본 정의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암기만 한거야. 마치 수능 시험공부하듯 한건데 그건 아니라고. 철학은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대상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에요. 그럼 상대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대게 그렇게 당하면, 더 어려운 단어 독일어 불어 섞어가며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가 탁 한마디 합니다. 외국어 능력 말고. (폭소) 딱 이렇게 가주면, 플라톤 인용하면 어떤 사람을 전공한 사람이건간에 한수 접히거든요. 화이트헤드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 : 각주에, 해석에 불과하다?
강 :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덧붙이면 되는거죠. 지금 플라톤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폭소) 각주 아닌가, 나머지는.
김 : 각주라고 한 사람 누구라고요?
강 : 화이트헤드 흰머리 백두. 외우기 쉽습니다. 스펠링 다 아실거에요. 더블유 에이치 아이 티 이 헤이치 이 에이 디. 화이트헤드.
김 : 이 사람이,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강 : 네. 화이트헤드가 각주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까지 딱 정리가 되고 서양철학사에 나오는 지식인 많이 외운다고 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니까, 많은 대상에 대해서 각자 각자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헤드폰 연구하고 마이크 연구하고 안경 연구하고 PDA 연구하고 시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연구 많이 한 다음에 연구성과를 모아서 그것을 지적으로 정리하는게 철학 연구다, 저는 이렇게 보는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거죠. 좋다. 그럼 나는 철학사 공부한게 잘못이라 치자. 그럼 당신은 뭘 하는거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철학사는 최후의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올바로 보는 겁니다. 훌륭한 변명도 되고, 올바른 태도도 됩니다. 요즘에 대학에 철학과 학생들이 자기네 과에서 배우는 과목만 제대로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능력을 기르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강 :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능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철학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요. 우리가 흔히 인생철학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대충 다니는 사람 있죠? 열심히 다녀야 해요. 채팅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해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갈데까지 가보는 거 있죠. 철저하게 철학을 하는 기본입니다.
김 :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철학적 사유의 기본이다?
강 :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날마다 기록을 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할 것 둘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철저하게 기록할 것.
강 :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대단치 않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말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증명이라는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철학자들은 철학책에 나오는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연구를 하다가 혼자 하니깐 짜증나니까, 책을 쓰는거에요. 니들도 한번 죽어봐라 (대폭소), 책을 씁니다. 평생 고민했는데 안 풀렸어. 나 혼자 고민하기 억울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것까지 했단 말이지? 억울해. 니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천년전에, 플라톤 같으면 2500년 전에 나온 그 책을 아직도 읽는 거죠. 아직도 안 풀렸어요. 플라톤이 지금 웃고 있어요. 약오르지 하면서 웃고 있어요.
김 : 아주 오래된 건 플라톤으로 재끼고 최근의 것은 애잖아 하면서 재끼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할까요. 칸트도 등장하고.
강 :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할 철학자 네 다섯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플라톤 외우셔야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외우셔야됩니다. 속된 말로 기본안주. 체계적으로 철학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중세시대 들어오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습니다. 니체가 어떻네 하이데거가 어떻네 그러면 딱 한 마디 하세요. 그 사람들 체계를 세운 사람은 아니잖아. 시스템은 아니잖아. 흔히 하는 말로 잔챙이라고 하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 다섯명입니다. 외우십시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
김 : 니체는 안 들어가나요?
강 : 아... 애기는 아닌데요, 중학생 쯤 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일지 모르지만, 니체 좋아하는 사람은 다 파시스트입니다.( 폭소)
김 : 플라톤 소크라테스,
강 : 아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 칸트를 예로 들어 말하여 보면 칸트는, 칸트 같은 경우는 액기스주의자에요. 책 제목 보면 순수이성비판. 책 제목에 순수 썼습니다. 액기스. 이 사람은 경험 세계를 돌보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이니까, 도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정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너의 마음의 깨끗함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칸트하고 플라톤하고 딱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갖 잡다한 걸 다 연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전체를 살펴보면 잡다함의 극치거든요. 그게 바로 헤겔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명 하고 중간에 중세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끼워넣으면 되는겁니다.
김 : 플라톤과 칸트 연결해주시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헤겔하고 연결해주시고, 다했습니다.
강 : 철학은 두개의 사조가 있습니다. 순수주의자 플라톤과 칸트, 잡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중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끼워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넣어줘야 합니다. 중세 철학자 하나는 넣어줘야 합니다.
김 : 다 했네요.
강 : 다 했습니다.
김 : 철학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순수주의자 플라톤과 칸트, 잡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 넣어주고, 다른 사람은 체계를 세운 사람은 아니잖아.
강 : 아이 잔챙이라고 하죠.
김 : (웃다가 얼른 말을 받아) 최근에 50년은 애기잖아. 아직 렉시콘이 안 나온거 아냐?(하하하)
강 : 아, 많이 하셨네요. 이런 기본적인 모두스 비벤디를 가지고 접근해야겠지. 이렇게 정리하고, 열심히 해봐.
김 : 자크와 콩나물은 읽었나?
강 : 아 이거 마지막에 쐐기를 박을때. (폭소 연이어지고 있음) 동화책 중요해~ 삶의 모두스 비벤디를 다시 정리해야겠는데, 소공자도 읽게나 동화 중요해. (웃음)
김 : 렉시콘.
김 :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플라톤과 칸트,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잡다주의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중간에 끼워주고, (키득거리며)렉시콘 외워주고, 모두스 비벤디. 철학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와 말하는 건데, 이거 녹취한 놈이 접니다. 다시 보니 그때 생각했던 것만큼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잘못 알아들은 곳도 있네요. 그걸 수정할 겸 해서, 오늘 어쩌다가 언급하게 되어 추억을 되새길 겸, 방송 녹음 파일과 함께 올립니다. (비고: 현재 녹음 파일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파일이 없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김어준의 오프닝 멘트: 기죽지 않고 살고 싶다. 그러나 많이 알고 싶지는 않고(키득) 딱 기죽지 않을 만큼만 알고 싶다.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아는 척 할 만큼만 알려주는 문화의 마지노선 배수의 진.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적임자를 만나서 이 코너를 부활시켰습니다.
헤어스타일로 철학을 하는 철학자 강유원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이 시간을 진행하기로 할 텐데, 광고를 듣고 배수의 진, 오랜만에 부활한 배수의 진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의 진
김 : 안녕하십니까.강 : 예 안녕하십니까.
김 : 헤어스타일이 오늘은 좀 차분한 것이, 흐음...
강 : 예, 오늘 물묻은 상태에서 잠을 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 :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강 : 원하시면 제가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 저희 강유원 박사님은 헤어스타일로 철학을 하시고
강 : 차력도 합니다. (웃음)
김 : 헤어스타일로
강 : 몸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 :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과거 배추머리 김병조씨 였던가요? 그 머리를 조금 더 뻥튀기하면 나오는 헤어스타일입니다.
강 : 고맙습니다.
김 : 배수의 진을 저희가 부활을 시켰는데, 저희가 박사님땜에 부활시켰습니다.
강 : 아 그래요? 저도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해보겠습니다.
김 : 배수의 진 코너의, 저희 코너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랜만에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가 먹고살기 바쁜데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강 : 그렇죠. 그래서도 안되고.
김 :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두 마디 정도 안하면 기죽고 그래서 한 두 마디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공자들처럼 원서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습니까. 한두마디 착 치고 탁 빠지고(쿡쿡) 그럴 때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 강 : 좋습니다.
김 : 삶의 태도가 얍삽하긴 하나,
강 : 얍삽한 거 아니에요. 얍삽한 거는 이십분 정도 되는 시간 투자해서 들어서 외우지도 않고 아는 체 하는 게 얍삽한거고,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사항을 쫙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김 : 이것은 문화적 삶의 처세를 가르치는...
강 : 처세라기보다는 이것도 배수의 진입니다만 그거 처세술 아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삶의 태도지. (웃음) 또는 이게 옷 브랜드가 있거든요 모두스 비벤디라고 하는 브랜드 기억하시죠? 이게 라틴어인데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게 나의 모두스 비벤디야 이러면 됩니다. (폭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삶의 방식. 모두스가 방식이라는 말이고요 비벤디가 삶의 라는 말인데, 한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라틴어는 불어와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뒤에 있습니다. (웃음) 삶의 방식. 모두스 비벤디야. 너무 굴리시면 안 되고요, 굴릴만한 발음이 없습니다.
김 : 나의 모두스 비벤디지 하면서 표정을 싹 굳히는 거죠.
강 : 약간 시선을 한시 방향으로 돌리면서 어금니를 한쪽으로 딱 앙다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발음이 딱 나오거든요. 모두스 비벤디 이렇게. (폭소)
김 : 철학을 전공하셨잖습니까. 지금처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어금니 깨물고 한시 방향 모두스 비벤디 이렇게.
강 : 네.
김 : 이십분 내에 대단히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강 : 예 저 그런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김 : 철학 그래서 오늘 첫시간은 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 : 아, 철학...
김 : 최근에 그 외 자크 데리다라고 죽었잖아요.
강 : 아, 자크와 콩나무라는게 있죠. 전 그 사람 생각나요. 자크 데리다 하면 자크와 콩나무 생각나요. 자크 데리다 보면 별로 중요한 철학자 아닙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스펠링 몰라도 되고, 자크와 콩나무 읽었다는게 더 중요하지 자크 데리다를 읽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계에서는요, 죽은지 50년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관습입 니다. 철학의 역사가 2500년이나 되다보니까 아직 옛날 사람들,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할게 많아요. 엊그저께 배운 사람들 다룰 시간 없어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 신경쓰지 마시고, 그리고 1952년 이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선 저작권이 없거든요. 국제 저작권협회 규약에 따르면. 그 이후에 죽은 사람들 번역하면 돈만 들어요. 번역할 필요 없습니다. (웃음)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칸트같은 사람 18세기,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아직 연구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 1900년대, 2000년에 죽은 철학자를 우리가 돌볼 틈이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다 해체다 이러면 해체공법 이런 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폭소) 뭘 해체하는지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크 데리다라든가 들뢰즈라던가 가타리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이런 등등이 주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는, 철학은 너무 역사가 깊기 때문에 아직 20세기 21세기 사람을 다룰만큼 한가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소) 우리나라에 프랑스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 원전이 아직 다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는 시기상조지, 이렇게 (웃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유명한 사람에 대한 모두스 비벤디 나왔습니다. 제가 전공이 해겔 철학인데 서양철학사에서 현대철학으로 봅니다. 데리다 이런 사람은 애기죠. 신생아들이죠. 신생아의
김 : 이야 이거 중요하네.
강 : 렉시콘입니다. 엘 이 엑스 아이 씨 오 엔. 케이 오 엔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라틴어에서 기원한 말인데 영어에서도 쓰이고 독일어에선 케이 오 엔. 철학하는 업계에서는 다 통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은 다 쓰는 겁니다. 렉시콘이 아직 안 나왔잖아. 지금 몇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렉시콘 없는 철학자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김 :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는 얼마전에 자크 데리다 기사가 나오는데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길래, 그런데 나는 모르겠고 해서 약간 안타까움도 들고 뒤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자크 데리다를 누가 말하면 기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강 : 아 그러세요? 일단 렉시콘까지는 얘기하신다음에 그건 그렇고 자크와 콩나무 읽어봤나? 이렇게. (폭소) 동화 안읽으면 기본이 안된거거든요 가정환경 안 좋았다는 증거가 되고 어렸을때 막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서 이상한 데 다녔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철학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동화책이 우리의 기본이지. 자크와 콩나무 읽어봤나 그걸로 가시면 상대는 완전히 제압되는거죠. 그리고 유유히 그럼 나 이만 동화나 읽으러 가겠네 떠나면, 간략하게 해결이 됩니다.
김 : 최근 수십년간 철학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오래된 양반들,
강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철학이 뭐냐 본격적인 철학 담론이 진행되는데 철학이 뭐야 이러면 플라톤이 말한 철학의 정의를 머리 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연구하잖습니까. 철학이 무엇인가 하면, 플라톤 먼저 말씀드리면, 플라톤 스펠링이 피 엘 에이 티 오 엔 이에요. (으하하하)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피 엘 에이 티 오라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레이토 라고 읽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틀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면 안돼요, 피 엘 에이 티 오 엘 하고 피 엘 에이 티 오가 동일인물을 가리키는거에요. 형제를 가리키는게 아니에요.
김: 티 오 엔하고 티 오하고
강: 어 이게 제가 실제로 철학 개론 강의할 때 이 두 사람이 형제냐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형제가 아니라 번역본 따라서 달리 쓴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의 정의가 뭐냐면, 적으십쇼,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듯 한 단어씩 따라함) 으음 이게 이제 철학의 정의에요. 여기서 핵심은 탁월한 능력에 있어요.(탁월한 능력, 이라고 따라함) 철학은, 철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다 배웠다고 철학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서양철학사를 외웠다 이랬다고 철학을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정의에 따르면 대상을 지적으로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기르는데 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철학의 정의가 이거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헤겔이 어땠네 니체가 어땠네 데리다가 어땠네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소곳이 들어줍니다. 계속 들어주다가, 그때 한 마디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플라톤이 철학을, 대상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공부해서 당신은 어떤 능력을 길렀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답이 막히게 되어있어요. 그럼 그것을 배워서 가령, 우리 눈 앞에 보이는 핸드폰에 대해 탁월하게 취급해봐. (웃음) 능력 있나? 그럼 자네는 철학의 기본 정의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암기만 한거야. 마치 수능 시험공부하듯 한건데 그건 아니라고. 철학은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 대상을 지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에요. 그럼 상대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대게 그렇게 당하면, 더 어려운 단어 독일어 불어 섞어가며 막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가 탁 한마디 합니다. 외국어 능력 말고. (폭소) 딱 이렇게 가주면, 플라톤 인용하면 어떤 사람을 전공한 사람이건간에 한수 접히거든요. 화이트헤드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 : 각주에, 해석에 불과하다?
강 :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덧붙이면 되는거죠. 지금 플라톤부터 해야하지 않겠나. (폭소) 각주 아닌가, 나머지는.
김 : 각주라고 한 사람 누구라고요?
강 : 화이트헤드 흰머리 백두. 외우기 쉽습니다. 스펠링 다 아실거에요. 더블유 에이치 아이 티 이 헤이치 이 에이 디. 화이트헤드.
김 : 이 사람이, 서양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강 : 네. 화이트헤드가 각주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까지 딱 정리가 되고 서양철학사에 나오는 지식인 많이 외운다고 해서 플라톤이 말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서 대상을 탁월하게 취급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니까, 많은 대상에 대해서 각자 각자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헤드폰 연구하고 마이크 연구하고 안경 연구하고 PDA 연구하고 시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연구 많이 한 다음에 연구성과를 모아서 그것을 지적으로 정리하는게 철학 연구다, 저는 이렇게 보는거죠.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거죠. 좋다. 그럼 나는 철학사 공부한게 잘못이라 치자. 그럼 당신은 뭘 하는거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철학사는 최후의 학문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올바로 보는 겁니다. 훌륭한 변명도 되고, 올바른 태도도 됩니다. 요즘에 대학에 철학과 학생들이 자기네 과에서 배우는 과목만 제대로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착각하는 겁니다. 능력을 기르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강 :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능력을 어떻게 기르느냐. 철학을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요. 우리가 흔히 인생철학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대충 다니는 사람 있죠? 열심히 다녀야 해요. 채팅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해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해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갈데까지 가보는 거 있죠. 철저하게 철학을 하는 기본입니다.
김 :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과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철학적 사유의 기본이다?
강 : 그렇죠. 그런 다음에 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자기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날마다 기록을 하면 자기가 생각한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할 것 둘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철저하게 기록할 것.
강 :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대단치 않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말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철학자들이 제기하는 증명이라는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철학자들은 철학책에 나오는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연구를 하다가 혼자 하니깐 짜증나니까, 책을 쓰는거에요. 니들도 한번 죽어봐라 (대폭소), 책을 씁니다. 평생 고민했는데 안 풀렸어. 나 혼자 고민하기 억울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것까지 했단 말이지? 억울해. 니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천년전에, 플라톤 같으면 2500년 전에 나온 그 책을 아직도 읽는 거죠. 아직도 안 풀렸어요. 플라톤이 지금 웃고 있어요. 약오르지 하면서 웃고 있어요.
김 : 아주 오래된 건 플라톤으로 재끼고 최근의 것은 애잖아 하면서 재끼고,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할까요. 칸트도 등장하고.
강 :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반드시 외워야 할 철학자 네 다섯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플라톤 외우셔야되고, 아리스토텔레스 외우셔야됩니다. 속된 말로 기본안주. 체계적으로 철학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고요, 중세시대 들어오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있습니다. 니체가 어떻네 하이데거가 어떻네 그러면 딱 한 마디 하세요. 그 사람들 체계를 세운 사람은 아니잖아. 시스템은 아니잖아. 흔히 하는 말로 잔챙이라고 하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 다섯명입니다. 외우십시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
김 : 니체는 안 들어가나요?
강 : 아... 애기는 아닌데요, 중학생 쯤 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일지 모르지만, 니체 좋아하는 사람은 다 파시스트입니다.( 폭소)
김 : 플라톤 소크라테스,
강 : 아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칸트 헤겔. 칸트를 예로 들어 말하여 보면 칸트는, 칸트 같은 경우는 액기스주의자에요. 책 제목 보면 순수이성비판. 책 제목에 순수 썼습니다. 액기스. 이 사람은 경험 세계를 돌보지 않아요. 순수한 사람이니까, 도덕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정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너의 마음의 깨끗함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칸트하고 플라톤하고 딱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온갖 잡다한 걸 다 연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전체를 살펴보면 잡다함의 극치거든요. 그게 바로 헤겔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네 명 하고 중간에 중세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끼워넣으면 되는겁니다.
김 : 플라톤과 칸트 연결해주시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헤겔하고 연결해주시고, 다했습니다.
강 : 철학은 두개의 사조가 있습니다. 순수주의자 플라톤과 칸트, 잡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중간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끼워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넣어줘야 합니다. 중세 철학자 하나는 넣어줘야 합니다.
김 : 다 했네요.
강 : 다 했습니다.
김 : 철학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순수주의자 플라톤과 칸트, 잡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 넣어주고, 다른 사람은 체계를 세운 사람은 아니잖아.
강 : 아이 잔챙이라고 하죠.
김 : (웃다가 얼른 말을 받아) 최근에 50년은 애기잖아. 아직 렉시콘이 안 나온거 아냐?(하하하)
강 : 아, 많이 하셨네요. 이런 기본적인 모두스 비벤디를 가지고 접근해야겠지. 이렇게 정리하고, 열심히 해봐.
김 : 자크와 콩나물은 읽었나?
강 : 아 이거 마지막에 쐐기를 박을때. (폭소 연이어지고 있음) 동화책 중요해~ 삶의 모두스 비벤디를 다시 정리해야겠는데, 소공자도 읽게나 동화 중요해. (웃음)
김 : 렉시콘.
김 :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플라톤과 칸트,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 잡다주의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중간에 끼워주고, (키득거리며)렉시콘 외워주고, 모두스 비벤디. 철학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0-16
나니아 연대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두 명의 얼간이들.
SNL Digital Short: "Lazy Sunday" lyrics.
Lazy Sunday wake up in the late afternoon
Call Parnell just to see how he's doing
Hello?
What up Parns?
Yo Samberg what's cracking?
You thinking what I'm thinking? (Narnia!) Then it's happening.
But first my hunger pangs are sticking like duct tape.
Just hit up Magnolia and mack on some cupcakes.
No doubt that bakery's got all the bomb frostings.
I love those cupcakes like McAdams loves Gosling.
Two, no six, no twelve, baker's dozen!
I told you that I'm crazy for these cupcakes cousin.
Where's the movie playing?
Upper West Side, dude.
Well, let's hit up Yahoo! Maps to find the dopest route.
I prefer Mapquest. (That's a good one, too.)
Google maps is the best. True that. (Double true!)
68th and Broadway (Step on it sucker!)
What you what to do Chris?
Snack attack motherfucker!
The Chronic (What?) Cles of Narnia.
Yes, the Chronic (What?) Cles of Narnia.
We love the Chronic (What?) Cles of Narnia.
Pass that Chronic (What?) Cles of Narnia.
Yo stop at that deli, the theater's overpriced.
You got the backpack? (Gonna pack it up nice.)
Don't want security to get suspicious.
Mr. Pibb and Red Vines equals Crazy Delicious.
Yo reach in my pocket, pull out some dough.
The girl acted like she'd never seen a ten before.
It's all about the Hamiltons baby.
Throw the snacks in the bag and I'm Ghost like Swayze.
Roll up to the theater. Ticket buying what we're handling.
You can call us Aaron Burr from the way we're dropping Hamiltons.
Parked in our seats, movie trivia's the illest.
What Friends alum starred in films with Bruce Willis?
We answered so fast it was scary.
Everyone stared in awe when we screamed Matthew Perry.
Now quiet in the theater or it's going to get tragic.
We're about to get taken to a dream world of magic.
The Chronic (What?) Cles of Narnia.
Yes, the Chronic (What?) Cles of Narnia.
We love the Chronic (What?) Cles of Narnia.
Pass that Chronic (What?) Cles of Narnia.
2007-10-15
2007-10-12
정치적 메시아와 메시아적 정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쓰여진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문구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시사한다. 물론 예수는 그러한 역할을 거절한 채,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한다. 베드로는 첫 닭이 울기 전에 세번이나 예수를 부인한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되살아난 스승이 자신들의 앞에 서도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되살아난 스승이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버린 후, 살아남은 자들이 한 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분투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 문학이다.
예수가 제시한 메시아는 세속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것은 새끼고양이의 뒷목을 잡아서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주인의 손길과도 전혀 닮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의 모범이었고 견본이었으며 힘겹게 걸어야 할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자유로운 선택의 두려움, 불합리한 세계의 부조리 속에 내팽겨쳐져 있다는 사실은 성자의 구원 사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대답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투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바램을 투사하던 이들 중 일부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끝없이 이곳저곳 들이받고 있을 뿐인, 한낱 '투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절대악'을 상정하고 그것의 위의를 한없이 높임으로써,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정복하려 들기는 커녕, 자신들이 '상식'을 지키고 있는 성채로서 받아들여지기만을 갈구한다. 그들 중 일부가 문국현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메시아를 발견하여 그에게 '올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박이 집권한 후 도래하게 될 암흑시대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온 국가가 토건 열풍에 휩싸임으로써 집값이 지금보다 더 높이 치솟아오를 것이라 경고하며, 따라서 그 자를 막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이 문국현 지지자들의 주된 논변이다. 요컨대 세상은 이미 말세로 치달았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세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의외로 쉽다. 유한킴벌리가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IMF 때에도 단 한 명의 사원도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넘긴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만 일하고 재교육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라는 요구가 끝없이 이어진다.
정치적 메시아가 제시하는 비전은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다. 정통신학은 악을 존재의 결여로 정의한다. 악은 그 자체로서 실체가 아니며 다만 선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지 못한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노무현 당시에도 그랬고 문국현을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지금도 그러하다. 정치적 메시아를 희구하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적그리스도가 불러올 지옥에 대한 반박으로서만 존재한다. 반면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식적인 시선'은 말 그대로 상식선에 머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에 노무현 지지자들은 노무현 개인에 대한 인성론에 그리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현상은 문국현 지지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에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심상정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공약의 형태로 이미 만들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국현은 4%의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명박의 747 플랜에 맞서기 위한 레토릭을 갈고 닦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주러 온 사람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던 것이 아닐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 하늘의 왕국을 지금 당장 건설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아주 짤막한 기도문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정치적 메시아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이들의 시선을 오직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찍 온 자건 늦게 온 자건 문을 두드리는 자는 모두 같은 상급을 받으리라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하늘을 상상하며 땅을 뒤엎을 수 있는 작은 힘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들은 언제나 하늘의 왕국이 아닌 지하의 지옥을 먼저 논하고,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믿고 따르라며 깃발을 흔든다.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이미 속았다. 두 번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메시아를 희구하는 이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 구도가 이른바 '메시아적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황우석 사태, 심형래의 '디 워' 소동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인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이 피죽도 못 얻어먹는 거지 나라가 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다 줌으로써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영웅주의가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거기에는 실패한 영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며 로마인들을 단박에 쫓아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유대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듯이, 황우석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던 그 수많은 이들 또한 매우 기민한 동작으로 손에 돌을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광신도'라 불리면서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황빠'들이 대견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우리는 희생양을 만드는 일에 너무도 익숙하다.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메시아적 정치는, 정치적 메시아를 지향하는 수많은 후보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들의 구원 사업은 실패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모든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희생양이 되어버린다.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있는 이조차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그러한 희생양의 연쇄 구조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열열히 사랑하고 지지함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바라던 그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중적인 심리구조가 극복되거나, 그러한 이들이 대세를 형성할 수 없게끔 하는 건전한 정치세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한, 정치적 메시아와 메시아적 정치의 연쇄고리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제시한 메시아는 세속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다. 심지어 그것은 새끼고양이의 뒷목을 잡아서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주인의 손길과도 전혀 닮지 않았다. 예수는 하나의 모범이었고 견본이었으며 힘겹게 걸어야 할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자유로운 선택의 두려움, 불합리한 세계의 부조리 속에 내팽겨쳐져 있다는 사실은 성자의 구원 사업 이전에도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는 이제 하나의 대답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한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적 투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바램을 투사하던 이들 중 일부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끝없이 이곳저곳 들이받고 있을 뿐인, 한낱 '투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절대악'을 상정하고 그것의 위의를 한없이 높임으로써,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그것을 정복하려 들기는 커녕, 자신들이 '상식'을 지키고 있는 성채로서 받아들여지기만을 갈구한다. 그들 중 일부가 문국현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메시아를 발견하여 그에게 '올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명박이 집권한 후 도래하게 될 암흑시대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온 국가가 토건 열풍에 휩싸임으로써 집값이 지금보다 더 높이 치솟아오를 것이라 경고하며, 따라서 그 자를 막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이 문국현 지지자들의 주된 논변이다. 요컨대 세상은 이미 말세로 치달았고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세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의외로 쉽다. 유한킴벌리가 얼마나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IMF 때에도 단 한 명의 사원도 해고하지 않고 위기를 넘긴 유일한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만 일하고 재교육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라는 요구가 끝없이 이어진다.
정치적 메시아가 제시하는 비전은 결국 유한할 수밖에 없다. 정통신학은 악을 존재의 결여로 정의한다. 악은 그 자체로서 실체가 아니며 다만 선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지 못한 하나의 상태일 뿐이다. 노무현 당시에도 그랬고 문국현을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지금도 그러하다. 정치적 메시아를 희구하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적그리스도가 불러올 지옥에 대한 반박으로서만 존재한다. 반면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식적인 시선'은 말 그대로 상식선에 머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에 노무현 지지자들은 노무현 개인에 대한 인성론에 그리도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현상은 문국현 지지자들에게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에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심상정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공약의 형태로 이미 만들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국현은 4%의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명박의 747 플랜에 맞서기 위한 레토릭을 갈고 닦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주러 온 사람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던 것이 아닐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 하늘의 왕국을 지금 당장 건설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아주 짤막한 기도문을 남겨놓았을 뿐이다. 정치적 메시아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이들의 시선을 오직 하늘로 향하게 하고, 그들에게 일찍 온 자건 늦게 온 자건 문을 두드리는 자는 모두 같은 상급을 받으리라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하늘을 상상하며 땅을 뒤엎을 수 있는 작은 힘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들은 언제나 하늘의 왕국이 아닌 지하의 지옥을 먼저 논하고,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믿고 따르라며 깃발을 흔든다.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이미 속았다. 두 번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메시아를 희구하는 이들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여 한국 사회의 정치 구도가 이른바 '메시아적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황우석 사태, 심형래의 '디 워' 소동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인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이 피죽도 못 얻어먹는 거지 나라가 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다 줌으로써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이것이 영웅주의가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거기에는 실패한 영웅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며 로마인들을 단박에 쫓아내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유대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듯이, 황우석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던 그 수많은 이들 또한 매우 기민한 동작으로 손에 돌을 집어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광신도'라 불리면서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일부 '황빠'들이 대견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우리는 희생양을 만드는 일에 너무도 익숙하다.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메시아적 정치는, 정치적 메시아를 지향하는 수많은 후보자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아들의 구원 사업은 실패를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모든 이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희생양이 되어버린다.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있는 이조차 그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그러한 희생양의 연쇄 구조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열열히 사랑하고 지지함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바라던 그 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중적인 심리구조가 극복되거나, 그러한 이들이 대세를 형성할 수 없게끔 하는 건전한 정치세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한, 정치적 메시아와 메시아적 정치의 연쇄고리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2007-10-09
소네트 18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of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en complexion dimme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s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e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er'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to life to thee.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겨볼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화창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 짧아라.
때로 태양은 너무 뜨겁게 쬐고,
그의 금빛 얼굴은 흐려지기도 하여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기울어지고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 뺏기도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여름은 퇴색하지 않고,
그대가 지닌 미는 잃어지지 않으리라.
죽음도 뽐내진 못하리, 그대가 자기 그늘 속에 방황한다고
불멸의 시편 속에서 그대 시간에 동화되나니.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이 시는 살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
문국현 대통령?
고등학교 교실에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치자. 수능을 50일 앞둔 시점에, 우선 20일 동안 시중에 출시된 모든 수학 문제집을 풀어서 기본기를 다진 다음, 20일은 오전에 영어 오후에 국어를 공부하며 언어 감각을 매만지고, 나머지 열흘간 암기과목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쳐보자. 여기서 그가 펜을 손에 잡아본지 고작 석달 쯤 된,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수재라고 한다면 이 비유는 아마도 더욱 정확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뭔가 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이들은 그가 '고등학교에서 비록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책상에서 열심히 졸았다'라는 식으로 그의 학습 부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덧붙인다면, 이제 문국현 지지자들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완성된다.
설령 내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에 의하여 문국현이 대통령이 됐다고 쳐보자. 다짜고짜 출마하여 당을 만들면서 선거에 나온 인물이, 성공적인 기업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곳일까? 문국현의 출마와 그를 둘러싼 바람몰이는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거의 같거나 더욱 나쁜 현실이 한국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5년 전 노무현이 단물을 다 빨아먹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유한킴벌리 사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치적이 그나마 작은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지 않은 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적, 정신적 자위행위의 현장을 목격한다. 공교롭게도 유한킴벌리는 외로운 남성들의 생활 필수품, 두루마리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이며, 그들의 제품은 전국 방방곳곳에 깔려 있다. 이게 다 문국현이 워낙 경영을 잘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덧말) 상당한 수의 문국현 지지자들은 구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을 문국현 지지의 이유로 삼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대항마'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브라퀴가 여의주를 물기 전에 문국현이라는 선한 이무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대선 시나리오는 아무리 거듭 살펴봐도 '디 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2000년 전부터 벌써 구리기로 정평이 난 희곡 작법이었다는 점을 참고 삼아 적어둔다.
설령 내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에 의하여 문국현이 대통령이 됐다고 쳐보자. 다짜고짜 출마하여 당을 만들면서 선거에 나온 인물이, 성공적인 기업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곳일까? 문국현의 출마와 그를 둘러싼 바람몰이는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거의 같거나 더욱 나쁜 현실이 한국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도,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전혀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5년 전 노무현이 단물을 다 빨아먹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유한킴벌리 사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치적이 그나마 작은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적지 않은 수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적, 정신적 자위행위의 현장을 목격한다. 공교롭게도 유한킴벌리는 외로운 남성들의 생활 필수품, 두루마리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이며, 그들의 제품은 전국 방방곳곳에 깔려 있다. 이게 다 문국현이 워낙 경영을 잘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덧말) 상당한 수의 문국현 지지자들은 구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을 문국현 지지의 이유로 삼고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대항마'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명박이라는 브라퀴가 여의주를 물기 전에 문국현이라는 선한 이무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대선 시나리오는 아무리 거듭 살펴봐도 '디 워'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2000년 전부터 벌써 구리기로 정평이 난 희곡 작법이었다는 점을 참고 삼아 적어둔다.
2007-10-05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상환의 '겨울밤' 분석에 관하여
한윤형으로부터 건내받은 김상환 교수의 논문, "An Essay on Culture: Through the Darkness of Winter Nights"를 읽었다.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라는 가사의 동시 '겨울밤'을 화두로 삼아, 그는 추위/따스함, 동물의 울음/인간의 대화, 고독/사회, 아동/성인(원문의 순서를 바꿈)의 이분법을 찾아내고, 각각의 항목을 통해 그 시의 안팎을 넘나들며 문화의 의미를 설명한다. 논의의 초점은 결국 '옛날 이야기'로 향하고, 김소월의 '부모'를 통해 '동양 전통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도약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도약은 포스트모던 철학이 탈근대 시대의 겨울밤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되었다는 현실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미려한 영어로 서술되어 있고, 두 편의 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부드럽게 이끌어내는 솜씨는 여느 문학평론가가 따라오기 어려운 흡입력을 보여준다. 즉 이 논문은 놀라운 감수성의 표현이자 동시에 지적인 작업의 결과물로서도 탁월하다. 하지만 추출된 이분법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할머니 곁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인간 가족의 (엥겔스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구전사회의 '이야기'와 현대의 '담론'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이 다소 간과되고 있다. 고대의 이야기가 재서술이 아닌 그저 전승을 위한 것이었고, 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분질서 및 소유관계를 포함한 이른바 하부구조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구술문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지 않고, 심지어는 반영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러한 전통이 종교적 열망과 맞물려 가장 성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유대교 사회의 경우, 그들의 랍비들이 암송하고 있던 구약이 기원전에 작성되어 1947년에 발견된 사해 쿰란문서와 거의 일치하는 기적을 창출해내기도 했다. 구술전통의 '이야기'가 근대의 '담론'과 이리도 다르다면, 탈근대의 서사가 계승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디지털 언어의 세계가 모든 이분법적 체계, 즉 정신과 육체, 인간과 동물, 음성과 형상, 현실과 가상 등의 그 모든 것들을 유효하지 않게 한다는 마지막 문단의 현대 문명 진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모든 맥락을 서술할 수는 없으나, 철학적으로 볼 때 컴퓨터의 발전은 이상적인 인공언어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비트겐슈타인의 애제자 앨런 튜링의 영향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개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를 기술하는 용어는 '효율성', '작성에 용이한 스타일'등이지 '문화적 맥락' 따위가 아닌 것이다. 컴퓨터 안에서 모든 언어는 결국 0과 1로 치환된다. 그곳에는 바벨의 언어가 이미 존재한다-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 네모난 상자 안에서는.
모든 정보가 전기 신호로 분해되어 순식간에 복사되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상실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컴퓨터일 뿐이고, 그것은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를 표상하는 어떤 상징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시각은 일종의 우상화를 낳을 뿐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의 일부일 뿐이며, 실로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년간 싸워온 인간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물론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 하지만 철학이 고민해온 문제가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전부 뒤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거듭 반복하지만, 컴퓨터는 오직 이분법적 체계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있는 언어만을 이해한다. 디지털 체계는 현대의 문명을 지탱하는 한 축일 뿐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과제는, 고대로부터 이어온 메타 학문의 위상을 되찾고, 미시화되어가는 학문 세계를 종합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방금 나는 '한 발자국을 내딛다'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술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또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는 이만이 타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줄 수 있듯, 자신의 본질 그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온 학문만이 후기산업사회의 목적 없는 표류로부터 인류의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겨울밤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부모
-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랴.
이 모든 과정은 미려한 영어로 서술되어 있고, 두 편의 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부드럽게 이끌어내는 솜씨는 여느 문학평론가가 따라오기 어려운 흡입력을 보여준다. 즉 이 논문은 놀라운 감수성의 표현이자 동시에 지적인 작업의 결과물로서도 탁월하다. 하지만 추출된 이분법에 너무 의지한 나머지 '할머니 곁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인간 가족의 (엥겔스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구전사회의 '이야기'와 현대의 '담론'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이 다소 간과되고 있다. 고대의 이야기가 재서술이 아닌 그저 전승을 위한 것이었고, 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분질서 및 소유관계를 포함한 이른바 하부구조를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구술문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지 않고, 심지어는 반영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러한 전통이 종교적 열망과 맞물려 가장 성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유대교 사회의 경우, 그들의 랍비들이 암송하고 있던 구약이 기원전에 작성되어 1947년에 발견된 사해 쿰란문서와 거의 일치하는 기적을 창출해내기도 했다. 구술전통의 '이야기'가 근대의 '담론'과 이리도 다르다면, 탈근대의 서사가 계승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디지털 언어의 세계가 모든 이분법적 체계, 즉 정신과 육체, 인간과 동물, 음성과 형상, 현실과 가상 등의 그 모든 것들을 유효하지 않게 한다는 마지막 문단의 현대 문명 진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 모든 맥락을 서술할 수는 없으나, 철학적으로 볼 때 컴퓨터의 발전은 이상적인 인공언어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비트겐슈타인의 애제자 앨런 튜링의 영향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개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차이를 기술하는 용어는 '효율성', '작성에 용이한 스타일'등이지 '문화적 맥락' 따위가 아닌 것이다. 컴퓨터 안에서 모든 언어는 결국 0과 1로 치환된다. 그곳에는 바벨의 언어가 이미 존재한다-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그 네모난 상자 안에서는.
모든 정보가 전기 신호로 분해되어 순식간에 복사되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상실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는 컴퓨터일 뿐이고, 그것은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를 표상하는 어떤 상징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시각은 일종의 우상화를 낳을 뿐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의 일부일 뿐이며, 실로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년간 싸워온 인간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 물론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 하지만 철학이 고민해온 문제가 디지털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전부 뒤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거듭 반복하지만, 컴퓨터는 오직 이분법적 체계로 완벽하게 환원될 수 있는 언어만을 이해한다. 디지털 체계는 현대의 문명을 지탱하는 한 축일 뿐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과제는, 고대로부터 이어온 메타 학문의 위상을 되찾고, 미시화되어가는 학문 세계를 종합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아닐까? 방금 나는 '한 발자국을 내딛다'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술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또한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하는 이만이 타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줄 수 있듯, 자신의 본질 그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온 학문만이 후기산업사회의 목적 없는 표류로부터 인류의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겨울밤
부엉 부엉새가 우는 밤
부엉 춥다고서 우는데
우리들은 할머니 곁에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듣지요.
부모
- 김소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되어서 알아보랴.
2007-09-26
노동가치론의 가장 약한 고리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을 통해 어떤 철학적 영감을 얻는 일이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한 철학적 논변이라면 마땅히 합당한 이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의, 혹은 동양철학의 4원소론은 현대 물리학의 원자론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아름답고 시적인 함의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며 철학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기반하고 있는 물리학적 지식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철학적 논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에 대한 재해석에 기반하여 논지를 펼치고 있는 현대 철학자들은 일종의 양자택일을 해야만 한다. 그 논변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 자신의 철학이 현실과는 큰 연관을 맺지 않는 지적 유희임을 실토하거나, 이미 명백하게 틀린 것으로 판명된 노동가치론을 끝까지 옳다고 우기거나.
장차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지난 노트를 계속 뒤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블로그에 공개한다. 당시에는 책의 서지사항을 정확히 밝혀놓는 법을 익히지도 않았는데, 추정컨대 모든 출처는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김수행 번역 [자본론 1上]일 것이다. 2003년 5월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6월부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의 상품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 곧 상상적인 금 형태를 부여하더라도 아직은 자신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백만원어치의 상품가치를 금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에 있어서는 단지 상상적인, 곧 관념적인 화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단지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재료에 달려있다."[p.120]
여기서 말하는 '실제의 화폐재료'란 다름아닌 금이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던 당시 세계 경제는 금태환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투여된 노동에 비례하므로, "실제의 화폐재료"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마땅히 존재해야만 하며 그것은 그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어느 정도 상응하는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르크스는 말한다. "금이 가치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페이지 미상]
불환화폐, 즉 금이나 은으로 교환해주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의 신용에 의지하여 발행되고 있는 현재의 화폐 체계 하에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급격하게 발 디딜 곳을 잃어버린다. 상품들 사이의 가치척도로 기능하는 화폐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기능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종이에 그림을 찍어내는 과정과는 다르다. 만원짜리 지폐를 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조폐공사 직원들의 노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지불보증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폐공사 직원들의 노동력만큼은 하루에 수십억원 어치의 가치를 지니게 되노라고 우겨야만 한다. 혹은 "만약 12원으로 표현되는 금광을 생산하는데 24노동시간, 즉 2노동일이 걸린다면, 이 면사에는 2노동일이 대상회되어있는 셈이 된다. [p.239]"는 구체적인 예시를 포기하거나.
노동가치론이 화폐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벌이는 이러한 이론적 곡예는, 철학적으로 볼 때, 물질과 관념을 일대일로 대응시켜야만 한다는 이분법적 집착의 산물이다.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노동이 투여되지 않은 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화폐를 볼 때마다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금광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읽어내야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신용카드빚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직감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철학적 재해석'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유효한 '경제학자'는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저자'로서만큼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을 뿐이다.
장차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지난 노트를 계속 뒤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블로그에 공개한다. 당시에는 책의 서지사항을 정확히 밝혀놓는 법을 익히지도 않았는데, 추정컨대 모든 출처는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김수행 번역 [자본론 1上]일 것이다. 2003년 5월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해 6월부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의 상품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 곧 상상적인 금 형태를 부여하더라도 아직은 자신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백만원어치의 상품가치를 금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에 있어서는 단지 상상적인, 곧 관념적인 화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단지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재료에 달려있다."[p.120]
여기서 말하는 '실제의 화폐재료'란 다름아닌 금이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집필하던 당시 세계 경제는 금태환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모든 상품의 가치는 그것에 투여된 노동에 비례하므로, "실제의 화폐재료"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마땅히 존재해야만 하며 그것은 그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어느 정도 상응하는 노동력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르크스는 말한다. "금이 가치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페이지 미상]
불환화폐, 즉 금이나 은으로 교환해주지 않고 전적으로 정부의 신용에 의지하여 발행되고 있는 현재의 화폐 체계 하에서,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급격하게 발 디딜 곳을 잃어버린다. 상품들 사이의 가치척도로 기능하는 화폐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 자체가 노동생산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기능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종이에 그림을 찍어내는 과정과는 다르다. 만원짜리 지폐를 돈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조폐공사 직원들의 노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지불보증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폐공사 직원들의 노동력만큼은 하루에 수십억원 어치의 가치를 지니게 되노라고 우겨야만 한다. 혹은 "만약 12원으로 표현되는 금광을 생산하는데 24노동시간, 즉 2노동일이 걸린다면, 이 면사에는 2노동일이 대상회되어있는 셈이 된다. [p.239]"는 구체적인 예시를 포기하거나.
노동가치론이 화폐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벌이는 이러한 이론적 곡예는, 철학적으로 볼 때, 물질과 관념을 일대일로 대응시켜야만 한다는 이분법적 집착의 산물이다.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노동이 투여되지 않은 채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상품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화폐를 볼 때마다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금광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읽어내야만 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신용카드빚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은 직감적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에 대한 '철학적 재해석'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유효한 '경제학자'는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저자'로서만큼은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을 뿐이다.
2007-09-24
아마도 2003년 여름방학에
부천시립도서관에서 찾아 읽은 책의 인용구일 듯. 오래된 노트를 뒤지다가 발견.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찾았다는 느낌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지칭되는 현대 철학에 대한 나의 인식은 아직도 이와 같다. 연필로 쓴 후 뭉개진 부분이 많아서 모든 단어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음. 현대철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개해주시길.
선험적 주체성이 붕괴되고 난 이후 분석은 세계들을 자신들로부터 방출하고 동시에 세계들을 흡수해버리는 익명적 언어사건을 향한다. 이 언어사건은 모든 존재적 역사와 모든 세계 내적 실천에 선행하며, 구멍이 많아진 자아, 저자, 그리고 그의 작품의 경계들을 통해 모든 것을 관통한다. 그러한 분석은 "자아의 해체를 가져오고, 잃어버린 수많은 사건들의 공허한 종합의 장소와 자리들에 다시 몰려오게 만든다." 푸코와 데리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자들에게는 다음의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통용된다. "철학적 주체성의 해체, 그리고 이 주체성을 무력화시키고 또 공허한 공간에서 그것을 다양화시키는 언어 속에서 철학적 주체성의 분산은 아마 동시대적 사유의 기초적 구조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구조주의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사유운동은 초월적 주체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언어적 의사소통 자체에 내재하는 세계연관, 화자관점, 타당성주장들의 체계마저 우리의 사야에서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체계 없이는 현실 차원들의 구별, 허구와 현실, 일상실천과 비일상적 경험, 이에 상응하는 텍스트 장소들과 장르들의 구별은 불가능해지고 또 의미를 상실한다. 존재의 집은 그 자체, 방향을 잃은 언어 강물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급진적 맥락주의는 일종의 액화된 언어, 즉 오직 흐름의 양태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 내부적 운동들이 이 흐름으로부터 비로소 생겨나는 그런 언어를 고려한다. 이러한 주장은 철학적 토론에서 단지 약한 지주들을 발견할 뿐이다. 그것은 주로 심미적 경험들에,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문학과 문학이론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증거들에 의지한다. [p.268]
[탈형이상학적 사유](하버마스, 1998) 중.
선험적 주체성이 붕괴되고 난 이후 분석은 세계들을 자신들로부터 방출하고 동시에 세계들을 흡수해버리는 익명적 언어사건을 향한다. 이 언어사건은 모든 존재적 역사와 모든 세계 내적 실천에 선행하며, 구멍이 많아진 자아, 저자, 그리고 그의 작품의 경계들을 통해 모든 것을 관통한다. 그러한 분석은 "자아의 해체를 가져오고, 잃어버린 수많은 사건들의 공허한 종합의 장소와 자리들에 다시 몰려오게 만든다." 푸코와 데리다,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자들에게는 다음의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통용된다. "철학적 주체성의 해체, 그리고 이 주체성을 무력화시키고 또 공허한 공간에서 그것을 다양화시키는 언어 속에서 철학적 주체성의 분산은 아마 동시대적 사유의 기초적 구조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구조주의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사유운동은 초월적 주체성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언어적 의사소통 자체에 내재하는 세계연관, 화자관점, 타당성주장들의 체계마저 우리의 사야에서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체계 없이는 현실 차원들의 구별, 허구와 현실, 일상실천과 비일상적 경험, 이에 상응하는 텍스트 장소들과 장르들의 구별은 불가능해지고 또 의미를 상실한다. 존재의 집은 그 자체, 방향을 잃은 언어 강물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급진적 맥락주의는 일종의 액화된 언어, 즉 오직 흐름의 양태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 내부적 운동들이 이 흐름으로부터 비로소 생겨나는 그런 언어를 고려한다. 이러한 주장은 철학적 토론에서 단지 약한 지주들을 발견할 뿐이다. 그것은 주로 심미적 경험들에,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문학과 문학이론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증거들에 의지한다. [p.268]
[탈형이상학적 사유](하버마스, 1998) 중.
2007-09-21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본의 아니게 또 밤을 새버렸는데, 어제, 나는 잠을 못 잤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어제, 저녁 먹고 나눈 대화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 발상의 큰 부분은 바로 이 문장에 빚지고 있다.
"But if any one wants my opinions about the actual nature of the authority, Mr. G.S.Street has only to throw me another challenge, and I will write him another book."
"그러나 권위의 실제적인 성격에 관한 나의 견해를 알고자 한다면, G. S. 스트리트 씨처럼 나에게 또 다른 도전장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대답해 줄 것이다."
- G. K. Chesterton, [Orthodoxy], 1908.
"But if any one wants my opinions about the actual nature of the authority, Mr. G.S.Street has only to throw me another challenge, and I will write him another book."
"그러나 권위의 실제적인 성격에 관한 나의 견해를 알고자 한다면, G. S. 스트리트 씨처럼 나에게 또 다른 도전장을 던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또 다른 한 권의 책으로 대답해 줄 것이다."
- G. K. Chesterton, [Orthodoxy], 1908.
2007-09-20
두 권의 책
[88만원 세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 - 우석훈 박권일 저
[88만원 세대]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는 하나의 큰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책이다. 전자가 취직을 앞둔 20대를 겨냥한 것이라면, 후자는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바로 그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8만원 세대]를)단순히 세대론으로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이다"라는 한윤형의 말은 타당하지만, 그보다는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를 3~40대를 위한 세대론으로 읽어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실천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독법일 수도 있다. 저자는 조직론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기업, 공무원 사회, 조폭 및 다단계 등의 조직을 해부하느라 정작 그것을 구성하는 이들의 심리에는 그만큼 접근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 구성적 불비는 이 시리즈가 잠재하고 있던 파괴력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88만원 세대]는 기본적으로 '세대 내 경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과외를 자유롭게 받으며 자란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들의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소상히 짚어냄으로써 근래 보기 드문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도대체 왜 김포공항 롯데리아에는 '스마일 걸'이 서 있는 것일까? 할인매장 주차장에서 광대같은 옷을 입고 팔다리를 휘젓는 청년들은 대체 얼마를 받고 저 짓을 하는 것일까? 일상적인 풍경과 경제적 분석이 맞물리면서, 20대의 현재에 대한 분노는 여타 '꼰대'들이 흔히 싸지르는 감상적인 그것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대체 이 현실 속에서 정책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답이 무엇이 있느냐는 차원으로 넘어간다. 저자는 바로 그런 작은 대안들을 '짱돌'이라 지칭했다('운동권 선배'님들은 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겠지만, [88만원 세대]는 그렇게 단순한 책이아니다).
공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박권일씨가 [88만원 세대]에 첨가한 후기는, 책 전체의 맥락을 오직 한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점에서, 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통해 본래의 논지가 가지고 있던 분석의 살벌함을 오히려 둔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가 지나치게 해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책을 읽을 잠재적 독자, 즉 '386 세대'라 불리우는 그들에게 '야근으로 점철된 너희들의 삶이 사실 이런 거다'라는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88만원 세대]의 '선동 과잉'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두 권의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블로그에 짧게 포스트로 올릴 것이 아닌 듯하다. 다만 계속 느껴지는 것은, 훌륭한 잡지 편집장만큼이나 탁월하고 식견 있는 단행본 편집자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출판사에 대한 폄하나 품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석훈씨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포스트에서 느껴지는 정보 과잉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책으로 정돈되고 나니 양질의 컨텐츠로 전환되어 있는 이 변화가 놀랍다는 뜻이다. 스타인벡이 자신의 평생 친구이자 편집자였던 코비시(Covici-Friede)에게 보낸 편지들(정확하 말하자면 그걸 묶어서 편집한 단행본)을 읽고 나니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국에 갈리마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빼어난 필자만큼이나 그들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는 편집자가 필요하다. 지적인 교류는 저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에 앞서, 우선 글쓰는 이와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이들 사이에서 가열차게 벌어져야 한다. 대중을 고려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지적 현실을 발전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덧말. 책이 마음에 들면 전작을 훑는 악습이 있는 나는, 도서관에 들려서 번역서와 정부보고서 따위를 제외한 우석훈의 저서를 전부 빌려왔다.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88만원 세대]와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는 하나의 큰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책이다. 전자가 취직을 앞둔 20대를 겨냥한 것이라면, 후자는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바로 그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8만원 세대]를)단순히 세대론으로 읽는 것은 잘못 읽는 것이다"라는 한윤형의 말은 타당하지만, 그보다는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를 3~40대를 위한 세대론으로 읽어내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실천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독법일 수도 있다. 저자는 조직론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의 기업, 공무원 사회, 조폭 및 다단계 등의 조직을 해부하느라 정작 그것을 구성하는 이들의 심리에는 그만큼 접근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 구성적 불비는 이 시리즈가 잠재하고 있던 파괴력을 끝까지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아쉬움을 남긴다. [88만원 세대]는 기본적으로 '세대 내 경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과외를 자유롭게 받으며 자란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들의 생활 속 사례를 통해 소상히 짚어냄으로써 근래 보기 드문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도대체 왜 김포공항 롯데리아에는 '스마일 걸'이 서 있는 것일까? 할인매장 주차장에서 광대같은 옷을 입고 팔다리를 휘젓는 청년들은 대체 얼마를 받고 저 짓을 하는 것일까? 일상적인 풍경과 경제적 분석이 맞물리면서, 20대의 현재에 대한 분노는 여타 '꼰대'들이 흔히 싸지르는 감상적인 그것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대체 이 현실 속에서 정책적으로 실천 가능한 해답이 무엇이 있느냐는 차원으로 넘어간다. 저자는 바로 그런 작은 대안들을 '짱돌'이라 지칭했다('운동권 선배'님들은 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겠지만, [88만원 세대]는 그렇게 단순한 책이아니다).
공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박권일씨가 [88만원 세대]에 첨가한 후기는, 책 전체의 맥락을 오직 한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몰아간다는 점에서, 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통해 본래의 논지가 가지고 있던 분석의 살벌함을 오히려 둔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리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샌드위치 위기론은 허구다]가 지나치게 해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책을 읽을 잠재적 독자, 즉 '386 세대'라 불리우는 그들에게 '야근으로 점철된 너희들의 삶이 사실 이런 거다'라는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붓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88만원 세대]의 '선동 과잉'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일이다.
두 권의 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블로그에 짧게 포스트로 올릴 것이 아닌 듯하다. 다만 계속 느껴지는 것은, 훌륭한 잡지 편집장만큼이나 탁월하고 식견 있는 단행본 편집자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출판사에 대한 폄하나 품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석훈씨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엄청난 양의 포스트에서 느껴지는 정보 과잉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책으로 정돈되고 나니 양질의 컨텐츠로 전환되어 있는 이 변화가 놀랍다는 뜻이다. 스타인벡이 자신의 평생 친구이자 편집자였던 코비시(Covici-Friede)에게 보낸 편지들(정확하 말하자면 그걸 묶어서 편집한 단행본)을 읽고 나니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한국에 갈리마르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빼어난 필자만큼이나 그들의 고삐를 틀어쥘 수 있는 편집자가 필요하다. 지적인 교류는 저자와 대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에 앞서, 우선 글쓰는 이와 글을 책으로 만드는 이들 사이에서 가열차게 벌어져야 한다. 대중을 고려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지적 현실을 발전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덧말. 책이 마음에 들면 전작을 훑는 악습이 있는 나는, 도서관에 들려서 번역서와 정부보고서 따위를 제외한 우석훈의 저서를 전부 빌려왔다. 그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2007-09-14
로스쿨 대담
BINA 님의 말:
너 지원림 아냐?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알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개인적으로야 모르지만
BINA 님의 말:
그 지원림
BINA 님의 말:
우리학교 왔다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우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고대 교수로 온 거야?
BINA 님의 말:
어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그냥 강의를 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BINA 님의 말:
전에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설마~ 했더니
BINA 님의 말:
진짜 학교에 이름이 있다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서울대 법대 가려다 성대 법대 간 전직 의대생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실망스럽겠군
BINA 님의 말:
넌 지원림이 성대인거 알았구나
BINA 님의 말:
난 연대교수인줄 알았어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그거야 지원림 책을 괜히 사서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책 내용이 아닌 책 날개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저자 소개
BINA 님의 말:
ㅋㅋㅋ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머릿말 따위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지
BINA 님의 말:
학교들이 아주 미쳤나봐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어떤 면에서?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어떤 학교가 더 미쳤길래?
BINA 님의 말:
서울대는 2학기 임용에서 타 대학 교수를 8명 영입했다. 경희대.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 등 모두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서 영입했다. 연세대도 해외 로스쿨을 나온 숙명여대.아주대.중앙대 교수를 영입했다.
BINA 님의 말:
뭐 이런 거지
BINA 님의 말:
진짜 지방대는 교수들이 다 사라져서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그런 거구나
BINA 님의 말:
개강하고 휴강하다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고 있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크아
BINA 님의 말:
우리가 노동법 강사 뺏긴건 일도 아닌 거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로스쿨을 앞두고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미쳐 돌아가는 법대들
BINA 님의 말:
로스쿨 나빠요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로스쿨 나빠요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장학금도 안 줘요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마구 때려요
BINA 님의 말:
ㅋㅋㅋ
너 지원림 아냐?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알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개인적으로야 모르지만
BINA 님의 말:
그 지원림
BINA 님의 말:
우리학교 왔다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우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고대 교수로 온 거야?
BINA 님의 말:
어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그냥 강의를 좀 한다 이런 게 아니고?
BINA 님의 말:
전에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설마~ 했더니
BINA 님의 말:
진짜 학교에 이름이 있다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서울대 법대 가려다 성대 법대 간 전직 의대생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실망스럽겠군
BINA 님의 말:
넌 지원림이 성대인거 알았구나
BINA 님의 말:
난 연대교수인줄 알았어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그거야 지원림 책을 괜히 사서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책 내용이 아닌 책 날개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저자 소개
BINA 님의 말:
ㅋㅋㅋ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머릿말 따위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지
BINA 님의 말:
학교들이 아주 미쳤나봐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어떤 면에서?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어떤 학교가 더 미쳤길래?
BINA 님의 말:
서울대는 2학기 임용에서 타 대학 교수를 8명 영입했다. 경희대.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홍익대 등 모두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서 영입했다. 연세대도 해외 로스쿨을 나온 숙명여대.아주대.중앙대 교수를 영입했다.
BINA 님의 말:
뭐 이런 거지
BINA 님의 말:
진짜 지방대는 교수들이 다 사라져서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그런 거구나
BINA 님의 말:
개강하고 휴강하다 강사들이 와서 수업하고 있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크아
BINA 님의 말:
우리가 노동법 강사 뺏긴건 일도 아닌 거지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로스쿨을 앞두고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미쳐 돌아가는 법대들
BINA 님의 말:
로스쿨 나빠요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로스쿨 나빠요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장학금도 안 줘요
드라마 Q&A 제보하세요 님의 말:
마구 때려요
BINA 님의 말:
ㅋㅋㅋ
2007-09-13
복학기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2001년에서 2004년 초까지, 나는 '대학생'들의 반들반들한 얼굴을 바라보며, 과연 이들을 어떻게 '계몽'할 수 있을지를 수도 없이 고민했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근심에 휩싸여, 겁을 집어먹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모습을 스스로 귀엽게 묘사하는 이들이 바로 내가 대학에서 마주치는 또래들이었다. '마린블루스' 같은 웹만화 보지 말고 인간의 내면을 진지하게 다루는 출판만화를 읽으라고, 한 작가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도서관에 가서 그 사람의 다른 책을 다 읽으라고 아무리 다그쳐도 소용이 없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문화적 결핍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그 이상 탐구하려 하지도 않았다. 지방 출신들은 자신들의 촌스러움을, 1학년 1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소득의 문제라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린 후, 2학기에 술을 퍼마시며 뒹굴다가 2학년이 되는 즉시 일찌감치 고시 공부를 시작하며 주변과의 연락을 끊었다. 자신만은 남들과 다르다는 듯 돌아다니던 운동권 끝물들의 얼굴에는 겸양이 잘 안 먹은 화장품처럼 덧칠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사회과학'이라는 어휘를 견딜 수 없었다. '야, 그건 사회과학 서적이 아니야. 그저 그런 대중교양서일 뿐이지.' 그런 지점까지 알아버린 자신에 대한 우쭐한 기분은, 그래봐야 그걸 써먹을 곳도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 늘 돌아오곤 했다. 도서관 책꽂이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아 죽고 싶었다. 두 개의 서가가 양쪽에서 밀려와 나를 압살하여 주기를 바랬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말 그대로 죽어라고 술을 마셨다.
오래 방황했고 많은 일을 겪은 후, 졸업을 위해 학교에 돌아왔다. 드라마틱에 출근하여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또 포린 폴리시 한국어판을 인계하여 찍어내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나는 매체를 통한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느끼고 다소 달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그 내용을 담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줏어들은 후, 하겠다는 공부는 안 하고 잡지 일을 하는 자신을 그렇게 위무했다. 지금 나는 세상과,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다-게다가 돈도 벌면서. 넉달간 일을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것을 먹는 걸로 풀다보니 몸이 많이 불어났지만, 세계와의 접점을 찾은 후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늘어가는 허리 사이즈를 압도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온 대학의 강의실에서, 반들반들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대학생들의 손에 대체 무슨 매체를 쥐어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다. 말하자면 지금 나는 절망의 기시감을 느끼는 중이다.
법학관 신관 102호에 앉아 연필 한 자루를 들고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틱이 누구에게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FP의 광고 수주가 얼마나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디테일한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졸업을 고작 한 학기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이들에게 이미 나는 떠난 몸이다. 부대끼며 슬퍼하는 대신, 하나의 유령이 되어 부유하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닐 터이다. 수업 종료를 3분 앞둔 시점, 다들 술렁이고 있다. (07.09.13. 15:12)
오래 방황했고 많은 일을 겪은 후, 졸업을 위해 학교에 돌아왔다. 드라마틱에 출근하여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또 포린 폴리시 한국어판을 인계하여 찍어내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나는 매체를 통한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느끼고 다소 달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그 내용을 담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줏어들은 후, 하겠다는 공부는 안 하고 잡지 일을 하는 자신을 그렇게 위무했다. 지금 나는 세상과,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는 거다-게다가 돈도 벌면서. 넉달간 일을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것을 먹는 걸로 풀다보니 몸이 많이 불어났지만, 세계와의 접점을 찾은 후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늘어가는 허리 사이즈를 압도하고 있었다. 다시 돌아온 대학의 강의실에서, 반들반들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대학생들의 손에 대체 무슨 매체를 쥐어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다. 말하자면 지금 나는 절망의 기시감을 느끼는 중이다.
법학관 신관 102호에 앉아 연필 한 자루를 들고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드라마틱이 누구에게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FP의 광고 수주가 얼마나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디테일한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졸업을 고작 한 학기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이들에게 이미 나는 떠난 몸이다. 부대끼며 슬퍼하는 대신, 하나의 유령이 되어 부유하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닐 터이다. 수업 종료를 3분 앞둔 시점, 다들 술렁이고 있다. (07.09.13. 15:12)
2007-09-09
미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찬가로서의 디 워
"그는 '디 워'가 이렇다 할 만한 인과관계나 배경에 대한 설명없이 조선의 이무기와 여의주가 미국에 출현하고 마침내 착한 이무기가 그 여의주를 얻어 승천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미국의 국운이 더욱 번성할 것을 기원하는 찬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내가 이 소식을 접한 곳은 여기
불행하게도 학교 도서관에 계간 종합문예지 '너머'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일 당장 원문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기사에 소개된 내용만을 놓고 볼 때, 이는 김정란 교수의 여성주의적 해석에 이은 또 하나의 인문학적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내가 이 소식을 접한 곳은 여기
불행하게도 학교 도서관에 계간 종합문예지 '너머'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일 당장 원문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기사에 소개된 내용만을 놓고 볼 때, 이는 김정란 교수의 여성주의적 해석에 이은 또 하나의 인문학적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듯.
2007-08-30
The Birds In Your Garden

"The Birds In Your Garden"
It's six o'clock, the birds are singing.
I'm wide awake whilst you're still fast asleep.
I went outside, into your garden.
The sun was bright & the air was cool
And as I stood there listening
Well the birds in your garden they all started singing this song
"Take her now. Don't be scared, it's alright.
Oh, come on, touch her inside.
It's a crime against nature - she's been waiting all night.
Come on, hold her, & kiss her & tell her you care
If you wait 'til tomorrow she'll no longer be there.
Come on & give it to her.
You know it's now or never."
Yeah, the birds in your garden have all started singing this song.
My father never told me about the birds & the bees.
And I guess I never realised that I would ever meet birds as beautiful as these.
I came inside, climbed to your bedroom.
I kissed your eyes awake & then I did what I knew was only natural.
And then the birds in your garden, they all started singing this song
"Take her now. Don't be scared, it's alright.
Oh, come on, touch her inside.
It's a crime against nature - she's been waiting all night.
Come on, hold her, & kiss her & tell her you care
If you wait 'til tomorrow she'll no longer be there.
Come on & give it to her. You know it's now or never."
Yeah, the birds in your garden have all started singing this song.
Yeah, the birds in your garden, they taught me the words to this song.
2007-08-29
Four Poems
Four Poems
I think it will be winter when he comes.
From the unbearable whiteness of the road
a dot will emerge, so black that eyes will blur,
and it will be approaching for a long, long time,
making his absence commensurate with his coming,
and for a long, long time it will remain a dot.
A speck of dust? A burning in the eye? And snow,
there will be nothing else but snow,
and for a long, long while there will be nothing,
and he will pull away the snowy curtain,
he will acquire size and three dimensions,
he will keep coming closer, closer . . .
This is the limit, he cannot get closer. But he keeps approaching,
now too vast to measure . . .
——
If there is something to desire,
there will be something to regret.
If there is something to regret,
there will be something to recall.
If there is something to recall,
there was nothing to regret.
If there was nothing to regret,
there was nothing to desire.
——
Let us touch each other
while we still have hands,
palms, forearms, elbows . . .
Let us love each other for misery,
torture each other, torment,
disfigure, maim,
to remember better,
to part with less pain.
——
We are rich: we have nothing to lose.
We are old: we have nowhere to rush.
We shall fluff the pillows of the past,
poke the embers of the days to come,
talk about what means the most,
as the indolent daylight fades.
We shall lay to rest our undying dead:
I shall bury you, you will bury me.
by Vera Pavlova
(Translated, from the Russian, by Steven Seymour.)
I think it will be winter when he comes.
From the unbearable whiteness of the road
a dot will emerge, so black that eyes will blur,
and it will be approaching for a long, long time,
making his absence commensurate with his coming,
and for a long, long time it will remain a dot.
A speck of dust? A burning in the eye? And snow,
there will be nothing else but snow,
and for a long, long while there will be nothing,
and he will pull away the snowy curtain,
he will acquire size and three dimensions,
he will keep coming closer, closer . . .
This is the limit, he cannot get closer. But he keeps approaching,
now too vast to measure . . .
——
If there is something to desire,
there will be something to regret.
If there is something to regret,
there will be something to recall.
If there is something to recall,
there was nothing to regret.
If there was nothing to regret,
there was nothing to desire.
——
Let us touch each other
while we still have hands,
palms, forearms, elbows . . .
Let us love each other for misery,
torture each other, torment,
disfigure, maim,
to remember better,
to part with less pain.
——
We are rich: we have nothing to lose.
We are old: we have nowhere to rush.
We shall fluff the pillows of the past,
poke the embers of the days to come,
talk about what means the most,
as the indolent daylight fades.
We shall lay to rest our undying dead:
I shall bury you, you will bury me.
by Vera Pavlova
(Translated, from the Russian, by Steven Seymour.)
2007-08-26
'타인의 취향'이라는 칼럼을 니체가 읽는다면
타인의 취향
"말은 똥을 치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을 주인으로 여긴다." 김규항과 진중권의 최근 행적을 니체가 봤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인터넷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다섯 명 대표선수 불러내서 밟아준 진중권은 대중들, 적어도 디씨인사이드 디워갤러로부터 일종의 존경심, 흑인 래퍼처럼 말하자면 리스펙트Respect를 얻었다. 반면 김규항이 뒤늦게 싸지른 이 대중영합적인 글은, 심지어는 이 글을 읽는 대중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디 워'열풍이 끝난 후에야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따위 짤막한 칼럼 따위가 뭐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디 워'와 관련하여 진중권이 김규항의 이름을 단 한 번도 호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이건 순전히 김규항의 치졸한 경쟁심에서 비롯한 지면 및 원고료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김규항에게 있다. 본인의 말마따나 "동네 양아치들이 싸우다 파출소에 잡혀가도 ‘선빵'을 가리는법"이니 말이다. 간만에 만나는, 김규항다운 글이다.
"말은 똥을 치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을 주인으로 여긴다." 김규항과 진중권의 최근 행적을 니체가 봤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인터넷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시켜주고, 다섯 명 대표선수 불러내서 밟아준 진중권은 대중들, 적어도 디씨인사이드 디워갤러로부터 일종의 존경심, 흑인 래퍼처럼 말하자면 리스펙트Respect를 얻었다. 반면 김규항이 뒤늦게 싸지른 이 대중영합적인 글은, 심지어는 이 글을 읽는 대중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디 워'열풍이 끝난 후에야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이따위 짤막한 칼럼 따위가 뭐에 쓸모가 있단 말인가. '디 워'와 관련하여 진중권이 김규항의 이름을 단 한 번도 호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이건 순전히 김규항의 치졸한 경쟁심에서 비롯한 지면 및 원고료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김규항에게 있다. 본인의 말마따나 "동네 양아치들이 싸우다 파출소에 잡혀가도 ‘선빵'을 가리는법"이니 말이다. 간만에 만나는, 김규항다운 글이다.
2007-08-24
개와 늑대의 시간 12화 단상
* 스포일러 있음
날이 갈수록 마오와 자신을 동일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빨려들어가던 이수현은, 정작 그 마오와 완전히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케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튕겨져 나오게 된다. 그의 정체성의 물밑 부분들은 마오의 총구를 손으로 가로막던 그 순간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이수현이 어미결정과도 같은 과정을 통해 거의 완벽한 청방의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가 마오라는 새로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총구를 가로막은 서지우에게 이수현이 정서적 친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적어둘만한 일이다. 희생자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감정은 양아버지가 살해되는 순간 이미 이수현의 척수를 훑고 지나간 바 있고, 다만 어머니를 해치려는 총구 앞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신을, 거울에 비친 듯 마주하게 됨으로 인해 그는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억을 잃기 전 마오를 향하고 있던 이수현의 끝없는 증오심이 단지 복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물론 시간 순서대로 사건과 감정을 훑으면 방금 내가 쓴 문장은 진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수현의 입장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재구성한다면, '닿을 수 없는 제2의 정체성'이라는 식으로 축약될 수 있는, 단순한 복수심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심리적 문제가 또아리를 맺는다. 그런 이유로, 기억을 찾은 수현은 쉽게 마오를 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갑수본좌 꽃무늬 넥타이 화이팅!
날이 갈수록 마오와 자신을 동일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빨려들어가던 이수현은, 정작 그 마오와 완전히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케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튕겨져 나오게 된다. 그의 정체성의 물밑 부분들은 마오의 총구를 손으로 가로막던 그 순간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이수현이 어미결정과도 같은 과정을 통해 거의 완벽한 청방의 일원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가 마오라는 새로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총구를 가로막은 서지우에게 이수현이 정서적 친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적어둘만한 일이다. 희생자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감정은 양아버지가 살해되는 순간 이미 이수현의 척수를 훑고 지나간 바 있고, 다만 어머니를 해치려는 총구 앞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신을, 거울에 비친 듯 마주하게 됨으로 인해 그는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억을 잃기 전 마오를 향하고 있던 이수현의 끝없는 증오심이 단지 복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물론 시간 순서대로 사건과 감정을 훑으면 방금 내가 쓴 문장은 진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수현의 입장에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재구성한다면, '닿을 수 없는 제2의 정체성'이라는 식으로 축약될 수 있는, 단순한 복수심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심리적 문제가 또아리를 맺는다. 그런 이유로, 기억을 찾은 수현은 쉽게 마오를 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갑수본좌 꽃무늬 넥타이 화이팅!
2007-08-14
심형래 감독께 차기작을 권함
'디 워' 논란이 쉽사리 잠들 것 같지 않다. 씨네 21과 필름 2.0등 영화 매체들은 이 소란 자체가 쇼박스라는 '충무로 자본'의 농간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고, 느닷없는 진중권의 등장으로 인해 이른바 '디빠'들은 햇살 아래 지렁이들처럼 꿈틀거리고 있으며, 더군다나 '황빠'들이 '디빠'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 사실을 아는 대중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져만 가고 있다. 요컨대 심형래 감독은 점점 외통수를 향해 치닫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영화감독은 영화를 통해 말해야 하고 승부를 봐야 한다. 강우석만 고독한 승부사인가? 심형래도 고독한 승부사다. 글쟁이가 글로 결판을 내듯 영화감독에게는 작품만이 모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짜표를 펑펑 뿌려대는 마케팅 따위 충무로 쇼박스 홍보팀에게 맡겨두고, 심형래 감독은 차기작 구상에 지금부터 몰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오리지널 스토리가 제대로 떠오를 리 만무하니, 대책 마련이 취미이자 특기인 나는 심형래 감독이 영화로 각색하면 딱 어울릴법한 인터넷 소설을 한 편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무려 230만 조회수에 빛나는 인터넷 판타지 소설의 걸작이자 괴작이다. 단순하면서도 거대한 스케일에 빛나는 스토리 라인은 그야말로 심형래 감독의 취향에 적합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공격인 괴수가 여태까지 그 어떤 CG 기술로도 구현된 바 없는 대단히 독특한 오브제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스크린에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심형래 감독의 이름은 영화사에 실로 길이 남을 수 있으리라. 구구한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문제의 그 작품의 1, 2, 3장을 다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자.
[판타지 소설] 투명 드래곤
* * * * * *
"크아아아아"
드래곤중에서도 최강의 투명드래곤이 울부짓었다
투명드래곤은 졸라짱쎄서 드래곤중에서 최강이엇다
신이나 마족도 이겼따 다덤벼도 이겼따 투명드래곤은
새상에서 하나였다 어쨌든 걔가 울부짓었다
"으악 제기랄 도망가자"
발록들이 도망갔다 투명드래곤이 짱이었따
그래서 발록들은 도망간 것이다
* * * * * *
투명드래곤은 심심햇다
그래서 신을죽이기로 햇다
그래서 신들은 비상이ㅓㄱㄹ렸따
"씨발 투명드래곤이 쳐들어온대"
"그래 싸우자"
하지만 투명드래곤은 투명드래곤이라서 투명했따
그래서 안보여서 신들은결국 다 죽고말았따
투명드래곤은 이새계가심심해서 다른새계로
가기로하였따ㅣ
* * * * * * 명대사 나옴..* * * * * *
위이ㅣ이이이이이잉
투명드레곤은 차원이동을햇다
그러자 현실새계가 나왓다
"오 조은데 심심한데 다주겨야지"
투명드래곤이 브레스를했다 그러자 아니 브레스도
안하고그냥 손에서빔을 쐈다
그거 한방에미국이 다날라갔따
졸라짱쎈 투명드래곤이었다
사람들은투명드래곤이 투명해서 누가한지도 몰랐다
투명드래곤은 또 심심해져서결국......................(흐흐담편기대하샘)
* * * * * *
오늘은여기까지 애요~~~~~~~~~~~~~~~~~
뱌뱌~~~ 낼또쓸께요~~~~
아 글구여 저 첨인디 왜캐 욕만하세여....................
좀 봐주샘 첨이에여~~~~~~~~~~~
글구 내글은ㅜㄴ가출판안해가나~~~~~~~
책으로 나왔음종갰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 * * * *
그때엿다
"본부나와라 오바 투명드래곤을ㅗㅆ겟다"
쓩쓩쓩쓩쓩
전투기가날라와서 투명드래곤을 미사일쌌다
근대 투명드래곤은 투명해서 안보여서 그래서 안맞앗다
한두대쯤맞았는데 그건투명드래곤 간지럽히기도 안됬다
"푸하하 코딱지만도 못한것드라 잘가라 케케"
투명드래곤이 해서 전투기들은 0.001초만애 존나몰살당했따
진짜 짱이였다
* * * * * *
63빌딩이 잇었다 아니 100층도 넘는빌딩이 있엇다
근대 그빌딩보다 투명드래곤이더 컷다
"하하하하하ㅏㅎ"
투명드래곤이 그 빌딩을한대치자 전부무너졌다 빌딩이 무너졌다
그래서 투명드래곤은심심해서 그거풀려고 사람들한테말했다
"이제부터 나 사람으로 변해서살테니까 날알아서모셔라"
사람들은 당근 오케이했고 투명드래곤은사람으로 변했다
짠~다음부터는 투명드래곤이 사람으로변해서부터 시작하는
스토리가 전개댑니다 기대하시라 짠
* * * * * *
님들아 저 오늘 진짜로 오늘 여기까지만써요
뱌뱌
근대요저 첨이에요 좀 봐주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글구여 제글꼐속봐주고 잼따고해주시는그님감사
기대하셈 절대안실망시켜드림니다~~~~~~~~~~~ ㅇㅋ??
* * * * * *
갑자기 졸라 짱잼는스토리가 생각나서다시 습니다
기대하샘~~~~~~~~~~~
* * * * * *
사람으로변한 투명드래곤은 졸라잘생긴진짜 초미소년이었따
남자긴했는데 진짜여자들보다 훨씬예뻤다
진짜예뻣다 사람들남자여자 다 반했따
근대 투명드래곤이라투명해서 안보였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따.
"크케케케ㅔ케케케"
바로저글링과히드라들 이었따 걔네들은오버로드를타고 마니왔다
지구로쳐들어 온거다 저그가 하여튼그래서 투명드래곤을
그들을 업새버리기로했다 다음내용 기대하시라졸라 숨막히는
스릴전투~~~~~
* * * * * *
그때였다 투명드래곤이 초필살기는 아니고그냥 필살기인
브레스를쏜거였다(초필살기는 브레스보다더쌤 기대하셈 ㅋㅋ)
그러자 오버로드만골라쐈다 그래서 오버로드들만 투명드래곤이
골라서 다죽인거였따
"펑펑펑펑 우아아아아아아ㅏ아!"
오버로드들은 결국 졸라게죽었다 피도졸라튀고 하여간수천만마리의
오버로드들이한번에 몰살당했따
그래서 투명드래곤은 자신을안보이게할려고 오버로드만일단
골라준인거였다 거기다가 오버로드가엄써서 저글링가히드라들은이제
도망도 못가게되었다
"하하하하핳 이제애들좀 죽여볼까 몸좀풀어불까 훗"
그게바로 피튀기는우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투명드래곤의 한마디여따
저글링과히드라들은 공포에떨었다 근데안보여서지네들이
누구에게 죽는지도몰랏을 것이다 투명드래곤이이제
저글링과 히드라들을 향해움직이기 시작햇다
* * * * * *
학원가따와써여~~~ 계속글쓸께여님들아 기대해주샘
그리고볼사람만 바요 왜욕하고그래요 욕할꺼면보지말던가
그래도칭찬해주는사람이 더 만아서조으네요 히히
설문조사도짱재밌다가 만쿠 근데 보통찍으신분은 모냐구요 ㅠㅠㅠㅠㅠㅠㅠ
인기마나서질두하는건가
어째뜬 님들아 기대해주샘
욕할사람은 보지마~~~~~~
뱌뱌~~~~~~~~~~~~^^^^^^^^^
하지만 영화감독은 영화를 통해 말해야 하고 승부를 봐야 한다. 강우석만 고독한 승부사인가? 심형래도 고독한 승부사다. 글쟁이가 글로 결판을 내듯 영화감독에게는 작품만이 모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짜표를 펑펑 뿌려대는 마케팅 따위 충무로 쇼박스 홍보팀에게 맡겨두고, 심형래 감독은 차기작 구상에 지금부터 몰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오리지널 스토리가 제대로 떠오를 리 만무하니, 대책 마련이 취미이자 특기인 나는 심형래 감독이 영화로 각색하면 딱 어울릴법한 인터넷 소설을 한 편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무려 230만 조회수에 빛나는 인터넷 판타지 소설의 걸작이자 괴작이다. 단순하면서도 거대한 스케일에 빛나는 스토리 라인은 그야말로 심형래 감독의 취향에 적합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공격인 괴수가 여태까지 그 어떤 CG 기술로도 구현된 바 없는 대단히 독특한 오브제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스크린에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심형래 감독의 이름은 영화사에 실로 길이 남을 수 있으리라. 구구한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두고, 문제의 그 작품의 1, 2, 3장을 다함께 감상해보도록 하자.
[판타지 소설] 투명 드래곤
* * * * * *
"크아아아아"
드래곤중에서도 최강의 투명드래곤이 울부짓었다
투명드래곤은 졸라짱쎄서 드래곤중에서 최강이엇다
신이나 마족도 이겼따 다덤벼도 이겼따 투명드래곤은
새상에서 하나였다 어쨌든 걔가 울부짓었다
"으악 제기랄 도망가자"
발록들이 도망갔다 투명드래곤이 짱이었따
그래서 발록들은 도망간 것이다
* * * * * *
투명드래곤은 심심햇다
그래서 신을죽이기로 햇다
그래서 신들은 비상이ㅓㄱㄹ렸따
"씨발 투명드래곤이 쳐들어온대"
"그래 싸우자"
하지만 투명드래곤은 투명드래곤이라서 투명했따
그래서 안보여서 신들은결국 다 죽고말았따
투명드래곤은 이새계가심심해서 다른새계로
가기로하였따ㅣ
* * * * * * 명대사 나옴..* * * * * *
위이ㅣ이이이이이잉
투명드레곤은 차원이동을햇다
그러자 현실새계가 나왓다
"오 조은데 심심한데 다주겨야지"
투명드래곤이 브레스를했다 그러자 아니 브레스도
안하고그냥 손에서빔을 쐈다
그거 한방에미국이 다날라갔따
졸라짱쎈 투명드래곤이었다
사람들은투명드래곤이 투명해서 누가한지도 몰랐다
투명드래곤은 또 심심해져서결국......................(흐흐담편기대하샘)
* * * * * *
오늘은여기까지 애요~~~~~~~~~~~~~~~~~
뱌뱌~~~ 낼또쓸께요~~~~
아 글구여 저 첨인디 왜캐 욕만하세여....................
좀 봐주샘 첨이에여~~~~~~~~~~~
글구 내글은ㅜㄴ가출판안해가나~~~~~~~
책으로 나왔음종갰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 * * * *
그때엿다
"본부나와라 오바 투명드래곤을ㅗㅆ겟다"
쓩쓩쓩쓩쓩
전투기가날라와서 투명드래곤을 미사일쌌다
근대 투명드래곤은 투명해서 안보여서 그래서 안맞앗다
한두대쯤맞았는데 그건투명드래곤 간지럽히기도 안됬다
"푸하하 코딱지만도 못한것드라 잘가라 케케"
투명드래곤이 해서 전투기들은 0.001초만애 존나몰살당했따
진짜 짱이였다
* * * * * *
63빌딩이 잇었다 아니 100층도 넘는빌딩이 있엇다
근대 그빌딩보다 투명드래곤이더 컷다
"하하하하하ㅏㅎ"
투명드래곤이 그 빌딩을한대치자 전부무너졌다 빌딩이 무너졌다
그래서 투명드래곤은심심해서 그거풀려고 사람들한테말했다
"이제부터 나 사람으로 변해서살테니까 날알아서모셔라"
사람들은 당근 오케이했고 투명드래곤은사람으로 변했다
짠~다음부터는 투명드래곤이 사람으로변해서부터 시작하는
스토리가 전개댑니다 기대하시라 짠
* * * * * *
님들아 저 오늘 진짜로 오늘 여기까지만써요
뱌뱌
근대요저 첨이에요 좀 봐주샘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글구여 제글꼐속봐주고 잼따고해주시는그님감사
기대하셈 절대안실망시켜드림니다~~~~~~~~~~~ ㅇㅋ??
* * * * * *
갑자기 졸라 짱잼는스토리가 생각나서다시 습니다
기대하샘~~~~~~~~~~~
* * * * * *
사람으로변한 투명드래곤은 졸라잘생긴진짜 초미소년이었따
남자긴했는데 진짜여자들보다 훨씬예뻤다
진짜예뻣다 사람들남자여자 다 반했따
근대 투명드래곤이라투명해서 안보였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따.
"크케케케ㅔ케케케"
바로저글링과히드라들 이었따 걔네들은오버로드를타고 마니왔다
지구로쳐들어 온거다 저그가 하여튼그래서 투명드래곤을
그들을 업새버리기로했다 다음내용 기대하시라졸라 숨막히는
스릴전투~~~~~
* * * * * *
그때였다 투명드래곤이 초필살기는 아니고그냥 필살기인
브레스를쏜거였다(초필살기는 브레스보다더쌤 기대하셈 ㅋㅋ)
그러자 오버로드만골라쐈다 그래서 오버로드들만 투명드래곤이
골라서 다죽인거였따
"펑펑펑펑 우아아아아아아ㅏ아!"
오버로드들은 결국 졸라게죽었다 피도졸라튀고 하여간수천만마리의
오버로드들이한번에 몰살당했따
그래서 투명드래곤은 자신을안보이게할려고 오버로드만일단
골라준인거였다 거기다가 오버로드가엄써서 저글링가히드라들은이제
도망도 못가게되었다
"하하하하핳 이제애들좀 죽여볼까 몸좀풀어불까 훗"
그게바로 피튀기는우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투명드래곤의 한마디여따
저글링과히드라들은 공포에떨었다 근데안보여서지네들이
누구에게 죽는지도몰랏을 것이다 투명드래곤이이제
저글링과 히드라들을 향해움직이기 시작햇다
* * * * * *
학원가따와써여~~~ 계속글쓸께여님들아 기대해주샘
그리고볼사람만 바요 왜욕하고그래요 욕할꺼면보지말던가
그래도칭찬해주는사람이 더 만아서조으네요 히히
설문조사도짱재밌다가 만쿠 근데 보통찍으신분은 모냐구요 ㅠㅠㅠㅠㅠㅠㅠ
인기마나서질두하는건가
어째뜬 님들아 기대해주샘
욕할사람은 보지마~~~~~~
뱌뱌~~~~~~~~~~~~^^^^^^^^^
2007-08-09
My Fair Lady
7월 28일 보고 온 영화에 대한 평을 지금 쓰는 이유는, 마감도 마감이거니와 그동안 머리에 뽕 맞은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화가 상영중이라는 사실을 두고 '디 워'에 대한 논쟁으로 떠들썩한 세상은 과연 어찌된 곳인가, 이런 식의 택도 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지금 더 말할 건 아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도 머리가 머엉 하다. CG를 이렇게 저렇게 처발랐네 하면서 마치 CG가 헐리우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도 우습다.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 꽃시장 장면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겠지만, 바로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각적 스펙터클이지, 무슨 욕 같은 이름의 도마뱀들이 남한산성을 공격하는 그런 것은 애초에 영화의 긴 역사에서 한 방울의 잉크도 잡아먹지 못하는, 시시하다 못해 그래요 니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훌륭한 거겠죠, 이런 정도라는 것을 왜 다들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스크린에서 햅번을 보고 나는 맛이 갔다. 이 영화가 놀랍게도, 현대 한국 멜로가 지향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두 사람 사이의 계급적인 갈등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부모라는 제2의 변수를 독특한 방식으로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그랬다. 일라이자의 아버지는 히긴스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서 50파운드를 챙긴 이후 소식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로 인해 '운 좋게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일라이자가 찾아가니 아버지는 결혼 전야여서 딸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것은 딸내미가 경마장에서 '아버지에게는 럼주가 모유나 마찬가지였죠'라고 말한 바로 그 노동계급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딸을 버리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워낙 지저분한 상태에서 척박하게 살고 있다 보니 그에 맞는 행동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노동계급으로 살아가던 일라이자가 꽃 한 송이만 팔아달라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꽃 값을 물어내라고 떼떼거릴 때, 그것마저 예쁘게 보였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여자가 들이대는 한국 드라마의 맥락에 너무 함몰된 것이 아닐까. 이 영화는 내가 최근에 봤던 그 어떤 작품보다 더 적나라하게 계급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뭐 이딴 건 솔직히 아무래도 좋다. 까먹기 싫으니까 적어놓은 것 뿐이고, 사실 핵심은 요새, 머리에 뽕 맞은 것처럼 자꾸 이 영화의 노래 컷만 반복해 보고 있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블로그에 글을 쓰는 편이 낫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다.
햅번이 직접 부른 노래. 고난이도의 곡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음색이 너무 곱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노래에서만큼은 너무도 잘 어울릴 뿐더러 사랑스럽고, 자신이 연기를 해서 그런지 정서까지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 마차를 이용한 액션 구성이, 어렸을 때 한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 영화를 하도 어렸을 때 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기서 활용되는 어구를 발음 교정 교재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고 느끼게 된 경우. 아무튼 이 곡은 그 자체가 좋고 여기서 환희에 가득찬 햅번이 너무도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노래와는 약간 동떨어지게 '하하'라고 깔깔거리는 목소리가 귀에 쏙 박히는 클립이다. 일라이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른 계층의 세계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대에 폭 자빠진 다음 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건 남자, 아니 사람도 아니다. 지금 와서는 'Wouln't it be lovely'가 더 유명하지만, 이 뮤지컬이 처음 상연되었을 당시에는 이 곡이 최고의 히트작이었고 그것은 작곡가가 의도한 바와 같았다. 타자를 치느라 이 화면만 보고 있음에도 햅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까지 다 떠오른다. 조심조심 사랑의 감정을 만지는 여자아이의 얼굴과 행동이 그런 거겠지.
사실 노래를 하기 전에 말다툼하는 장면이 일품인데, 그건 클립이 없다. '나한테 배운 걸 나한테 써먹지 마!'라고 발끈하는 히긴스 교수의 대사와 표정이 아주 귀여운데. 히긴스 교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 '문명화' 되었지만 다소 넘치는 태도로 환영하던 햅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여자가 노래를 끝낼 때가 되자 화급하게 막아버리는 히긴스 교수의 행태는 덤으로 봐주도록 하자.
조금 늦어서 허겁지겁 평을 쓰고 있다. 세탁기를 돌려놓고 빨래가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다. 아무튼, 이 영화의 진정한 미덕은 '변신소녀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기도 하다. 햅번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 입에서 감탄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경마장에서 '이 이상 대체 뭐가 있다고!'라며 절규했지만, 무도회 이후 히긴스 교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입었던 드레스는 무도회의 그것보다 훨씬 우아하다. 용도가 달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처음 히긴스 교수를 찾아갈 때 입었던 옷이 설정보다 너무 덜 튀고 덜 예쁘지 않았다는 것 정도가 문제랄까. 목소리가 뮤지컬에 적합하지 않아 더빙을 강요당했던 것만 제하고 본다면 햅번은 너무 예쁘고 훌륭했다.
아무튼 스크린에서 햅번을 보고 나는 맛이 갔다. 이 영화가 놀랍게도, 현대 한국 멜로가 지향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두 사람 사이의 계급적인 갈등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부모라는 제2의 변수를 독특한 방식으로 완전히 치워버렸다는 것을 알고 나니 더욱 그랬다. 일라이자의 아버지는 히긴스 교수의 추천을 받으면서 50파운드를 챙긴 이후 소식이 없는데, 알고 보니 그로 인해 '운 좋게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일라이자가 찾아가니 아버지는 결혼 전야여서 딸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것은 딸내미가 경마장에서 '아버지에게는 럼주가 모유나 마찬가지였죠'라고 말한 바로 그 노동계급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딸을 버리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워낙 지저분한 상태에서 척박하게 살고 있다 보니 그에 맞는 행동의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노동계급으로 살아가던 일라이자가 꽃 한 송이만 팔아달라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꽃 값을 물어내라고 떼떼거릴 때, 그것마저 예쁘게 보였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여자가 들이대는 한국 드라마의 맥락에 너무 함몰된 것이 아닐까. 이 영화는 내가 최근에 봤던 그 어떤 작품보다 더 적나라하게 계급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뭐 이딴 건 솔직히 아무래도 좋다. 까먹기 싫으니까 적어놓은 것 뿐이고, 사실 핵심은 요새, 머리에 뽕 맞은 것처럼 자꾸 이 영화의 노래 컷만 반복해 보고 있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블로그에 글을 쓰는 편이 낫겠다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다.
햅번이 직접 부른 노래. 고난이도의 곡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음색이 너무 곱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노래에서만큼은 너무도 잘 어울릴 뿐더러 사랑스럽고, 자신이 연기를 해서 그런지 정서까지 제대로 담아내고 있다. 마차를 이용한 액션 구성이, 어렸을 때 한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인상적이었던 장면.
이 영화를 하도 어렸을 때 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기서 활용되는 어구를 발음 교정 교재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고 느끼게 된 경우. 아무튼 이 곡은 그 자체가 좋고 여기서 환희에 가득찬 햅번이 너무도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노래와는 약간 동떨어지게 '하하'라고 깔깔거리는 목소리가 귀에 쏙 박히는 클립이다. 일라이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른 계층의 세계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침대에 폭 자빠진 다음 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건 남자, 아니 사람도 아니다. 지금 와서는 'Wouln't it be lovely'가 더 유명하지만, 이 뮤지컬이 처음 상연되었을 당시에는 이 곡이 최고의 히트작이었고 그것은 작곡가가 의도한 바와 같았다. 타자를 치느라 이 화면만 보고 있음에도 햅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까지 다 떠오른다. 조심조심 사랑의 감정을 만지는 여자아이의 얼굴과 행동이 그런 거겠지.
사실 노래를 하기 전에 말다툼하는 장면이 일품인데, 그건 클립이 없다. '나한테 배운 걸 나한테 써먹지 마!'라고 발끈하는 히긴스 교수의 대사와 표정이 아주 귀여운데. 히긴스 교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 '문명화' 되었지만 다소 넘치는 태도로 환영하던 햅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여자가 노래를 끝낼 때가 되자 화급하게 막아버리는 히긴스 교수의 행태는 덤으로 봐주도록 하자.
조금 늦어서 허겁지겁 평을 쓰고 있다. 세탁기를 돌려놓고 빨래가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다. 아무튼, 이 영화의 진정한 미덕은 '변신소녀물'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기도 하다. 햅번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내 입에서 감탄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다. 경마장에서 '이 이상 대체 뭐가 있다고!'라며 절규했지만, 무도회 이후 히긴스 교수의 집으로 돌아올 때 입었던 드레스는 무도회의 그것보다 훨씬 우아하다. 용도가 달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처음 히긴스 교수를 찾아갈 때 입었던 옷이 설정보다 너무 덜 튀고 덜 예쁘지 않았다는 것 정도가 문제랄까. 목소리가 뮤지컬에 적합하지 않아 더빙을 강요당했던 것만 제하고 본다면 햅번은 너무 예쁘고 훌륭했다.
2007-08-07
근황
물론 '디 워'를 보지는 않았지만, 방안에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인다. 내 집은 남산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붙어있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해충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도무지 다른 동네에서는 본 적도 없는 꼽등이 따위가 활개치고 다니는데, 홈메트 한 장만 켜면 모기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도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만큼 통제가 되기도 하니까. 어쩌면 이게 정상일지도 모르겠지만.
가을이를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집에 들어가서는, 맛있는 것을 주고 고작 몇십 번 정도 쓰다듬어 준 다음 잠들었다 벌떡 일어나 다시 문을 박차고 나섰다. 가을아,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감정 이입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회사 갔다 온다는, 혹은 학교 갔다 온다는 말을 하면서 빠이빠이 손을 흔들면 가을이는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와서 최후의 발악처럼 손을 깨문다. 훗, 어차피 같이 있어봐야 서로 누워서 더 잠을 자도록 충동질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데.
요즘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일정한 퀄리티의 글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피곤하다. 한때는 듀나처럼 매일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식의 게으름증 내지는 무기력증이 치유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하루 하루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듀나가 듀나임을 증명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7월 한 달 동안 일곱 편인가 여덟 편인가 아무튼 그만큼 영화를 봐놓고도, 그것도 두 주의 주말에 몰아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꼭 영화에 대한 것만도 아니다. 지금 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의 다음 화가 방영될 수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말을 글로 풀어놓지는 않는다. 말은 그래도 조금 한다. 이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머뭇거리다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도록 강요한다.
비틀즈의 'I Will'은 너무 좋다. 지금 두 가지 버전, 엔솔로지와 일반 앨범판을 놓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막상 시작하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펼쳐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아끼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꼭 안고 귀에 대고. 다들 그렇지 않을까.
가을이를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나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집에 들어가서는, 맛있는 것을 주고 고작 몇십 번 정도 쓰다듬어 준 다음 잠들었다 벌떡 일어나 다시 문을 박차고 나섰다. 가을아, 아빠 회사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감정 이입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회사 갔다 온다는, 혹은 학교 갔다 온다는 말을 하면서 빠이빠이 손을 흔들면 가을이는 다소 실망한 표정으로 와서 최후의 발악처럼 손을 깨문다. 훗, 어차피 같이 있어봐야 서로 누워서 더 잠을 자도록 충동질하는 것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데.
요즘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일정한 퀄리티의 글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피곤하다. 한때는 듀나처럼 매일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식의 게으름증 내지는 무기력증이 치유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하루 하루 그런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듀나가 듀나임을 증명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7월 한 달 동안 일곱 편인가 여덟 편인가 아무튼 그만큼 영화를 봐놓고도, 그것도 두 주의 주말에 몰아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글로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꼭 영화에 대한 것만도 아니다. 지금 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의 다음 화가 방영될 수요일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말을 글로 풀어놓지는 않는다. 말은 그래도 조금 한다. 이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머뭇거리다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도록 강요한다.
비틀즈의 'I Will'은 너무 좋다. 지금 두 가지 버전, 엔솔로지와 일반 앨범판을 놓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막상 시작하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펼쳐질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 아끼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꼭 안고 귀에 대고. 다들 그렇지 않을까.
2007-07-31
2007-07-30
I Have Forgiven Jesus
I was a good kid, I wouldn't do you no harm,
I was a nice kid, With a nice paper round.
Forgive me any pain, I may have brung to you.
With God's help I know,
I'll always be near to you
But Jesus hurt me, When he deserted me, but,
I have forgiven you Jesus
For all the desire,
You placed in me when there's nothing I can do with this desire
I was a good kid, Through hail and snow, I'd go just to moon you,
I carried my heart in my h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But Jesus hurt me, When he deserted me, but,
I have forgiven you Jesus
For all of the love,
You placed in me when there's no one I can turn to with this love
Monday - humiliation,
Tuesday - suffocation,
Wednesday - condescension,
Thursday - is pathetic
By Friday life has killed me, By Friday life has killed me.
Oh pretty one, Oh pretty one...
Why did you give me so much desire,
when there is nowhere I can go to offload this desire?
And why did you give me so much love in a loveless world,
when there's no one I can turn to to unlock all this love?
And why did you stick me in self deprecating bones and skin?
Jesus, do you hate me?
Why did you stick me in self deprecating bones and skin?
Do you hate me? Do you hate me? Do you hate me? Do you hate me? Do you hate me?
2007-07-24
음반 시장과 매체로서의 CD
예전에는 3000원짜리 테이프를 사면 됐다. 점심을 한 끼만 굶으면 고등학생도 음반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거의 쇠락하고, 모든 음원이 CD로만 유통되던 중간기, 내 주변인들의 음악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 막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넵스터를 향해 달려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음반 판매가 기록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MP3에만 있지 않다. CD는 휴대하고 다니기 좋은 매체가 아니다. 사이즈가 미묘하게 커서 한 손에 집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CD의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MD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며(소니 안습), 마침 그때 MP3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음반 시장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CD는 음질이 좋지만 가지고 다니기엔 불편하면서도, 테이프에 비해 적어도 세 배 정도는 비쌌다. 음반 판매가 안 떨어지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싱글 음반을 포함한 몇몇 시도들이 음악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늦은 대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음악은 물리적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으며, 바로 그 방식을 통해 구성되는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확실히 테이프는 언젠가 늘어나게 마련이니 소리를 저장하는 매체로서 그다지 좋지 않다. 하지만 CD의 애매한 사이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것이 DVD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 불만스럽다(CD의 사이즈가 불편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5.25인치 디스켓이 3.5인치 디스켓에 완전히 쓸려버린 이유를 4.375초 정도만 생각해보자).
필립스가 처음 CD를 개발할 때 표준을 그런 식으로 정해버린 덕택에, 결국 지금은 나같은 구닥다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CDP를 들고 다니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갓 산 음반의 비닐을 벗기고 첫 소리를 감상하는 두근거림마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쩌면 그게 음악을 듣는 진짜 즐거움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음반 판매가 기록적으로 줄어든 이유는 MP3에만 있지 않다. CD는 휴대하고 다니기 좋은 매체가 아니다. 사이즈가 미묘하게 커서 한 손에 집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CD의 기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MD를 포함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며(소니 안습), 마침 그때 MP3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음반 시장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CD는 음질이 좋지만 가지고 다니기엔 불편하면서도, 테이프에 비해 적어도 세 배 정도는 비쌌다. 음반 판매가 안 떨어지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싱글 음반을 포함한 몇몇 시도들이 음악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늦은 대응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미 음악은 물리적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으며, 바로 그 방식을 통해 구성되는 시장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확실히 테이프는 언젠가 늘어나게 마련이니 소리를 저장하는 매체로서 그다지 좋지 않다. 하지만 CD의 애매한 사이즈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것이 DVD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조금 불만스럽다(CD의 사이즈가 불편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5.25인치 디스켓이 3.5인치 디스켓에 완전히 쓸려버린 이유를 4.375초 정도만 생각해보자).
필립스가 처음 CD를 개발할 때 표준을 그런 식으로 정해버린 덕택에, 결국 지금은 나같은 구닥다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CDP를 들고 다니지 않고, 그리하여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갓 산 음반의 비닐을 벗기고 첫 소리를 감상하는 두근거림마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었다. 어쩌면 그게 음악을 듣는 진짜 즐거움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2007-07-23
가톨릭 교회에 대한 오해
"가톨릭 교회는 이들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성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규율과 교리도 거짓없는 존경으로 살펴본다. 그것이 비록 가톨릭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과는 여러 면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해도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진리를 반영하는 일도 드물지는 않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한14,6)그분 안에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의 풍족함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과 화해시키셨음을(2고린5,18-19)교회는 선포하고 있으며 또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비 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많은 사람들이 2차 바티칸공의회의 의미를 과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인용한 문구를 꼼꼼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할 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 교리까지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진리를 반영하는 것과 진리 그 자체인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건에서는 가톨릭의 기본적인 교리를 굳이 말로 재확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개신교회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그러한 오해는 마찬가지이다. 역사 이래 단 한번도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와 그 다양한 분파들을 온전한 교회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단체들 속에서 지금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분열의 죄과로 몰아세울 수는 없으므로,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치는 못하나, 가톨릭 교회와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제1장,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이라고 그 유명한 2차 바티칸공의회는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세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었으므로, 크리스챤이란 이름이 당연하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개신교회에 결함이 있다는 견해를 철회한 적은 없다.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선언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신, 그 문헌에 대한 달콤한 풍문만을 전해들은 다음 그것을 토대로 멋대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 당연히 교회이면서도 교회로서의 기본 가치마저도 포기한 듯한 그 어떤 단체가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의 가톨릭 교회겠거니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2차 공의회를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최한 것도 아니거니와, 이미 그부터가 공의회의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수도 없이 들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큉은 교황청과 바로 그런 이유로 싸우다가 급기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교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가톨릭 교회가 '진보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한국 사회가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가치에 조금도 부합하지 못할 만큼 야만적이었던 시절,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철저히 견지하던 교회가 유독 사회적으로 도드라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 뿐이다. 바로 그 굳건함이 가톨릭 교회의 본질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가톨릭 교회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바티칸공의회의 의미를 과대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위에서 인용한 문구를 꼼꼼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타 종교의 윤리적 가치를 인정할 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 교리까지 포기하고 있지는 않다. 진리를 반영하는 것과 진리 그 자체인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문건에서는 가톨릭의 기본적인 교리를 굳이 말로 재확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개신교회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그러한 오해는 마찬가지이다. 역사 이래 단 한번도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와 그 다양한 분파들을 온전한 교회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단체들 속에서 지금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분열의 죄과로 몰아세울 수는 없으므로,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합법적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완전치는 못하나, 가톨릭 교회와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 것"(제1장,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이라고 그 유명한 2차 바티칸공의회는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세 때에 믿음으로 의화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결합되었으므로, 크리스챤이란 이름이 당연하며 가톨릭 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개신교회에 결함이 있다는 견해를 철회한 적은 없다.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선언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대신, 그 문헌에 대한 달콤한 풍문만을 전해들은 다음 그것을 토대로 멋대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 당연히 교회이면서도 교회로서의 기본 가치마저도 포기한 듯한 그 어떤 단체가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의 가톨릭 교회겠거니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2차 공의회를 요한 바오로 2세가 개최한 것도 아니거니와, 이미 그부터가 공의회의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수도 없이 들어온 인물이기도 하다. 스위스의 신학자 한스 큉은 교황청과 바로 그런 이유로 싸우다가 급기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교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가톨릭 교회가 '진보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한국 사회가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가치에 조금도 부합하지 못할 만큼 야만적이었던 시절, 자신의 윤리적 관점을 철저히 견지하던 교회가 유독 사회적으로 도드라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 뿐이다. 바로 그 굳건함이 가톨릭 교회의 본질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가톨릭 교회는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2007-07-22
피랍 사태를 바라보는 한 논객의 견해
"가장 원망스러운 것은 분당의 샘물교회다. 이 시점에서 만일 대한민국이 알카에다 무장 폭도들의 협박에 무릎을 꿇는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샘물교회는 참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폐를 끼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전 세계인들의 앞에서 구기게 할지도 모르는 경거망동을 한 것이다."
아프칸의 딜레마,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
'개신교도들은 욕을 먹어도 싸, 누가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생각없이 그런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 애먹이고 지랄이야? 잘됐네 뭐, 순교하면 천국행 직빵이니까' 등등 볼멘소리를 하는 당신은 지만원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지만원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꼭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아프칸의 딜레마, 지만원(시스템클럽 대표)
'개신교도들은 욕을 먹어도 싸, 누가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생각없이 그런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 애먹이고 지랄이야? 잘됐네 뭐, 순교하면 천국행 직빵이니까' 등등 볼멘소리를 하는 당신은 지만원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지만원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꼭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이 그렇다고.
2007-07-16
학교와 청소와 군대
교내청소, 교육인가 인권침해인가… 교육현장 새 골칫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징병된 병사들이 내무반 청소를 하며 시간을 죽이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한국 군대가 터무니없는 노동 착취를 벌일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학창 시절을 통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좆같은' 일을 당하며 살았던 이들은, 잠깐 대학의 자유를 누린 후 다시 '좆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이 온전한 성인이 아니며 조직적인 국가의 폭력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체감하고는, 시스템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된다.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 없는 청소년들이 입대할 무렵이 되면, 군대의 풍경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청소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징병된 병사들이 내무반 청소를 하며 시간을 죽이게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한국 군대가 터무니없는 노동 착취를 벌일 수 있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학창 시절을 통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좆같은' 일을 당하며 살았던 이들은, 잠깐 대학의 자유를 누린 후 다시 '좆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신들이 온전한 성인이 아니며 조직적인 국가의 폭력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체감하고는, 시스템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하게 된다.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 없는 청소년들이 입대할 무렵이 되면, 군대의 풍경도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7-07-15
1910년대 당시 아일랜드와 흑맥주
"도시의 공기에는 흑맥주, 건초, 뜨거운 파이, 말똥의 냄새가 혼합되어 있었지만, 흑맥주 냄새가 가장 강했다. 기네스 양조회사의 소유주 이베아프 경은 그곳에서 전 세계 흑맥주 생산량의 5분의 1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양조량은 영국군 모든 장병에게 1인당 2.5파인트씩 공짜로 나워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 흑맥주를 만드는 일은 마시는 일보다도 훨씬 더 좋아서, 기네스 노동자들은 그들이 은퇴하거나 해고당하거나 쓰러져 죽기만을 수천 명의 실직자 동포시민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게 만드는, 이 나라의 노동귀족이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가장 숭배되고 있는 그 노동은 그 밖의 모든 사람을 인사불성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83페이지. 성자와 학자 / 지은이: 테리 이글턴 ; 옮긴이: 차미례 -- 파주, 경기도 : 한울, 2007
2007-07-10
미디어로서의 상품
"라스킨은 컴퓨터가 대중에게 파고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그의 견해는 매우 독특했다.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제품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품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요지의 말을 자주 했다. 불행한 일일지는 몰라도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길은 돈을 버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 셈이다.
라스킨은 단적인 예로 매킨토시를 예로 들었다. 매킨토시 이전에 자신이 아무리 비트맵 스크린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제록스에서 아무리 많은 기사와 글들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매킨토시가 의외로 많이 팔려나가자 사람들은 써보거나 기계를 구경한 다음 비트맵 스크린과 그래픽의 아이디어를 이해했고, 그래픽과 텍스트가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문자는 그래픽의 다른 예라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하드웨어를 쓰지 않고도 폰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포츈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믿으려 할 것이라는 말을 라스킨은 자주 하고 다녔다."
MS-애플 「GUI 경쟁의 역사」에서 인용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상품. '맑스도 자본론이 대형 서점에서 팔리기를 원했을 것이다'라는 탐 모렐로의 말을 연상시킨다. 이런 종류의 타당함은 여느 회의주의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파괴적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부러 좋은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당대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지를 이룩한 그 무엇은, 언젠가 좋은 골동품이 되어 훨씬 비싼 가격에 유통된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마저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라스킨은 단적인 예로 매킨토시를 예로 들었다. 매킨토시 이전에 자신이 아무리 비트맵 스크린이 좋다고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제록스에서 아무리 많은 기사와 글들을 써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매킨토시가 의외로 많이 팔려나가자 사람들은 써보거나 기계를 구경한 다음 비트맵 스크린과 그래픽의 아이디어를 이해했고, 그래픽과 텍스트가 분리될 필요가 없으며 문자는 그래픽의 다른 예라는 사실과 함께 별도의 하드웨어를 쓰지 않고도 폰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포츈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라면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믿으려 할 것이라는 말을 라스킨은 자주 하고 다녔다."
MS-애플 「GUI 경쟁의 역사」에서 인용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상품. '맑스도 자본론이 대형 서점에서 팔리기를 원했을 것이다'라는 탐 모렐로의 말을 연상시킨다. 이런 종류의 타당함은 여느 회의주의를 훌쩍 뛰어넘을 만큼 파괴적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부러 좋은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당대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지를 이룩한 그 무엇은, 언젠가 좋은 골동품이 되어 훨씬 비싼 가격에 유통된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마저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다.
2007-07-03
2007-06-30
블루
키리코 나나난의 만화는, '괜히 봤다'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게 할만큼 강한 정서적 호소력을 지닌다. 과다한 노출로 인해 번져버린 사진같은 필체는, 원래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저 평범할 뿐이라고 우기는, 그래서 결국 위화감을 조성하는 여성만화의 관습적 문법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타다 유미의 작품들이 아무리 '쎄도',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패션 모델 말고는 그 어떤 직업에도 적합하지 않은 몸매를 지니고 있는 탓에 몰입을 해치는 것과 정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호박과 마요네즈'와 '블루'를 보면, 이 작가의 세계에 특별하고 거대한 사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평범한 이들이 연애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일 뿐인데, 다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감정의 묘사가, 마치 물 위에 여러 마리의 종이학을 띄워두고 서로 부딛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위태롭고 안타까울 뿐. 정말 괜히 봤다. 원고 쓸 게 많은데.
2007-06-22
계통 없이
어딘가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김훈은 자신이 다양한 책들을 '계통 없이' 읽고 있다며, 항해술과 선박에 관한 것들을 그 예로 들었다. 읽고 있노라면 선원들의 땀과 근육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떤 소설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다는 식의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뜨끈하고 비릿한 것들에 탐닉하는 그의 취향을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서 그가 사용한 '계통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한 마디 덧붙일 필요가 있다. 그 어구는 "그러한 나의 반역성을 조소하는 듯이 스무살도 넘을까말까한 노는 계집애와 머리가 고슴도치처럼 부수수하게 일어난 쓰메에리의 학생복을 입은 청년이 들어와서 커피니 오트밀이니 사과니 어수선하게 벌여놓고 계통없이 처먹고 있다"(시골 선물)는 김수영의 싯귀를 연상시킨다. 바로 저 느낌이다. 김훈을 진정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2007-06-13
2007-06-08
2007-06-06
밀양
이 영화의 서사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복선을 던져주고, 씬이 바뀌면 그 결과가 등장하는 식이다. 아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암시가 나오자 마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유괴가 발생한다. 유괴범은 처음부터 단 한번도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 준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납치를 당했다는 것만큼이나 명백하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부흥회를 권하는 장면이 나오면, 가슴을 부여잡고 절규하다가 신애가 그곳으로 향한다. 바람부는 날, 일부러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화면에는 먼지가 날리는 느낌이 가득했다.
신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신애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우겨버리는 유괴범 원장의 맨질맨질한 표정을 보며 주저앉아버린 다음 벌이는 모든 행동들은, 말하자면 제발 나 좀 봐달라는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깟 '거짓말이야' 씨디 한 장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을 굳이 훔친다. 이신애씨를 위한 철야 기도회 현장에 돌을 던지고, 예배당에 찾아가 의자를 때리며 항의하고, 급기야는 약국 아줌마 남편을 꼬셔서 들판에 누워버린다. 보이냐고, 보이냐고, 보이냐고 조용히 소리를 지르지만, 정작 상대방은 팬티까지 벗겨놓고는 (아마도 안 서서겠지만) 갑자기 회개해버린다.
못된 짓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신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버린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리 상태라는 게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꾸준히 잘 대해주려는 사람에게 가서, '나랑 섹스 하고 싶어서 그러죠'라며 그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히스테리컬하게 킬킬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몸에 칼을 대는 것밖에 남는 길이 없었겠지. 애초에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죽은 남편 따라 밀양에 내려온 사람이니까, 신이 자기 마음대로 그 개새끼를 용서해줬다는 걸 알았을 때의 소외감을 극복할 방법도 없는 거고.
한때 도올 김용옥 빠돌이었던 시절 그 강의를 직접 가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게스트로 나오셨다. 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양귀자의 이야기를 빌어 대답을 해주었는데, 양귀자가 그렇게 독실한 신자였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날 교통사고로 아들이랑, 아마도 며느리까지도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신부가 와서 달래는 말이고 뭐고 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분노만이 속에 가득 차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는데, 그렇게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를 미쳐 날뛰고 나니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기 위해서라도 신은 존재해야만 해.
그러고보니 영화 초반에 신애가 했던 짓들이 이해가 좀 되는 거라. 아무에게나 대뜸 마치 작업을 거는 것처럼,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묻고 비밀스러운 햇빛이니 뭐니 객쩍은 소리나 하고, 없는 돈 많다고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게 인테리어 말참견하고, 설마 그 나이 먹도록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이 예수쟁이 떼어내는 법 모르지도 않을 텐데 여기에는 햇빛밖에 없다는 대꾸를 하고, 다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겠지, 외로움이. 하긴 동생도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말이 꼭 정확한 건 아닐 것도 같지만 내 느끼기엔 그렇다고. 그 여자에게 신앙은 믿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쩌면 용서보다 더 원초적인 거였을수도 있는 거고. 고, 로 끝내는 게 다, 로 끝내는 것보다 입말에 가까운 것 같다.
오락가락하는 문체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원장 딸에게 사소한 짜증을 내고 집에 와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면서, 거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화를 조금이라도 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어쩌면 그렇게 삶을, 완전히 새롭지는 않아도 어찌어찌 살아가게 된 건, 살려달라고 말한 다음 어쨌거나 살아서 그런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넘겨짚어볼 수도 있겠다. 한 줌의 햇빛같은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해도 생명은 돌려받았으니까.
작품 외적인 얘기도 조금 해야겠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처음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지나치게 단순한 화법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그 끈을 여기에 잇자면,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이어진 단순한 서사구조 하에서 작동하다보니,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변주가 전부 삭제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에 익숙해지고 슬픔에 단련되게 마련이어서, 아이가 죽고 텅 빈 집에서 밥을 먹다가도 그게 목에 달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를 더 미워하고 학대하게 된다. 사과를 한 입 베어물었을 때 정말 맛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입에 단 걸 물고 조금이라도 즐거워하는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겠지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로서 굵직한 사건만을 짚어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보고 있던 나로서는 그런, 고통의 디테일에 시달릴 필요까지는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기까지 했다.
다시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나한테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좋은 영화였다.
신앙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신애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우겨버리는 유괴범 원장의 맨질맨질한 표정을 보며 주저앉아버린 다음 벌이는 모든 행동들은, 말하자면 제발 나 좀 봐달라는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깟 '거짓말이야' 씨디 한 장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것을 굳이 훔친다. 이신애씨를 위한 철야 기도회 현장에 돌을 던지고, 예배당에 찾아가 의자를 때리며 항의하고, 급기야는 약국 아줌마 남편을 꼬셔서 들판에 누워버린다. 보이냐고, 보이냐고, 보이냐고 조용히 소리를 지르지만, 정작 상대방은 팬티까지 벗겨놓고는 (아마도 안 서서겠지만) 갑자기 회개해버린다.
못된 짓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신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버린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는 심리 상태라는 게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꾸준히 잘 대해주려는 사람에게 가서, '나랑 섹스 하고 싶어서 그러죠'라며 그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히스테리컬하게 킬킬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는 몸에 칼을 대는 것밖에 남는 길이 없었겠지. 애초에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죽은 남편 따라 밀양에 내려온 사람이니까, 신이 자기 마음대로 그 개새끼를 용서해줬다는 걸 알았을 때의 소외감을 극복할 방법도 없는 거고.
한때 도올 김용옥 빠돌이었던 시절 그 강의를 직접 가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게스트로 나오셨다. 신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양귀자의 이야기를 빌어 대답을 해주었는데, 양귀자가 그렇게 독실한 신자였다는 거다. 그런데 어느날 교통사고로 아들이랑, 아마도 며느리까지도 하루아침에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신부가 와서 달래는 말이고 뭐고 다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분노만이 속에 가득 차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는데, 그렇게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를 미쳐 날뛰고 나니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기 위해서라도 신은 존재해야만 해.
그러고보니 영화 초반에 신애가 했던 짓들이 이해가 좀 되는 거라. 아무에게나 대뜸 마치 작업을 거는 것처럼,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묻고 비밀스러운 햇빛이니 뭐니 객쩍은 소리나 하고, 없는 돈 많다고 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게 인테리어 말참견하고, 설마 그 나이 먹도록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이 예수쟁이 떼어내는 법 모르지도 않을 텐데 여기에는 햇빛밖에 없다는 대꾸를 하고, 다 새어나오고 있었던 거겠지, 외로움이. 하긴 동생도 밀양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 말이 꼭 정확한 건 아닐 것도 같지만 내 느끼기엔 그렇다고. 그 여자에게 신앙은 믿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었고 어쩌면 용서보다 더 원초적인 거였을수도 있는 거고. 고, 로 끝내는 게 다, 로 끝내는 것보다 입말에 가까운 것 같다.
오락가락하는 문체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원장 딸에게 사소한 짜증을 내고 집에 와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면서, 거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화를 조금이라도 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어쩌면 그렇게 삶을, 완전히 새롭지는 않아도 어찌어찌 살아가게 된 건, 살려달라고 말한 다음 어쨌거나 살아서 그런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넘겨짚어볼 수도 있겠다. 한 줌의 햇빛같은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해도 생명은 돌려받았으니까.
작품 외적인 얘기도 조금 해야겠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처음에 이 영화가 보여주는 지나치게 단순한 화법에 대해 말을 꺼냈는데 그 끈을 여기에 잇자면,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이어진 단순한 서사구조 하에서 작동하다보니, 그 끝없는 고통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변주가 전부 삭제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인간은 고통에 익숙해지고 슬픔에 단련되게 마련이어서, 아이가 죽고 텅 빈 집에서 밥을 먹다가도 그게 목에 달게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자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를 더 미워하고 학대하게 된다. 사과를 한 입 베어물었을 때 정말 맛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 입에 단 걸 물고 조금이라도 즐거워하는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겠지만,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로서 굵직한 사건만을 짚어주고 넘어갔기 때문에, 보고 있던 나로서는 그런, 고통의 디테일에 시달릴 필요까지는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기까지 했다.
다시 보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그래야 할 이유가 나한테 남아있는지 의문이다. 좋은 영화였다.
2007-06-05
2007-06-01
Pulp - Underwear
Why don't you close the door
And shut the curtains
You're not going anywhere
He's coming up the stairs
And in a moment
He'll want to see your underwear
[chorus]
I couldn't stop it now
There's no way to get out
He's standing far too near
How the hell did you get here
Semi-naked in somebody else's room
I'd give my whole life to see it
Just you --
Stood there
Only in your underwear
If fashion is your trade
Then when you're naked
I guess you must be unemployed, yeah?
'Cause once it's underway
There's no escaping
The fact that you're a girl and he's a boy
[chorus]
If you could close your eyes
And just remember
This is what you wanted last night
So why is it so hard
For you to touch him
For you to go and
Give yourself to him, oh Jesus!
[chorus]
Do do do do do....
Oh yeah
I want to see you
Want to see you standing in your underwear
2007-05-25
질투와 계급의식
'부자들은 착하기까지 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진 자들이 '우리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진솔한' 말을 털어놓거나, 비교적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죠'라고 소소한 술회를 털어놓으며 끝나게 마련이다. 즉, 못 가진 자들의 심리가, 기껏해야 질투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마는 것이다. 한국에서 좌파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질투와 계급의식의 차이도, 혹은, 그것들이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하여 질투가 계급의식으로 승화되지도 못하고, 계급의식이 질투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솔직하게 드러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급의식을 통해 질투심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강인욱은 박예진을 정재민에게 빼앗긴 후 그람시의 옥중수고 따위를 읽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 전에 이미 손을 댔었더라도, 출세하여 자기 손으로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그가 그 내용을 진정으로 흡수했을 리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울분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좌파 서적을 집어든 순간 그가 계급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계급의식과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사회 계층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기 때문이다. 결국 강인욱은 정재민보다 부유해질 수도 없고, 그의 세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통해 도래하지 않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다. 계급의식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러 추구하는 한 쉽사리, 어쩌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이상,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계급 의식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억지로 겨우 가능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미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좌파들이 우파로서는 어림잡을 수 없는, 특정 계급에게는 해방이고 또 다른 계급에게는 묵시록에 가까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우파들의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며 그 소유권을 박탈당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파산하여버릴 가치를 배가 고프지만 체면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음식을 힐끔거리듯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온당한 일이 아닐 터이다. 맑스가 확실히 말한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 부르주아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폐기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면 그것들이 제1가치로서 남아있을리가 없기에, 결국 부르주아의 도덕적인 혹은 '쿨한' 모습들은 좌파에게는 일종의 사다리로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달리 말하자면, 좌파들은 자본주의적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기독교적으로 희구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질투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좌파 지망생은, 욕망의 게임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고 결국 패배하도록 예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르주아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 노멘클라투라로 다시 태어난다. 보드카 대신 코냑을 마시고 비스킷 위에 케비어를 얹게 되면서 역사는 조악한 형태로 다시 반복되며, 대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던 귀족적인 우아함과 소 부르주아들이 담지하고 있던 지역 공동체와의 밀착은, 대체로 유착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복구될 수 없는 지경까지 파괴된다.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던 서구 문명이 구 공산권의 그것보다 미적으로 탁월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목나무처럼 소련이 쓰러지고 중국이 기이하게 변태하면서 두 체제의 대립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해소되어버렸다.
이 과정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좌파가 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계급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청년은 살롱 좌파가 될 수도 없는데, 그것은 이미 '좌파'로서 거듭나버린 그에게 또 하나의 계층적 문제가 있다는 좌절감을 안겨줌으로써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놓는다. 그러므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테리 이글턴 같은 좌파가 된다면 부르주아 계급의 지적인 교양이나 우아함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질투심을 이겨내기 위해 테리 이글턴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그 순간, 계급의 문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주변부와 중심부의 갈등이 악몽처럼 덮쳐올 것이며, 그 유령을 이겨내기 위한 엑소시즘을 진행할만한 어떤 신성함이나 초월적인 힘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계급의식을 통해 질투심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강인욱은 박예진을 정재민에게 빼앗긴 후 그람시의 옥중수고 따위를 읽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혹은 그 전에 이미 손을 댔었더라도, 출세하여 자기 손으로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그가 그 내용을 진정으로 흡수했을 리 없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울분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아는 좌파 서적을 집어든 순간 그가 계급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기도 하다. 계급의식과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사회 계층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기 때문이다. 결국 강인욱은 정재민보다 부유해질 수도 없고, 그의 세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통해 도래하지 않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다. 계급의식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제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러 추구하는 한 쉽사리, 어쩌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이상,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계급 의식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억지로 겨우 가능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미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좌파들이 우파로서는 어림잡을 수 없는, 특정 계급에게는 해방이고 또 다른 계급에게는 묵시록에 가까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우파들의 자산으로부터 파생되며 그 소유권을 박탈당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파산하여버릴 가치를 배가 고프지만 체면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음식을 힐끔거리듯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온당한 일이 아닐 터이다. 맑스가 확실히 말한 바와 같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이 부르주아의 도덕적 가치관을 모두 폐기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면 그것들이 제1가치로서 남아있을리가 없기에, 결국 부르주아의 도덕적인 혹은 '쿨한' 모습들은 좌파에게는 일종의 사다리로서 받아들여져야 마땅하다. 달리 말하자면, 좌파들은 자본주의적 현세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기독교적으로 희구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질투를 느끼는 순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좌파 지망생은, 욕망의 게임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되고 결국 패배하도록 예정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르주아들의 세계를 파괴하면서 노멘클라투라로 다시 태어난다. 보드카 대신 코냑을 마시고 비스킷 위에 케비어를 얹게 되면서 역사는 조악한 형태로 다시 반복되며, 대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던 귀족적인 우아함과 소 부르주아들이 담지하고 있던 지역 공동체와의 밀착은, 대체로 유착에 가까운 것일지라도, 복구될 수 없는 지경까지 파괴된다.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던 서구 문명이 구 공산권의 그것보다 미적으로 탁월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목나무처럼 소련이 쓰러지고 중국이 기이하게 변태하면서 두 체제의 대립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완벽하게 해소되어버렸다.
이 과정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좌파가 됨으로써 자신의 내면에 숨쉬고 있는 계급적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청년은 살롱 좌파가 될 수도 없는데, 그것은 이미 '좌파'로서 거듭나버린 그에게 또 하나의 계층적 문제가 있다는 좌절감을 안겨줌으로써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놓는다. 그러므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테리 이글턴 같은 좌파가 된다면 부르주아 계급의 지적인 교양이나 우아함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질투심을 이겨내기 위해 테리 이글턴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그 순간, 계급의 문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주변부와 중심부의 갈등이 악몽처럼 덮쳐올 것이며, 그 유령을 이겨내기 위한 엑소시즘을 진행할만한 어떤 신성함이나 초월적인 힘이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다.
2007-05-20
한국의 현재를 사는 사람들
한국의 현실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려 들기보다는, 혹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려 들기보다는, 앞으로 도래할 어떤 새로운 세계나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를 목놓아 기다리는데서 만족하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쪽에 자신의 자원을 모두 쏟아붓는다는 식으로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하는 그것이야말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불러온 문화적 현상의 본질 중 하나이다. 요컨대 한국적 특수성을 논하는 자들 중, 정작 한국의 현재를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여건에 대한 불만은 한국어에 대한 것으로 곧잘 치환된다. 한문 고전과의 역사적 맥락이 단절되어 우리의 정신 세계가 붕 떠버렸다는 페이퍼하우스 대표 최내현의 말을 전해들었을 때,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적잖이 놀랐고 또 반갑기까지 했지만, 어제 인쇄되어 나온 드라마틱 22호에 실린 그의 칼럼은 다소 실망스럽다.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으면 발화가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현격하게 방해한다는 것 또한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 혹은 기능의 결여가 낳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언제라도 읽는 이를 you로 호칭할 수 있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심지어 글을 쓸 때에도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문어체를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2인칭 호격의 부재는 술자리가 아니라 글자리에서 더욱 도드라지며, 그것이야말로 그 문제의 본질이다. 심지어는 지금 나도,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함부로 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자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다소 기만적인 자기 독백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문어체와 구어체의 완벽한 괴리이며, 그 현상의 이면에 깔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2인칭 호격의 부재인데, 그것을 단지 '상대방의 높낮이를 늘 재야만 하는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그 칼럼 하나에 담긴 내용과는 별개로 최내현 대표는, 또한 드라마틱과 판타스틱의 창간과 발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하고 있는 박현정 편집이사는, 한국의 현실을 사는 사람 중 하나다. 판타스틱이 창간 특수 이후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일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드라마틱이 지금까지의 상업적 부진을 딛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지만, 페이퍼하우스에서 시도하고 있는 매체들은 그 자체로서 한국의 문화적 현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드라마틱의 에디터여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생력을 갖춘 문화, 그 중에서도 '작가'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르는 드라마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 작가들에게는 공통되는 하나의 분위기가 있다. 자신들이 쓰는 극본이 비평계에서 도외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쨌건 쓰고 또 쓰는, 본의 아닌 끈질김 같은 그런 것. 언론들은 언제나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열광하고, 조금만 자신의 자의식으로 함몰되면 곧장 대중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꾸준히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방송 매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드라마 작가들도 결국 한국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다.
판타스틱에는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 드라마틱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어떤 분위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민준 편집장, 최원택 수석, 그 외 모든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잡지에서 일하기 위해 그런 자세를 부러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때 대단한 영화 키드였던 조 편집장은 '케세라세라'가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보여줄 수 없었던 성취를 이루었다고 감탄사를 늘어놓는다. 양키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심경을 감추지 않는 취미가 최 수석 또한, 자신이 언젠가 드라마 극본을 쓴다면 '환상의 커플'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의 현장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품 중 80%가 그저 그런 범작에 불과하고, 15%가 구제불능이며, 겨우 5% 정도만이 진지하게 탐구할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직접 한국 문화의 현장 속에 뛰어들려 하지 않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니 한국 지식인들이, 머리로는 그렇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술자리에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자기 연민을 위한 희생양으로, 드라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르를 싸잡아 비난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내 이름은 김삼순'이 방영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다고 찌질거린다.
한윤형과 술을 마시던 금요일 밤에 이택광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를 술자리에서 서너번 쯤 만났는데, 거기서 느낀 인상과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 사람의 블로거로서 그는 한국 학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절대 비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한국 학자들이 공부 안 한다는 언급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문학자들끼리 모여 자전거를 타자는 제의를 하고, 들뢰즈 독회에서 받은 신선한 인상을 긍정적이고 경쾌한 어조로 기록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보자면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바로 그 별 거 아닌 일상성이 그의 블로그의 탈식민성을 구성하고 있다. 탈식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타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맺을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라면, 한국의 학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식민주의에 대한 텍스트를 읽으며 고뇌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을 읽고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일단 긍정부터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은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드러내지 않을 때의 강유원을, 한 사람의 서평가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다. 자신이 철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결국 한국 철학의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택광은 블로그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문학자의 삶을 구성해내고 있다. 나는 그의 영화평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정신분석학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터라 그의 논의를 힘들여 추적하지도 않지만, 그가 웹에서 보여주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재를 추적하는 사람이라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아트 인 컬쳐'의 편집장이며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자인 이정우(임근준) 씨. 글을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곤 하는 CIS 증후군, 즉 Contemporary Is Sucks 따위 마인드를 그에게서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의 책이나 잡지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고 다만 블로그만을 꾸준히 관찰해온 터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꺼려지긴 하지만, 애초에 '한국 현대 미술가들을 추적하겠다'는 발상을 내놓는 것부터가,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절거리는 테마를 그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구체적으로 붙들어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곳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며 그로 인해 그와 같은 비평이 소비될 여지가 있는지는 모를지라도, 창작자가 아닌 비평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꿋꿋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내 수준에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물론 미술은 대부분 단일한 물리적 대상으로 현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무리 모나리자가 위대해도 그것을 내 방에 가져다 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문학 등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예술에 비해 필연적으로 훨씬 강하게 현실에 밀착한다. 음악 애호가가 바흐만 듣고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잭슨 폴락의 그림을 한 점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재산이 필요하다. 컨템포러리에 대한 수요가 미술에서 끊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추측한다면,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쪽은 적어도 문학보다야 상황이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평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죽 훑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경마장의 말처럼 무조건 앞을 향해 질주하기만 한다는 뜻도 아니고, 이들이 중심부의 상황을 힐끔거리며 동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내가 굳이 꼽아드는 이유는, 한국의 문화가 이러저러하고 그리하여 주변부의 사람으로서 소외되어 있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어설픈 지식인들, 그래왔던 나와는 너무도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 이 주제를 글로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국이 주변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폭로하고자 절치부심 다짐만 하고 있으면, 나 또한 한국의 현실을 사는 게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초라함을 논하되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여건에 대한 불만은 한국어에 대한 것으로 곧잘 치환된다. 한문 고전과의 역사적 맥락이 단절되어 우리의 정신 세계가 붕 떠버렸다는 페이퍼하우스 대표 최내현의 말을 전해들었을 때,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적잖이 놀랐고 또 반갑기까지 했지만, 어제 인쇄되어 나온 드라마틱 22호에 실린 그의 칼럼은 다소 실망스럽다. 영어의 you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것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으면 발화가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관계를 규정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현격하게 방해한다는 것 또한 정확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능 혹은 기능의 결여가 낳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언제라도 읽는 이를 you로 호칭할 수 있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심지어 글을 쓸 때에도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문어체를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2인칭 호격의 부재는 술자리가 아니라 글자리에서 더욱 도드라지며, 그것이야말로 그 문제의 본질이다. 심지어는 지금 나도,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함부로 지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자를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다소 기만적인 자기 독백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현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문어체와 구어체의 완벽한 괴리이며, 그 현상의 이면에 깔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2인칭 호격의 부재인데, 그것을 단지 '상대방의 높낮이를 늘 재야만 하는 현실'로만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그 칼럼 하나에 담긴 내용과는 별개로 최내현 대표는, 또한 드라마틱과 판타스틱의 창간과 발행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하고 있는 박현정 편집이사는, 한국의 현실을 사는 사람 중 하나다. 판타스틱이 창간 특수 이후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판매량을 보일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드라마틱이 지금까지의 상업적 부진을 딛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지만, 페이퍼하우스에서 시도하고 있는 매체들은 그 자체로서 한국의 문화적 현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하고 있다. 내가 드라마틱의 에디터여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한국에서 자생력을 갖춘 문화, 그 중에서도 '작가'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르는 드라마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 작가들에게는 공통되는 하나의 분위기가 있다. 자신들이 쓰는 극본이 비평계에서 도외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쨌건 쓰고 또 쓰는, 본의 아닌 끈질김 같은 그런 것. 언론들은 언제나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열광하고, 조금만 자신의 자의식으로 함몰되면 곧장 대중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꾸준히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방송 매체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드라마 작가들도 결국 한국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다.
판타스틱에는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으니 드라마틱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 매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어떤 분위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민준 편집장, 최원택 수석, 그 외 모든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잡지에서 일하기 위해 그런 자세를 부러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때 대단한 영화 키드였던 조 편집장은 '케세라세라'가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보여줄 수 없었던 성취를 이루었다고 감탄사를 늘어놓는다. 양키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부러운 심경을 감추지 않는 취미가 최 수석 또한, 자신이 언젠가 드라마 극본을 쓴다면 '환상의 커플'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의 현장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작품 중 80%가 그저 그런 범작에 불과하고, 15%가 구제불능이며, 겨우 5% 정도만이 진지하게 탐구할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직접 한국 문화의 현장 속에 뛰어들려 하지 않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아니 한국 지식인들이, 머리로는 그렇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술자리에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자기 연민을 위한 희생양으로, 드라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르를 싸잡아 비난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내 이름은 김삼순'이 방영되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다고 찌질거린다.
한윤형과 술을 마시던 금요일 밤에 이택광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를 술자리에서 서너번 쯤 만났는데, 거기서 느낀 인상과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 사람의 블로거로서 그는 한국 학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절대 비관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한국 학자들이 공부 안 한다는 언급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문학자들끼리 모여 자전거를 타자는 제의를 하고, 들뢰즈 독회에서 받은 신선한 인상을 긍정적이고 경쾌한 어조로 기록한다. '객관적'인 시각에서만 보자면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바로 그 별 거 아닌 일상성이 그의 블로그의 탈식민성을 구성하고 있다. 탈식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타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맺을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라면, 한국의 학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탈식민주의에 대한 텍스트를 읽으며 고뇌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을 읽고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일단 긍정부터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은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드러내지 않을 때의 강유원을, 한 사람의 서평가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다. 자신이 철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결국 한국 철학의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택광은 블로그를 통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문학자의 삶을 구성해내고 있다. 나는 그의 영화평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정신분석학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터라 그의 논의를 힘들여 추적하지도 않지만, 그가 웹에서 보여주는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현재를 추적하는 사람이라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아트 인 컬쳐'의 편집장이며 '크레이지 아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자인 이정우(임근준) 씨. 글을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곤 하는 CIS 증후군, 즉 Contemporary Is Sucks 따위 마인드를 그에게서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그의 책이나 잡지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고 다만 블로그만을 꾸준히 관찰해온 터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꺼려지긴 하지만, 애초에 '한국 현대 미술가들을 추적하겠다'는 발상을 내놓는 것부터가,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절거리는 테마를 그는 아주 오랜 시간동안 구체적으로 붙들어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곳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으며 그로 인해 그와 같은 비평이 소비될 여지가 있는지는 모를지라도, 창작자가 아닌 비평자로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꿋꿋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정도는 내 수준에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물론 미술은 대부분 단일한 물리적 대상으로 현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무리 모나리자가 위대해도 그것을 내 방에 가져다 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문학 등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예술에 비해 필연적으로 훨씬 강하게 현실에 밀착한다. 음악 애호가가 바흐만 듣고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잭슨 폴락의 그림을 한 점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재산이 필요하다. 컨템포러리에 대한 수요가 미술에서 끊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추측한다면,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쪽은 적어도 문학보다야 상황이 낫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평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을 죽 훑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경마장의 말처럼 무조건 앞을 향해 질주하기만 한다는 뜻도 아니고, 이들이 중심부의 상황을 힐끔거리며 동경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내가 굳이 꼽아드는 이유는, 한국의 문화가 이러저러하고 그리하여 주변부의 사람으로서 소외되어 있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어설픈 지식인들, 그래왔던 나와는 너무도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바로 그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 이 주제를 글로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국이 주변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폭로하고자 절치부심 다짐만 하고 있으면, 나 또한 한국의 현실을 사는 게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을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초라함을 논하되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007-05-18
[[문화와 가치]]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옮김, 책세상, 2006
어떤 사람에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록 우리들이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부언하더라도, 아무 뜻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우 종종 일어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 수 없는 자물쇠를 걸라.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그 방을 밖에서 찬탄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방에 대해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없다! (39쪽)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 수 없는 자물쇠를 걸라. 그러나 당신이 그들이 그 방을 밖에서 찬탄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방에 대해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은 뜻이 없다! (39쪽)
2007-05-16
2007-05-15
낭만주의는 한국 사회를 해석하는 틀로 기능할 수 있는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야 낭만주의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야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칸트의 철학이 낭만주의의 시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고 니 말은 뭔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아 별로 중요한거 아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아 그래서 난 네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뭔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조또 궁금하게시리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인간 자율성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낭만주의의 오버를 가능하게 한 건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지금 한국의 실정을 낭만주의라 부르는건 그을쎄 뭐 이러고 말았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왜 자율성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긴 하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칸트 이전의 낭만주의라면 모를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업어 (전상욱 버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흐음 없다는 말이 나는 전혀 이해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율성'이란 낱말을 좀 잘못 쓰는 거고.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글쎄 그렇다고 기계적 우주관이라던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앞 문장은 (흔히 한국인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운명론 같은 것이 의식 세계가 전제되어 있지도 않으니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인들은 결국 '안 되는게 어디 있나?' 같은 소리로 도피하잖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나'와 '세계' 간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타인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고 보편적인 인간을 상상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안 되는게 어디 있나? 라는 말은 대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권력을 가진 누군가 시킬 때 하는 소리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개별적인 행위자의 사고 방식은 낭만주의의 그것과 비슷한 것 같ㅇ느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까라면 까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타인의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낭만주의인 것은 아니지 않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응 그건 아니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기 자신의 자율성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다만 세계를 못 보는 거고.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나만 있는 거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면 "안 되는게 어디 있나?"라는 말이 나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실제론 일을 개판으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하여 느끼는 숭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인들의 세계 인식이 파편적인 것 또한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은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성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일관성을 회피하는 것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나 또 어떤 맥락에선, 조야한 이성을 통해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 막장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가령 강자지존이라든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근데 그런거는 일종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예술적 세계관? ㅋㅋ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함정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렇지 '예술적' 세계관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한계 아닐까 싶은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흠 이 문제는 좀 엄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독일의 방법은 차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칸트적인 총체적 파악이 없을 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낭만주의라고 말한다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왠만한 철학 사조 빼고 그 나머지 건 다 낭만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니까 원시적 공동체도 아니고, 이념도 없는 어떤 이상한 아노미 사회들에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다 낭만주의가 된다는 건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칸트가 낭만주의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가 관념론의 초석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확고하게 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렇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래서 독일관념론과 낭만주의는 같이 가는 사조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셸링 피히테 이런 애들이 그야말로 낭만주의 철학자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헌데 한국에서는 선불교 전통과 기타 등등이 결합한 더러운 관념론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애초부터 유령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말하자면 통속철학이 애초부터 관념론이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유심론이라고 해두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차이가 묘하게 있긴 한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어쩄건 내 체감은 그렇다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하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서양철학에선 낭만주의가 반동이라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왜냐하면 그전엔 신 이성 론이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렇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인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자의적 낭만주의가 주류인 거고, 한번도 극복된 적이 없는 것이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내가 간간히 일제시대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계몽주의자는 칸트니까, 칸트에 대한 반동이기도 해. 하지만 신-이성론 (중세에서 스피노자까지)이 낭만주의와 오히려 더 멀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잔재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것에 대한 향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인 건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사실 일본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는 거의 독일식 낭만주의에 오염된 거였단 말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칸트가 계몽주의자의 최정점이긴 한데 그가 낭만주의를 포태하고 있었던 사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낭만주의와 독일 낭만주의 사이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음 그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같은 말로 엮을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건 맞는 말이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애기 옹알이와 천주교인의 방언이 문법에 안 맞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거의 같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런 비유는 좀 아니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뭐 어쨌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적 경향, 이라고 일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포섭을 한다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독일 낭만주의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의 경우를 파악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주변부에서 정신을 차린 유일한 사례라는 건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잠자리채로 파리를 잡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말하자면 말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차라리 난 주변부를 뒤지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물론 그쪽이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지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주변부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미국과 유럽이 아닌 나라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한국은 일단 일본을 근대의 아버지로써 파야 순서가 맞는 지도 모르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뭐 그러다가 독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중심부의 시각을 통하지 않고 어떤 주변부가 다른 주변부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중의 삽질이 될 가능성이 크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맞는 말이긴 한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요약하자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1) 한국의 현 사태를 낭만주의로 포섭한다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호미 바바의 책을 읽어서 인도의 탈식민주의를 연구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 계몽주의-(독일)낭만주의-----------------(한국)낭만주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런 거리가 된단 말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저 거리는 내가 편의상 훨씬 줄인거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계몽주의와 독일낭만주의는 아주 가까이 있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음 그 거리 설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럼 낭만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역을 포함하는 사조가 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무튼 계속해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이걸 분석한다는 게 애시당초 어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너는 내가 포괄적인 반지성주의를 낭만주의라고 명명함으로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라는 언어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반지성주의는 세태의 단면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렇게 보고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럼 그걸 뭐라고 호칭할 거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거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주변부로서의 한국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를 테면 잡초 근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우리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하는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잡초와 낭만주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사조인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자들은 잡초를 연구했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잡초 방언 들꽃 따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맥락이 틀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한국엔 잡초가 표준어야. 방언가 아니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꽃이 없는 세계의 잡초라구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온실에서 대량생산하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때까지 보편성으로 포섭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낭만주의의 일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고 한국에 꽃이 없다는 건 섵부른 생각이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한국에는 그런 집착이 전혀 없잖니?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섯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꼭 그렇지는 않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세상에서 가장 없는 나라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국제적인 맥락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예술가나 철학자 등등이 꽤 있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절대 그렇게 단언하지 않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 지금 우리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지. 그 예술가나 철학자들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우리가 한국사회에 느끼는 위화감보다 더 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뭐냐 그들은 한국 사회의 일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가령 낸시랭을 두고 낭만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해야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낸시랭을 분석할 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포스트모던을 운운하는 것보다 낭만주의의 돌연변이로 파악해보려고 하는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큰 의미가 있다 이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어차피 서양의 담론을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미학을 몰라서 그냥 지르진 못하겠는데, 그을쎄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렇다면 폭력적 근대화를 겪은 직후, 한 20년 되었지만 그런 직후 상화엥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포스트모던 운운도 낸시랭 분석틀은 아니지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끌어들일 수 있는 담론으로 더 유용한 것은 한 200년쯤 뒤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거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차라리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가고 싶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철기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당시 그리스어랑 지금 한국어랑 비슷하다고 박홍규가 그랬잖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기차를 타고 다니는 현실과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야 그게 얼마나 처량한 소리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ㅋㅋ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처량해도 어쩌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개념어가 없다는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일종의 미시적 탐색을 통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게 한자를 잘라내서 그렇게 되어버린 꼴이긴 하지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다시 말해 낭만주의자들이 했던 과정과 유사한 것을 밟음으로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에서의 위 낭만주의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물론 의의는 있겠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것의 어려움은 서구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했던 과정과 유사한 것을 밟음으로써
한국에서의 위 포스트모던을 타개하는 것과 그냥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200년 앞으로 간다고 치유책이 더 효력이 높아지지는 않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다른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모던과 포스트모던은 계몽과 낭만을 거친 다음 개인의 주체성이 확립된 다음의 이야기인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늘 너와 내가 문제삼던 것 중 하나는 개인의 주체성이 희박하다는 거 아니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렇게 치면 낭만주의 역시 그전에 지켜야 되는 단계가 너무 많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걸 그렇게 넘기려면 진짜로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가야 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내 구상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인간이면 달리기는 할 줄 알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하지만 역도는 따로 배워야하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모던과 포스트모던 논쟁은 말하자면 역도 차원의 운동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 시대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문명이 형성되어 있으면 유사한 형태로 도달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거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비유가 좀 안 맞는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달리기는 건강한 인간이면 누구나 할 줄 알듯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왜냐하면 모던은 사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이라면 대충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건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모던이 기초체력에 해당하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게 안 되어서 빌빌거리는데 그걸 문제라고 못 느끼는 거 아냐 지금.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푸코의 말대로 모던이 훈육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렇게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기초체력도 어차피 훈육되어야 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문제는 훈육을 시킬 정도로 체계화된 사회가 생성되어 있느냐일 수도 있는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그만큼의 훈육이 덜된거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응. 훈육을 시킬 주체도 없으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왕조가 남아 있고 뭐 그런 수준까지는 대충 도달하는 것 같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자연환경을 포함한 몇몇 전제 조건이 있을 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렇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중앙집권화된 왕조까지는 이뤄본 사회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난망한 것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결핍되어 있나를 따져봐야 하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근데 유교적 형이상학은 지금 또 싸그리 날려먹었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게 존속할 수가 없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솔직히 부활시킬 수도 없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지금 우리가 문화 같은 문화를 가져보려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왕조 질서는 해봤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걸 기본 베이스로 잡을 수 없단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과거에 낭만주의자들이 했듯이 지금 뭔가 국제 사회의 보편 질서와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탐색을 해야 한다는거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낭만주의로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건 말도 안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마치 그림 형제가 독일어를 수집하여 사전을 만들듯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다, 라고 못박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누릴 수 없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명명을 제대로 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단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니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몇 가지 요소가 꼬여 있어서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럼 너는 뭐라고 할 거냐, 라고 하면 바로 그 치사한 대안 묻기가 되니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 요소 대 요소별로 치유법이 나와야 할까 말까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시대를 규명하기 위한 어떤 슬로건 내지는 형이상학이 필요하긴 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샤먼-인질 생존자-자본주의 쯤 된다고 생각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인간은 반드시 그런 걸 요구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럴 때 확고한 표어가 있어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얼척없는 표어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낭만주의자들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신의 역량을 제어하는 것만으로 다시 계몽주의로 돌아올 수 있었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흠 뭐 어차피 내가 그 글로 모든 것을 규명하지는 않았으니 그게 점점 맞아들어간다는 것을 서서히 입증할 수 있곘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래. 원래 표어라는 건 구체적인 분석활동에서 유의미함을 증명하는 거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 사회는 객관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럴 수가 없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분석행위가 치유효과를 필함하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분석을 추구하기보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치유 과정에서 분석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 정도로 포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뭐랄까 당신의 담론 프로젝트는 당신이 철인 왕이 되었을 때에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고 적절한 연구가 따라온다면 내 설정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입증은 아니어도 아무튼 그렇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듣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슬금슬금 부어주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각성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게 분석행위가 할 수 있는 치유효과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치유행위를 통해 분석한다는 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애를 잡아놓고 정신상담을 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너는 많은 한국인을 애 취급하지 않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애 취급하는 것도 글쓰기의 한 양식이지. 하지만 내겐 잡아놓을 힘이 없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나도 마찬가지긴 한ㄷ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하여간, 새로운 테마를 잡은 것을 축하하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자기 분석의 방향이 어떻게 향할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내 가슴에 별처럼 빛나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뭐 그런거라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시작하는 일에 초를 칠 필요는 없겠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 사회를 명명도 하지 않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어는 독일어가 아니라서 긴 단어를 만들면 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해를 위한 초석이 필요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함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명명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관념론적이긴 해. ㅋㅋㅋ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직관에 의존하고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오케이.
야 낭만주의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야 내가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칸트의 철학이 낭만주의의 시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고 니 말은 뭔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아 별로 중요한거 아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아 그래서 난 네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뭔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조또 궁금하게시리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인간 자율성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낭만주의의 오버를 가능하게 한 건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지금 한국의 실정을 낭만주의라 부르는건 그을쎄 뭐 이러고 말았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왜 자율성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 있긴 하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칸트 이전의 낭만주의라면 모를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업어 (전상욱 버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흐음 없다는 말이 나는 전혀 이해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율성'이란 낱말을 좀 잘못 쓰는 거고.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글쎄 그렇다고 기계적 우주관이라던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앞 문장은 (흔히 한국인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운명론 같은 것이 의식 세계가 전제되어 있지도 않으니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인들은 결국 '안 되는게 어디 있나?' 같은 소리로 도피하잖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나'와 '세계' 간에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타인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고 보편적인 인간을 상상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안 되는게 어디 있나? 라는 말은 대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권력을 가진 누군가 시킬 때 하는 소리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개별적인 행위자의 사고 방식은 낭만주의의 그것과 비슷한 것 같ㅇ느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까라면 까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타인의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낭만주의인 것은 아니지 않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응 그건 아니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기 자신의 자율성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다만 세계를 못 보는 거고.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나만 있는 거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면 "안 되는게 어디 있나?"라는 말이 나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실제론 일을 개판으로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다는 인식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하여 느끼는 숭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인들의 세계 인식이 파편적인 것 또한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은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성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일관성을 회피하는 것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나 또 어떤 맥락에선, 조야한 이성을 통해 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 막장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가령 강자지존이라든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근데 그런거는 일종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예술적 세계관? ㅋㅋ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함정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렇지 '예술적' 세계관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한계 아닐까 싶은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흠 이 문제는 좀 엄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독일의 방법은 차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칸트적인 총체적 파악이 없을 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낭만주의라고 말한다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왠만한 철학 사조 빼고 그 나머지 건 다 낭만주의라고 불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니까 원시적 공동체도 아니고, 이념도 없는 어떤 이상한 아노미 사회들에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다 낭만주의가 된다는 건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칸트가 낭만주의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가 관념론의 초석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확고하게 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참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렇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래서 독일관념론과 낭만주의는 같이 가는 사조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셸링 피히테 이런 애들이 그야말로 낭만주의 철학자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헌데 한국에서는 선불교 전통과 기타 등등이 결합한 더러운 관념론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애초부터 유령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말하자면 통속철학이 애초부터 관념론이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유심론이라고 해두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차이가 묘하게 있긴 한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어쩄건 내 체감은 그렇다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하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서양철학에선 낭만주의가 반동이라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왜냐하면 그전엔 신 이성 론이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렇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인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자의적 낭만주의가 주류인 거고, 한번도 극복된 적이 없는 것이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내가 간간히 일제시대를 그리워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게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계몽주의자는 칸트니까, 칸트에 대한 반동이기도 해. 하지만 신-이성론 (중세에서 스피노자까지)이 낭만주의와 오히려 더 멀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잔재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것에 대한 향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인 건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사실 일본의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는 거의 독일식 낭만주의에 오염된 거였단 말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칸트가 계몽주의자의 최정점이긴 한데 그가 낭만주의를 포태하고 있었던 사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낭만주의와 독일 낭만주의 사이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음 그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같은 말로 엮을 수 없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건 맞는 말이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애기 옹알이와 천주교인의 방언이 문법에 안 맞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거의 같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런 비유는 좀 아니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뭐 어쨌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적 경향, 이라고 일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포섭을 한다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독일 낭만주의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의 경우를 파악하기 쉽게 되지 않을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주변부에서 정신을 차린 유일한 사례라는 건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잠자리채로 파리를 잡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말하자면 말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차라리 난 주변부를 뒤지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물론 그쪽이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힘들지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주변부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미국과 유럽이 아닌 나라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한국은 일단 일본을 근대의 아버지로써 파야 순서가 맞는 지도 모르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뭐 그러다가 독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중심부의 시각을 통하지 않고 어떤 주변부가 다른 주변부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중의 삽질이 될 가능성이 크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맞는 말이긴 한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요약하자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1) 한국의 현 사태를 낭만주의로 포섭한다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호미 바바의 책을 읽어서 인도의 탈식민주의를 연구해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 계몽주의-(독일)낭만주의-----------------(한국)낭만주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런 거리가 된단 말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저 거리는 내가 편의상 훨씬 줄인거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계몽주의와 독일낭만주의는 아주 가까이 있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음 그 거리 설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럼 낭만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강역을 포함하는 사조가 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무튼 계속해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이걸 분석한다는 게 애시당초 어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너는 내가 포괄적인 반지성주의를 낭만주의라고 명명함으로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라는 언어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반지성주의는 세태의 단면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렇게 보고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럼 그걸 뭐라고 호칭할 거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거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주변부로서의 한국 사회의 정신적 분위기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를 테면 잡초 근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우리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하는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잡초와 낭만주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낭만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술적 사조인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자들은 잡초를 연구했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잡초 방언 들꽃 따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맥락이 틀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한국엔 잡초가 표준어야. 방언가 아니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꽃이 없는 세계의 잡초라구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온실에서 대량생산하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때까지 보편성으로 포섭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낭만주의의 일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고 한국에 꽃이 없다는 건 섵부른 생각이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한국에는 그런 집착이 전혀 없잖니?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섯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꼭 그렇지는 않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세상에서 가장 없는 나라라고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국제적인 맥락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예술가나 철학자 등등이 꽤 있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절대 그렇게 단언하지 않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 지금 우리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지. 그 예술가나 철학자들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우리가 한국사회에 느끼는 위화감보다 더 큰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뭐냐 그들은 한국 사회의 일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가령 낸시랭을 두고 낭만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냐를 얘기해야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낸시랭을 분석할 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포스트모던을 운운하는 것보다 낭만주의의 돌연변이로 파악해보려고 하는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큰 의미가 있다 이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어차피 서양의 담론을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미학을 몰라서 그냥 지르진 못하겠는데, 그을쎄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렇다면 폭력적 근대화를 겪은 직후, 한 20년 되었지만 그런 직후 상화엥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포스트모던 운운도 낸시랭 분석틀은 아니지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끌어들일 수 있는 담론으로 더 유용한 것은 한 200년쯤 뒤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거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차라리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가고 싶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철기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당시 그리스어랑 지금 한국어랑 비슷하다고 박홍규가 그랬잖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기차를 타고 다니는 현실과 맞아떨어지지가 않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야 그게 얼마나 처량한 소리냐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ㅋㅋ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처량해도 어쩌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개념어가 없다는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일종의 미시적 탐색을 통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게 한자를 잘라내서 그렇게 되어버린 꼴이긴 하지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다시 말해 낭만주의자들이 했던 과정과 유사한 것을 밟음으로써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에서의 위 낭만주의를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물론 의의는 있겠지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것의 어려움은 서구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했던 과정과 유사한 것을 밟음으로써
한국에서의 위 포스트모던을 타개하는 것과 그냥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200년 앞으로 간다고 치유책이 더 효력이 높아지지는 않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아니 다른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모던과 포스트모던은 계몽과 낭만을 거친 다음 개인의 주체성이 확립된 다음의 이야기인데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늘 너와 내가 문제삼던 것 중 하나는 개인의 주체성이 희박하다는 거 아니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렇게 치면 낭만주의 역시 그전에 지켜야 되는 단계가 너무 많아.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걸 그렇게 넘기려면 진짜로 소크라테스 이전으로 가야 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내 구상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우리가 대충 살아가는 인간이면 달리기는 할 줄 알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하지만 역도는 따로 배워야하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모던과 포스트모던 논쟁은 말하자면 역도 차원의 운동이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 시대 정도까지는 어느정도 문명이 형성되어 있으면 유사한 형태로 도달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거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비유가 좀 안 맞는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달리기는 건강한 인간이면 누구나 할 줄 알듯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래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왜냐하면 모던은 사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이라면 대충 체득하고 있어야 하는건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모던이 기초체력에 해당하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게 안 되어서 빌빌거리는데 그걸 문제라고 못 느끼는 거 아냐 지금.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푸코의 말대로 모던이 훈육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렇게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기초체력도 어차피 훈육되어야 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문제는 훈육을 시킬 정도로 체계화된 사회가 생성되어 있느냐일 수도 있는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그만큼의 훈육이 덜된거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응. 훈육을 시킬 주체도 없으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왕조가 남아 있고 뭐 그런 수준까지는 대충 도달하는 것 같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자연환경을 포함한 몇몇 전제 조건이 있을 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적어도 한국 사회는 그렇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중앙집권화된 왕조까지는 이뤄본 사회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난망한 것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결핍되어 있나를 따져봐야 하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근데 유교적 형이상학은 지금 또 싸그리 날려먹었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게 존속할 수가 없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솔직히 부활시킬 수도 없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지금 우리가 문화 같은 문화를 가져보려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왕조 질서는 해봤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이걸 기본 베이스로 잡을 수 없단 거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과거에 낭만주의자들이 했듯이 지금 뭔가 국제 사회의 보편 질서와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탐색을 해야 한다는거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낭만주의로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건 말도 안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마치 그림 형제가 독일어를 수집하여 사전을 만들듯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다, 라고 못박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봐야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누릴 수 없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명명을 제대로 함으로써 치유의 과정을 단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니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몇 가지 요소가 꼬여 있어서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럼 너는 뭐라고 할 거냐, 라고 하면 바로 그 치사한 대안 묻기가 되니까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 요소 대 요소별로 치유법이 나와야 할까 말까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시대를 규명하기 위한 어떤 슬로건 내지는 형이상학이 필요하긴 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샤먼-인질 생존자-자본주의 쯤 된다고 생각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인간은 반드시 그런 걸 요구한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럴 때 확고한 표어가 있어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얼척없는 표어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낭만주의자들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자신의 역량을 제어하는 것만으로 다시 계몽주의로 돌아올 수 있었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흠 뭐 어차피 내가 그 글로 모든 것을 규명하지는 않았으니 그게 점점 맞아들어간다는 것을 서서히 입증할 수 있곘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래. 원래 표어라는 건 구체적인 분석활동에서 유의미함을 증명하는 거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분석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치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 사회는 객관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거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럴 수가 없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분석행위가 치유효과를 필함하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분석을 추구하기보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치유 과정에서 분석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낭만주의 정도로 포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뭐랄까 당신의 담론 프로젝트는 당신이 철인 왕이 되었을 때에나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리고 적절한 연구가 따라온다면 내 설정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입증은 아니어도 아무튼 그렇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듣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슬금슬금 부어주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각성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그게 분석행위가 할 수 있는 치유효과야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치유행위를 통해 분석한다는 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애를 잡아놓고 정신상담을 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야.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너는 많은 한국인을 애 취급하지 않냐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애 취급하는 것도 글쓰기의 한 양식이지. 하지만 내겐 잡아놓을 힘이 없잖아.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나도 마찬가지긴 한ㄷ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데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하여간, 새로운 테마를 잡은 것을 축하하네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자기 분석의 방향이 어떻게 향할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내 가슴에 별처럼 빛나는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뭐 그런거라서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시작하는 일에 초를 칠 필요는 없겠지.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그러니까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 사회를 명명도 하지 않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한국어는 독일어가 아니라서 긴 단어를 만들면 한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이해를 위한 초석이 필요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함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명명을 먼저 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관념론적이긴 해. ㅋㅋㅋ
우물에 빠진 호랑이 님의 말:
직관에 의존하고 있지
[윤형] 에잇 죽어보자! 님의 말:
오케이.
피드 구독하기:
글 (Atom)